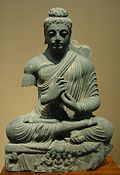찬드라키르티
Chandrakirti찬드라키르티(IAST: Candra) 또는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영광"을c. 뜻하는 600 – c. 650) 또는 "찬드라"는 나가르주나(c.150 – c. 250 CE)의 작품과 그의 주요 제자인 아리아데바의 작품에 관한 유명한 해설가였다. 그는 프라사나파다와 마디아마카에 관한 두 권의 영향력 있는 작품을 썼다.[1]
찬드라커티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티베트 소식통들은 그가 남인도에서 태어나 승려가 되었고 카말라부디(불교의 제자였던)의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다.[1][2] 부 스톤과 타라나타 같은 티베트 소식통들은 찬드라커티가 날란다 대학에서 활동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는 방장이 되었다고 한다.[1][3] 그는 또한 요가카라의 철학자 찬드라고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2]
찬드라커티는 7~10세기 동안 그다지 영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작품은 결코 중국어로 번역된 적이 없다.[4][1] 그러나 11세기와 12세기에 이르러 그의 작품은 북쪽, 특히 카슈미르와 티베트에서 영향력이 커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찬드라커티는 티베트 불교에서 마디야마카 철학을 연구하는 주요 원천이 되었다.[1]
케빈 A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보세, 찬드라키르티는 많은 티베트 불교도들에게 "나르가주나의 공허함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정확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진리를 가장 충분히 나타낸다.[5] 그는 티베트인들이 "프라사지카"라고 부르는 마디야마카의 부속학교의 주요 주창자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적 분류는 12세기 동안 티베트에서만 일어났다.[5]
철학
찬드라키르티는 나가르주나 마디야마카 학파의 철학자였다. 이 학교는 모든 현상(다르마)에 내재성이나 자기존재(산스크리트어: svabhava)가 공허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불상, 사대부, 열반 등 모든 불교적 현상이 포함된다.[3] 찬드라키르티에 따르면 마디아마카의 아포파적 방법은 모든 개념, 명제(프라티냐), 견해(Dṛṣṭi)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으로 존재도, 존재하지도 않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과격한 부정 때문에, 마디야마카는 모든 극단적인 견해와 입장을 거부하는 중간 방법으로 보여진다.[3]
찬드라키르티에게는 모든 현상에 스바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각 있는 존재들은 현실의 본성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경험에 있어서 스바바바를 귀속시킨다. 궁극적으로 모든 현상은 그 자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귀속된 종속적 지정(prajjnaptimatra)인 개념적 구성(prajquaptimatra)에 불과하다.[3]
Thubten Jinpa는 찬드라커티가 제시한 주요 철학 사상으로 해설가들에게 보여진 것을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1) 상대적 입장이 수반하는 논리적 모순과 불합리한 결과를 드러내는 결과적 추론에 의존하여, 세계의 사물 사실에 근거한 기준에 근거한 형식적 추론의 거부, (2) 디그나가에 의해 개시되고 더 나아가 다르마키르티가 전개한 불교 인식론의 핵심 교리에 대한 거부., (3) 언어와 사상을 통한 궁극적 진리의 접근 불가능성에 대한 급진적인 이해, (4) 철학적 근거 대신 세상의 일상적인 직관에 그것의 타당성을 호소하는 관습적 진리의 이해, (5) 논문이 없다는 나가르주나의 진술에 대한 독특한 해석, (6) 가능한 ce.마음과 정신적 요인을 부처에 [6]바침
두 개의 진실
모든 마디아미카처럼 찬드라키르티는 엄격한 반창고적 성격으로 두 가지 진리의 이론을 옹호한다.[7] 찬드라키르티에 따르면 모든 것(바바)은 관습과 궁극의 두 가지 천성을 가지고 있다.[8][7]
상투적 진리(savvtiti satya)는 잠정적으로 말하면 현상에 성격이나 존재(bhava)가 있다는 사실이다.[3] 예를 들어 불의 성질은 열 등이다. 이것이 일상 세계의 진리(로카사asavṛtisatya)와 재래식 거래의 진리(vyavaharrasatya)이다.[8] 그러나 챈드라에게는 관습적인 진리조차도 본질적인 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습적인 속성은 본질적인 본성이나 스바바바(전통적으로까지 말해도)가 아니다. 이러한 견해는 찬드라키르티를 바비베카 같은 다른 마디아미카들과 차별화시킨다. 바비베카는 내적인 본성의 전통적인 존재를 긍정한다.[7][9]
궁극적인 진리(paramarrtha satya)에 대해서는, 불을 분석하여 궁극적인 성질을 찾았을 때, 불을 뜨겁게 하는 독립적인 본질은 발견되지 않고, 따라서 화재(그리고 시간과 인과관계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포함한 모든 것)는 궁극적인 본질이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궁극적인 진리 즉, 공허(śūnynynyat) 또는 자기존재 부족(nivsvabhava)이다.[3][7] 그것은 변화하고 인과적 효능(아르타크리야)을 가지며, 따라서 생겨나는 종속적인 존재(프라타크티아무타파다)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관습적 진리에 내재된 본질의 매우 결여된 것이다.[7]
관습적 진리의 본질
소남탁쵸에 따르면, 관습은 "일상적인 인지 과정의 영역이며, 평범한 존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7] 상투적인 진실은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상투적인 거짓과 대조될 수 있다.[8] 올바른 인식은 장애가 없는 감각능력에 의한 잘못된 인식과 구별된다.[7] 찬드라커티가 만드는 이와 관련된 구별은 평범한 존재의 관점에서 인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세속적 관습(로카사asavṛti)과 세상을 반영하지 않는 관습(알로카사ṃvṛti) 사이에 있어서 세속적 기준으로도 기만적인 것이다.[7]
'관습적'(savvtiti)은 찬드라커티(chandrakirti)에 따라 '덮는 것(covering)'을 의미할 수 있으며, 망상이나 무지(avidya)와도 관련이 있다.[8][7] 게다가, 그는 또한 용어들을 의존적인 (파라파라사 ṃ바바나) 그리고 상징적인 (사아켓) 또는 세속적인 관습 (로카비바하라)으로 얼버무린다.[7]
특히 (현실을 재조명하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관습적인 진실은 궁극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은폐되고 착각되는 종류의 진리다.[10][7] 사실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saṁvṛtisatya는 사실 사실이 아니다.[8] 실제로 찬드라커티는 전통적인 현상은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신기루와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일한 차이점은 관습적인 현상들이 일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인과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물은 목마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신기루는 도움을 줄 수 없다).[7]
나아가 이러한 재래식 현상은 사물에 귀속되는 본질이나 본질과 같은 관습적 환상적 실체(예: 관습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와 관습적으로 비현실적 실체(예: 토끼의 뿔과 같이, 그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와 구별되어야 한다.[7] 이 후자의 두 비현실적인 현상 사이의 주요한 차이는 관습적으로 비현실적인 실체는 보통 사람들에 의해 비현실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본질적인 본성은 보통 사람들에 의해 비현실적인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일반인은 내적인 본성을 전통적인 현상(물 등)에 귀속시켜 본질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귀한 존재만이 이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본질은 평범한 존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개념적 허구다.[7]
챈드라커티는 관습의 비현실성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언어를 넘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언어와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가르쳤다고 말한다.[10]
찬드라키르티에게 있어서 평범한 존재들이 관습적인 것을 경험하는 방식은 깨어난 성인이나 고귀한 존재(아리아)들이 관습적인 것을 경험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찬드라키르티는 단순한 관습(티베탄:쿤 rdzob tsam) 개념을 도입해 귀족들이 관습적 사실이나 관습적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것과는 사뭇 다른 관습성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켰다(쿤 rdzob bden pa.[7] 평범한 존재는 현상을 본질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따라서 그들은 전통적인 현실을 경험한다. 한편 깨달은 존재들은 오직 비보완적인 종류의 외모를 경험할 뿐인데, 이는 반사된 이미지처럼 비현실적인 구성물로 인식된다.[7]
궁극적인 진리의 본질
찬드라커티는 궁극적인 현실을 "현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고등 인지 과정(예시)에 의해 발견되는 사물의 본질"[7]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7]
"극단적인 것은 물체인데, 이 물체의 본질은 현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에 의해 발견된다. 그러나 본질적인 객관적 현실(svaru pata/bdaggi ngo bo nyid)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찬드라에게 궁극적인 진리는 사물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특정한 고상한 인식에 의해 발견되는 모든 전통적인 사물의 본질이다. 그러나 찬드라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자연도 진정으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7]
찬드라키르티에 따르면 궁극적인 진리인 공허는 사람의 자기 없는 모습(푸드갈라나에라타미아)과 현상의 자기 없는 모습(다르마나에라타미아)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7] 찬드라커티는 사람, 현상(다르마), 공허함 그 자체가 모두 비현실적이고 공허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제시한다.[7]
궁극적인 진리, 모든 현상에 있어서의 자기 본성의 결여도 현상이 전혀 발생하거나 정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비록 전통적인 현상이 발생하여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도, 이러한 모습은 사실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다.[7] 따라서 찬드라키르티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는 지혜는 현상(다르마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또 다른 것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것으로부터, 또는 명분이 없는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다.[10] 나가르주나와 마찬가지로 찬드라커티는 현상 발생에 관한 모든 입장을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요약한다.
실체는 원인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예를 들어 신과 같은 명분을 통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또한 양쪽으로부터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의존적으로 발생한다.[7]
그런 의미에서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비현실적이며, 실제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환상과 같다.[7]
찬드라커티에 따르면, 이 아주 궁극적인 진리(즉, 공허와 비육지)도 의존적인 귀책의 잠정적 진리에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공허하다. 이것을 진술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재성이 결여된 것만이 의존적으로 생겨나고 인과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7]
찬드라커티는 공허의 공허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물의 내재적 실재의 공허는 그 자체로 지혜로운 자에 의해 '비움'이라고 불리며, 이 공허함도 어떤 내재적 실재도 공허한 것으로 간주된다. The emptiness of that which is called ‘emptiness’ is accepted as ‘the emptiness of emptiness’ (śūnyatāśūnyatā). 공허의 객관화를 본질적으로 실재(바바)로서 논할 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7]
따라서 '비움의 공허함'이라는 찬드라커티의 교리에 따르면 궁극적인 진리는 어떤 절대적 현실, 실존적 지상이나 존재론적 토대가 아니라 단순한 자연의 부재를 가리키며, 따라서 사물의 환상과 비현실적 성격을 가리킨다.[3][7]
관습의 비합리적이고 궁극적인 것의 불능성 때문에, 찬드라키르티는 마디아미카가 세속적인 관습이나 공통된 합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세속적 경험과는 별도로 관습적 진실에 대한 어떤 정교한 이론을 공식적으로 내세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9] 찬드라키르티에 따르면, 전통적인 진리의 작용(삼키야나 요가카라의 형이상학처럼)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들은, 통념적인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실제로 모호하게 하고 훼손시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이론들은 궁극적인 것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한 사람의 전통적인 직접적인 경험의 관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진리(우리 경험의 본질인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저해한다.[11]
프라사가와 추리
찬드라커티는 바비베카의 견해에 반하여 불상과 그의 마디아마카 방법을 옹호했다. 찬드라에 따르면 마디아미카스는 상대를 토론할 때 자율적이거나 독립적인 추론(svatantrarna)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1][12] 이 방법은 불교 인식론자 디그나가 개발한 것으로 바비베카 같은 마디아미카에 의해 채택된 것이었다.[13][14] 바비베카는 상대방에 대해 마디야마카 관점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려면, 비마디카 관점에 대한 자급자족적인 방식으로 마디야마카 관점을 증명하는 형식적 삼단논법(프라요가)으로 자신의 논문을 긍정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담자들[3][15] 따라서 그는 마디아마카에 대한 부처님의 분석이 불충분하다고 비난했다.[16]
찬드라키르티는 이 점에 대해 바르비베카를 비판하고 대신 마디아마카 사상가들은 프라사이가 주장(말 그대로 "일관")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주로 반대자들의 견해가 어떻게 불합리하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려는 환원적 주장을 말한다.[1][14][3] 게다가, 이러한 환원론들은 상대편 자신의 조건에 대한 상대편의 입장을 반박할 뿐이다. 그들은 그 대가로 반대 입장을 내놓지도 않고, 논쟁 과정에서 사용된 원칙과 결론에 대해 마드하미카를 범하지도 않는다.[17] 그런 의미에서 마디아미카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상대적 견해의 부조리를 지적할 뿐,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뿐이다.[17]
찬드라커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타당한 논리적인 주장(추론)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떤 결점을 다시 얻는다. 우리의 주장의 유일한 결실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무효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18]
찬드라커티는 삼단논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본질적인 본성이나 다른 형태의 근본주의나 본질주의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12][7] 그는 또한 나가르주나가 그런 주장을 활용하지 않고 프라사이가에 의존했다고 지적한다.[18] 찬드라키르티는 바비베카 같은 인물들은 사실 마디야미카가 아닌 것으로 보고 대신 "자기 변증법적 능력의 정도를 과시하려는 욕망에서 마디야마카 학파의 편을 들 수도 있다"고 본다. 찬드라커티에 따르면, 확실성과 논리에 대한 열망에 의해 동기부여된 이들 논리학자들의 철학적인 실천은 "결점이 하나둘 쌓이는 거대한 저장고"[18]가 된다. 따라서 찬드라키르티는 바비베카를 (나중의 티베트 문학자들과는 달리) 마디야미카로 보지 않고, 디그나가와 같은 다른 불교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논리학자(타르키카)로 본다.[19]
찬드라커티는 마드하미카가 독립적인 삼단논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또 다른 문제는 마드하미카 인터커셔터와 본질주의자 또는 현실주의 상대는 삼단논법 추론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제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적인 삼단논법을 발전시킬 기본적인 전제들에 대해 동의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20][12] 어떤 독립적인 삼단논법의 타당성은 그것이 사용하는 용어가 토론에서 양쪽 당사자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 그러나 찬드라키르티에 따르면 마드하미카와 현실주의자 사이의 논쟁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데, 바로 토론의 주제가 바로 토론의 대상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하는가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마디아미카는 결함이 없는 독립적인 삼단논법을 내세울 수 없다. 더욱이, 만약 양쪽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것들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들은 또한 토론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부족하다.[21]
한편 프라사가의 주장은 주로 부정적이어서, 어떤 긍정적인 논문이나 견해의 확언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상대의 주장을 해체할 뿐이다. 이와 같이 찬드라키르티는 프라사가의 주장이 마디아마카 철학의 아포파적 방법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3][10] 실제로 찬드라키르티에 따르면, 마디아마카는 전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지 않으며, 나가르주나의 Vigrahabyhavy Avartanī을 인용하며, 이 점에 대해 "나는 논문이 없다"고 말한다.[12]
찬드라키르티는 또한 디그나가와 같은 비마디카 인식론자들의 관점이 자신들의 구내에 충분한 논거의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나가르주나가 비그라하비 아바르탄의 프라마나의 기초를 비판한 것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10]
논리학자들의 관점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찬드라커티에게 있어서 모든 인지는 궁극적인 관점에서 무지를 수반하고 따라서 인지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허에 대한 명상은 물체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비어 있는 관념이나 견해조차도) 따라서 궁극적인 진실은 평범한 마음에서 벗어난다고 한다.[12][22] 그러나 찬드라커티의 생각에는 추리하는 역할이 있다. 추론은 존재와 비존재에 관한 모든 관점을 부정하는 데만 유용하다. 나아가 추리 역시 무지에 바탕을 둔 개념적 확산(프라파냐)에 의존하기 때문에 추리 역시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12] 따라서 찬드라키르티에게는 추리와 개념적 사고는 궁극적인 진리를 알 수 없는데, 궁극적인 것은 모든 개념과 분열적 확산(프라파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23] 그러나, 추리는 궁극적인 것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성과 사상의 바로 그 한계를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궁극적인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려는 어떤 시도가 모순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성은 그러므로 그것이 아닌 것을 밝혀냄으로써 말할 수 없는 궁극적 진리(즉, 지혜, 냐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만 실현될 수 있는 것)를 간접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24]
불상
찬드라커티의 불상관은 그의 아포칼립적인 견해와 관련이 있다. 찬드라커티에게 부처가 공허함을 아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대신 부처가 공허함을 아는 것은 그 대상을 아는 행위에는 대상도 마음도 관여하지 않는 무명(無名)이다. 이 때문에 찬드라키티는 부처에게 모든 심적 요소(시타카이트)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가 가르치고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 입장에서는 의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인식도 일어나지 않는다.[12]
요가카라의 비판
찬드라키르티는 그의 마디아마카파타라에서 비냐나바다("의식주의 교리")나 요가카라 학파의 견해와 같은 많은 불교적 관점을 반박하기도 했다.[25] 찬드라커티는 이 전통을 일종의 주관적 이상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이해했다.[10] 찬드라키르티에 따르면 요가카라 학파는 존재론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의식을 특권하기 때문에 의식의 공허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찬드라키르티에 따르면 둘 다 똑같이 공허하며 존재론적 영장성이나 궁극적 존재도 없다. 따라서 찬드라키르티에게 요가카라는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이 어떻게 조건화되고 공허해지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12][10]
찬드라커티는 또한 요가카라의 기본 이론에 대해 세 가지 천성 이론과 창고 의식 이론 등을 검토하고 반박한다.[8] 찬드라키르티는 창고의 의식이 간접적 의미(네야르타)의 잠정적 가르침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라오카바타라 수트라(Lakkavata Sutra)를 인용한다.[26] 그는 또한 지식의 외부 대상(바랴르타, 바히라르타)에 대한 요가카라의 부정과 '자기 인식'(svasambedana, svasamvitti)에 대한 요가카라 이론을 비판한다.[26]
게다가 찬드라커티는 마하야나 경전의 다양한 진술들을 요가카라 학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찬드라커티 교수에 따르면 '모든 것이 마음이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전 가르침은 부처로부터 우리의 고난이 외부 세력과 행위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생각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가르쳤다고 한다. 찬드라키르티에 따르면, 이러한 잘못된 관점에 맞서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 때문에 주로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부처님은 모든 것이 마음(citta-matra) 또는 사상/충동(vijnapti-matra)이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찬드라커티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존재론적 진술로 받아들이고 의식만이 존재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실수라고 주장한다.[10]
주요 작품
찬드라의 주요 작품은 다음과 같다.[7]
- 단순히 프라사나파다(명백한 말)로 알려진 무라마드야마카-vhtti-prasannapada(중도 기본 구절에 대한 명언), 나가르주나의 무라마드야마카아리카에 대한 해설.
- 마드야마카바타라(마드야마카 소개)와 함께 오토멘터리인 마드야마카바타바야(Madhyamaka)가 있다.[27] 마디야마카바타라는 대부분의 티베트 수도 대학들이 마디야마카에 대한 연구에 주요 자료로 사용된다.
- 카투우아타카시카(사백편 해설): 아리아데바의 사백절에 대한 해설.[28]
- 나가르주나의 육티차이카(육티차이)에 대한 해설서.
- jun나야타사타티-vṛti(공백에 관한 70개의 스탠자스에 관한 해설), 나가르주나의 n나야타사타티에 대한 해설.
- 파냐스카산다프라카라키아 (5개 골재에 관한 논의)
이후 영향력 및 주석
찬드라키르티에 대한 인도 논평은 단 한 가지뿐이며, 12세기 카슈미르의 마디아마카아바타라 해설이 자야난다를 맹비난했다.[29] 인도의 초창기 작가인 Prajnakaramati(950-1030)는 Shantideva의 보살바타라(Baudvacarya)에 대한 논평에서 Madhyamakahavatara를 격찬한다.[30] 아티샤(982–1054)의 작품, 특히 그의 두 가지 진리에 대한 소개(사티도바타라)는 찬드라키르티를 인용하며,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유효한 인식(프라마나)의 적용 가능성을 거부하는 그의 견해를 옹호한다.[31]
찬드라키르티의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후기 인도 작가로는 마이트르파다(c.1007–1085)가 있으며, 그는 카규 학파의 프라사기카 혈통의 출처 중 하나로 잡혀 있다.[32] 찬드라키르티는 굿 세이잉즈 컴펜디엄과 같은 일부 후기 인도 불교 탄트리크 작품에서도 인용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인도의 탄트리크 작가들 사이에서 특히 구야사마자 탄트라 아리아 혈통 사이에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리아 혈통에는 나가르주나, 아리아데바, 찬드라키르티(마지막 두 9세기나 10세기까지 연대를 할 사람은 수 있다)라는 이름으로 통하고 초기의 마드야마카 철학자들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탄트릭 작가들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33] 후기 티베트 작가들 역시 탄트리적인 인물들과 마디야마카 철학자들이 같은 인물이라고 믿기 시작했다.[34]
Another critical Indian author who refers to the work of Chandrakirti (and responds to it) is the later Bhāvaviveka or Bhāvaviveka II (author of the Madhyamakārthasaṃgraha and the Madhyamakaratnapradīpa), not to be confused with the first Bhāvaviveka (c. 500 – c. 578) who pre-dates Chandrakirti and authored the Madhyamakahrdaya and the Prajñāpradīpa. 루그에 따르면, 이 사람은 탄트리크 바하비크슈르티(c. 1000)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고 한다.[35]
찬드라키르티의 <마디야마카바타라>와 그 오토매틱을 최초로 티베트어로 번역한 것은 아티샤의 학생인 나크토 로타와에 의해 완성되었다.[36] 찬드라커티의 또 다른 초기 티베트 해설자는 팻사브 니마 드래그(12세기 평)로 찬드라 주요 작품의 대부분을 번역하기도 했다.[37][38] 논리학자 차파 처키 센게(12세기)는 다르마키르티의 인식론적 전통을 옹호하면서 찬드라키르티의 견해를 논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차파의 제자 마브자 창추브 창드뤼(1109–1169)도 찬드라키르티에 글을 쓴 또 하나의 중요한 초기 인물이다.[12] 마브자의 작품은 다르마키르티의 인식론과 찬드라키르티의 마디야마카의 조화를 꾀했다.[39] 찬드라커티는 티베트인들에 의해 우마 델규르(Willie: dbu ma thal 'gyur) 학교의 일부로 분류되었는데, 마드야마카 철학의 해석에 대한 접근법은 전형적으로 산스크리트어로 Prasa backgika로 역번역되거나 영어로 "정렬주의자" 또는 "대화론자" 학파라고 번역되었다.[40]
이러한 초기 해설자들의 영향으로 티베트에서는 찬드라커티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다. 후에 쑹카파, 왕추크 도르제 9대 카르마파, 잠곤 미팜과 같은 티베트 불교계의 중요한 인물들도 마두야마카바타라에 대한 논평을 썼다.
기타 찬드라키티스
티베트의 차랴파다 번역은 편찬자의 이름을 무니다타(Munidatta)라고 하고, 산스크리트어 해설은 카랴지코 śavavṛtti이며, 로타와 "번역자"는 찬드라키르티(Chandrakirti)라고 하였다. 이것은 후에 티베트 불교 후기 전승에서 티베트 번역을 도운 찬드라커티(Chandrakirti)이다.
《트리샤라샤삽타티(Triśaraṇaptati)》의 저자는 찬드라커티(Chandrakirti)라고도 불리지만, 이것은 7세기 찬드라커티와 같은 인물은 아닌 것 같다.[1] 《마디야마카》의 저자도 마찬가지다.[1]
찬드라키르티 또는 찬드라키르티파다라는 또 다른 인물도 있다. 《구야사마야자 탄트라》에 대한 해설서인 《프라다포도타나》의 저자다. 이와 같이, 그는 때때로 "탄트릭 찬드라커티"라고 불린다.[1]
참고 항목
메모들
- ^ Jump up to: a b c d e f g h i j 버스웰 주니어 & 로페즈 주니어, 2013년 캔드락슈르티 엔트리.
- ^ Jump up to: a b 애플, 제임스 B. 칸드라커티와 연꽃 경전. 동양철학연구소의 회보, 2015년 도쿄 31호,pp. 97-122번, 켄큐조 기요 도요 테츠가쿠.
- ^ Jump up to: a b c d e f g h i j k 에델글래스 2013
- ^ Vose 2015, 페이지 3-4.
- ^ Jump up to: a b Vose 2015, 페이지 2, 6.
- ^ 진파, 투프텐(번역기); Tsongkhapa, 2021, 페이지 6.
- ^ Jump up t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탁초이 2017
- ^ Jump up to: a b c d e f 루그 1981, 페이지 72.
- ^ Jump up to: a b Padmakara 번역 그룹 2005, 페이지 28.
- ^ Jump up to: a b c d e f g h 헤이스 2019
- ^ Padmakara 번역 그룹 2005, 페이지 29-30.
- ^ Jump up to: a b c d e f g h i 던, 존. 인도 티벳의 마흐야마카
- ^ 헤이스, 리차드, "마디야마카",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 (2017년 봄 에디션), 에드워드 N.잘타 (ed.), 곧 출간될 URL =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7/entries/madhyamaka/>.
- ^ Jump up to: a b Vose 2015, 페이지 3.
- ^ Padmakara 번역 그룹 2005, 페이지 20-21, 25.
- ^ Padmakara 번역 그룹 2005, 페이지 25.
- ^ Jump up to: a b Padmakara 번역 그룹 2005, 페이지 23.
- ^ Jump up to: a b c Dreyfus & McClintock 2015, 페이지 82.
- ^ Dreyfus & McClintock 2015, 페이지 82-83.
- ^ 2009년 뉴랜드 페이지 80.
- ^ Padmakara Translation Group 2005, 페이지 26-27.
- ^ Padmakara 번역 그룹 2005, 페이지 24.
- ^ 루그 1981, 페이지 75.
- ^ Padmakara 번역 그룹 2005, 페이지 24-27.
- ^ 페너, 피터 G. (1983) "장드락슈르티의 불교 이상주의 반박" 철학 동서 33권, 제3권 (1983년 7월) 하와이 프레스 대학교 P.251. 출처: [1] 웨이백머신에 보관된 2009-10-27 (접속: 2008년 1월 21일)
- ^ Jump up to: a b 루그 1981, 페이지 73.
- ^ 니커의 바다: 만물의 진면목, 타르파출판(1995) ISBN978-0-948006-23-4
- ^ Lang, Karen C. (2003). Four Illusions: Candrakīrti's Advice to Travelers on the Bodhisattva Path. Oxford University Press.
- ^ Vose 2015, 페이지 6.
- ^ Vose 2015, 페이지 21.
- ^ Vose 2015, 페이지 24.
- ^ Vose 2015, 페이지 28.
- ^ Vose 2015, 페이지 29-30.
- ^ Vose 2015, 페이지 31.
- ^ Vose 2015, 페이지 32.
- ^ 진파, 투프텐(번역기); 쑹카파, 2021년, 페이지 8.
- ^ 던, 존 D(2011년). "인도와 티베트의 마흐야마카." 옥스퍼드 세계철학 핸드북에서." J. 가필드와 W. 에델글라스가 편집했다. 옥스퍼드: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206-221.
- ^ Jump up to: a b Padmakara 번역 그룹 2005, 페이지 33.
- ^ Vose 2015, 페이지 9.
- ^ 캔드라커티 - 부다 월드. 2012년 1월 29일 접속.
참조
- 아놀드, 단(2005) 불교도, 브라만과 믿음: 남아시아 종교철학의 인식론. 컬럼비아 대학 출판부.
- Buswell Jr., Robert E.; Lopez Jr., Donald S. (2013). 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65. ISBN 9781400848058.
- Dreyfus, Georges B.J.; McClintock, L. Sara(2015). Svatantrica-Prasangika 구별: 차이가 만드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이먼과 슈스터.
- 던, 존. Jay, Garfield의 "Madhyamaka in India and Tibet"; Edelglass, William (2010) 옥스포드 세계철학 핸드북.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ISBN 9780195328998.
- 에델글래스, 윌리엄(2013). A에서 "캔드라커티"라고 하는 것이었죠. 샤르마(ed.), 인도 종교 백과사전 DOI 10.1007/978-94-007-1989-7
- 얏소, 켈상. 니커의 바다: 만물의 진면목, 찬드라커티의 중도에 대한 가이드 타르파 출판물(1995) ISBN 978-0-948006-23-4의 구절 해설
- 헤이스, 리처드 (2019), "마디야마카",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 에드워드 N. 잘타 (edd.)
- 헌팅턴, C. W. (2007) 공허의 공허함: 초기 인도 마드야마카에 대한 소개. 모틸랄 바나르시다스
- 진파, 투프텐(번역기); Tsongkhapa(2021) 의도 조명: 칸드라커티의 중도로 진입에 대한 설명. 사이먼과 슈스터.
- 뉴랜드, 가이(2009) 공허에 대한 소개: 쑹카파의 <길의 무대>에서 가르친 대로. 스노우 라이온. ISBN 978155939324.
- 파드마카라 번역단(2005) 중도에 대한 소개: 찬드락커티의 주 미팜의 해설과 함께 <마디야마바타라>. 샴발라 출판사
- 루그, 데이비드 세이포트(1981) 인도의 마드야마카 철학교의 문학. 오토 하라소위츠 베를라크.
- 탁초, 소남 (2017), "인도의 두 가지 진리의 이론",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 에드워드 N.잘타 (edd.
- 보세, 케빈 A. (2015) 부활 칸드라커티: 티벳의 프라산기카 창조의 분쟁 사이먼과 슈스터.
외부 링크
- Geshe Jampa Gyatso - 마스터 프로그램 중간 길
- 조 윌슨. 찬드라커티의 사심 없는 인간성에 대한 일곱 가지 추리 명상
- 칸드라키르티의 비냐나바다 비판, 로버트 F. 올슨, 철학 동서, 제24권 1977호, 페이지 405-411호
- 칸드라키르티의 자기 부정, 제임스 뒤링거, 철학 동서, 제34권 제3호 1984년 7월, 페이지 261–272
- 찬드라키르티의 불교 이상주의 반박, 피터 G. 페너, 철학 동서, 제33권 제3호, 1983년 7월, 페이지 251-261
- 로버트 A. F. 비트겐슈타인과 찬드라커티의 철학적인 논고센트리즘 서먼, 철학 동서, 제30권 1980년 7월 3일자 321~3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