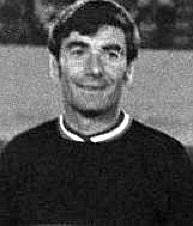치다바사
Chidabhasa치다브하사는 보편적 자아인 브라흐만의 아바사 또는 성찰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용어로,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개별적 자아인 지바에서 반영되는 보편적 자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철학적 조건화는 치다바사에 속한다.[1] The causal body or the Karana Sarira which is the cause of man’s enjoyment or suffering is composed of the Anandamaya Kosha and adheres to the soul so long as the soul resides in the Sthula Sarira ('gross body') or the Sukshama Sarira ('subtle body'), both vehicles of Avidya ('ignorance'); afflicted by vasanas ('desires/longings') the ordinary being는 카라나 사리라(카이발야나바니타 II.31)의 앳맨의 반영인 치다바사가 되지 않는다.[2]
Avidya('무시')는 시작점이 없고, Upadhi('제한적 부속물')이다. '치다바사'는 의식의 부처('ego')를 부처에 비추는 것으로, 아비다의 효과로서 부처와 불가분의 결합을 이루고 있다.[3] 지바는 의식의 불완전한 형태고 비현실적이다. 니루냐 브라만은 치다바사가 실제 의식으로 나타나 비야바하리카 세계에서 도인, 향락자, 고통자 등으로 활동하게 한다. 치다바사는 이스바라트바를 구성하고, 그것이 평형상태에서 프라크르티와 연관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활동중인 총포들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식과 거의 흡사하다.[4] 즐기는 자와 고통받는 자인 지바는 불변의 쿠타사나 치다바사(지성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으 로서)가 아니라 둘의 조합이다. 쿠타사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지바는 모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을 현실로 간주하고, 지바 프로젝트는 자아의 행동의 자질 등을 중첩시킨다.;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와 꿈은 많은 형태를 띤다.[5]
베단타는 모든 지바에게 하나의 앳먼이 있으며, 한 지바와 다른 것을 구별하는 것은 분리된 안타카라나와 치다바사(두 개는 신체의 미묘한 부분)이다.[6] 어떤 물체는 치다바사차이타니야의 도움으로 정신에 의해 알려져 있는데, 치다바사가 행동하기 시작할 때 물체의식이 있다. 프라크르티의 변형인 지성은 물체가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체를 알 수 없다. 수레스바라차랴는 모든 외부 인식에서 자신을 조명 요인으로 나타내는 의식은 실제로 알려져야 할 대상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식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7]
참조
- ^ Swami Ramanandasarasvati (1969). The Hindu Ideal. Sri Ramananda Centenary Memorial Committee. pp. 67–71.
- ^ Alice Bailey (1973). A Treatise on Cosmic Fire. Lucis Publishing Companies. p. 391. ISBN 9780853301172.
- ^ Tattvalokah Vol.8. Sri Abhinava Vidyateertha Educational Trust. 1985. pp. 7–8.
- ^ Kaulacharya Sadananda (1918). Isha Upanishat: with commentary. Luzac. pp. 5–6.
- ^ Dilip Vol. 8-9. 1982. pp. 6–10.
- ^ Swami Iswarananda (1964). Does the Soul Reincarnate?. Sri Ramakerishna Ashram. p. 21.
- ^ Swami Krishnanada. "The Philosophy of the Panchada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