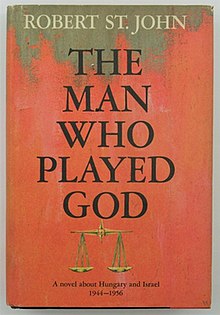딤쯔움
Tzimtzum| 다음에 대한 시리즈 일부 |
| 갑발라 |
|---|
The tzimtzum or tsimtsum (Hebrewצמצוםṣimṣūm "contraction/constriction/condensation") is a term used in the Lurianic Kabbalah to explain Isaac Luria's doctrine that God began the process of creation by "contracting" his Ohr Ein Sof (infinite light) in order to allow for a "conceptual space" in which finite and seemingly independent realms could exist. 이 원초적인 초기 수축으로, ḥ랄합파누이의 "약간 공간"을 형성한다.חלל הפנוי)는 새로운 창조적 빛이 비칠 수 있는 곳으로 tzimzum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으로 표시된다. 갑발론적 해석에서 딤츠움은 진공과 결과적 창조 안에서 동시에 신의 존재와 부재의 역설로 이어진다.
함수
딤츠움은 영적·물리적 세계와 궁극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존재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낳기 때문에 신을 흔히 '하-마콤(下-Makom)'이라고 부른다. 랍비닉 문학("그는 세계의 장소지만 세상은 그의 장소가 아니다")에 나오는 "장소", "전능적")이다.[1] 이와 관련, 올람은 "세계/현실"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교화"를 의미하는 뿌리 עלם에서 유래되었다. 이 어원은 이후의 영적 현실과 궁극적인 물리적 우주가 창조의 무한한 영적 생명력을 다른 정도로 은폐한다는 점에서 딤츠움 개념을 보완하고 있다.
창조에서 왕국에서 왕국으로 신성한 오(빛)의 점진적인 감소는 복수형에서도 2차 딤츠밈(수없이 많은 "생명의 응집력/베일링/분쟁")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후의 은닉은 일찍이 중세 갑발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루리아의 새로운 교리는 유한한 존재와 인과적 창조적 사슬을 조화시키기 위해 원시적 철수(dilug – 급진적 "도피")의 개념을 진전시켰다.
창조 이전에는 모든 존재를 채우는 무한의 오르인 소프만이 있었다. 세상을 창조하려는 G-d의 의지에서 생겨났을 때, 그리고 분출된 ... 그는 (히브리어 "tzimzum"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점, 바로 그의 빛의 중심점에 수축시켰다. 그는 그 빛을 중앙점을 둘러싸고 있는 양쪽으로 거리를 두면서 제한하여, 중앙점에서 멀리 떨어진 텅 빈 빈 빈 공간이 남게 했다... 이 딤쯔움 이후에... 그는 오르 아인 소프(Or Ein Sof)에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빈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의 빛으로부터 한 줄의 직선을 끌어내렸고, 그것은 그 공허 속으로 내려가도록 사슬로 묶였다. ... 그 공허의 공간에서 그는 모든 세계를 발산하고 창조하고 형성하고 만들었다.
내재적 역설
갑발라에서 흔히 있는[3] 이해는 딤츠움이라는 개념은 내재된 역설을 포함하고 있어 신이 초월적이고 동시에 임마멘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비즈: 한편으로는 "무한"이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신의 총체성에 압도될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는 위와 같이 신의 초월성을 요구한다. 한편, 신은 창조된 우주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따라서 우주로부터 부재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는 신성한 생명력은 그 안에 끊임없이 존재해야 한다... 만약 이 생명력이 단 한 순간이라도 창조된 존재를 포기하게 된다면, 창조 이전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무성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4]
브레슬라프의 랍비 나흐만은 이러한 내재된 역설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오직 미래만이 "빈 공간"을 존재로 만든 딤츠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두 가지 모순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 빈 공간은 딤츠움(Tzimzum)을 통해 생겨났는데, 그곳에서는 그대로 그의 신성을 '제한'하고 거기서부터 수축시켰는데, 마치 그곳에는 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2] 절대적인 진리는 경건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건함이 생명을 주시지 않고는 확실히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과 갑발라
현대 과학과 전통적인 갑발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유대교의 성서 종교에서는 빛이 다른 것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간주하는 가운데 우주가 최초로 창조될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리아 이후의 과학적 교리"이다.
루리아식 사고
아이작 루리아는 4개의 중심 테마를 갑발리즘 사상, 딤츠움, 셰비라트 하켈림(혈관 파괴), 틱쿤(수리), 파르츠핌으로 소개했다. 이 네 가지는 상호 관련되고 지속되는 과정의 그룹이다. 딤츠움은 하나님이 어떤 지역에서 자신의 본질을 철수시켜 창조가 시작될 수 있는 영역을 창조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첫 단계를 묘사하고 있다. 셰비라트 하켈림은 딤츠움 이후 어떻게 하나님이 빈 공간에 그릇(하켈림)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빛을 그릇 속에 쏟아 붓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빛의 힘을 지탱할 만큼 강하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는지(셰비라트)를 묘사한다. 세 번째 단계인 틱쿤은 산산조각이 난 용기의 파편들과 함께 실려 내려온 신의 빛의 불꽃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다.[5]
딤츠움은 유배 개념과 연결되고 틱쿤은 인간 존재의 세계의 문제를 보수할 필요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루리아는 갑발라의 우주론을 유대인 윤리의 실천과 결합시키고, 윤리와 전통적인 유대 종교관람을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짝을 완성하고 완성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삼는다.전통적인 유대인 생활의 설교를 통한 리알 [6]세계 따라서, 이전의 중세 갑발라와는 대조적으로, 이것은 최초의 창조적인 행위를 계시를 펼치기 보다는 은폐/분열한 망명자로 만들었다. 신성한 흐름 속에 있는 이 역동적인 위기-경향은 루리아식 계략 전반에 걸쳐 반복된다.
차바드 전망
로 말 그대로, 그러나 차라리는 하느님께 한정된 현실의 의식이 떠오른다:[7]따라서 tzimtzum만 진짜 과정으로라 교리로 보여진다는 모든 사람이고, 실제로 required,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의 존재 깊은 인상을 주는 매너로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위한 것이 아니Chabad Hassidism에서 tzimtzum의 개념으로 알고 있다. 로 이해하고 묵상하다
차바드 견해에서, 딤츠움(tzimzum)의 기능은 "생성된 존재로부터 그 안의 활성화력을 감추어, 그 원천 내에서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실체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8] tzimzum은 신의 존재를 직접 인식하지 못한 채 필요한 "가산된 공간"(chal panui חללל פני, chalalal חללל)을 생성했다.
빌나 가온의 견해
빌나 가온은 딤츠움이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우주가 단지 환상일 뿐이며, 딤츠움이 비유적인 것일 뿐이며, 갑발라의 신비에 완전히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감지할 수 없거나, 심지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인 "상위 통합"을 고수했다.[9]
다른 사람들은 빌나 가온이 딤줌의 문자 그대로의 관점을 가졌다고 말한다.[10]
슐로모 엘리시브는 이러한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한다(그리고 그것은 빌나 가온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루리아의 직설적이고 단순한 읽을거리일 뿐 아니라 유일한 진정한 이해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사물을 깊이 설명하는 몇몇 현대 갑발리스트들의 말에서도 아주 이상한 몇 가지를 보았다. 그들은 모든 존재는 환상과 외모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ein sof 그 자체와 그 필요한 참된 존재 자체로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지금은 여전히 창조 이전과 정확히 똑같으며, 알려진 바와 같이 Him의 빈 공간도 없다는 것이다(네페쉬 하차임 샤르 3 참조). 따라서 그들은 "예언자의 손에 내가 나타나리라"(호세아 12:11)라는 구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존재에는 전혀 실체가 없으며, 모든 세계는 환상일 뿐이며 외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세상과 인류는 실존하는 것이 없고, 그들의 전체 현실은 겉모습일 뿐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치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감각으로 우리 자신을 지각하며, 감각으로 세상을 지각한다. [이 의견에 따르면] 인간성과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식일 뿐이지 진정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는데, 이는 그가 모든 세계를 채우기 때문에 진정한 현실에서는 어떤 것이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다니 얼마나 이상하고 씁쓸한가. 그런 의견에서 우리에게 화가 난다. 그들은 그런 의견들로 토라 전체의 진실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11]
그러나 가온과 엘리야시브는 딤츠움이 하나님의 뜻(랫존)에서만 일어났을 뿐, 하나님 자신에 대해 전혀 말할 수 없다고(아츠무스)고 버티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실제로 신의 본질에서 문자 그대로의 딤츠움을 믿지 않았다.[citation needed] 그러나 루리아의 에츠 차임 그 자체는 제1차 샤아르에서는 양면성이 있다: 신의 본질과 자아에서 문자 그대로 딤츠움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신의 빛에서 딤츠움으로 몇 줄 뒤 바뀐다(출발된, 따라서 창조된, 그리고 신의 자력, 에너지의 일부가 아니다).[citation needed]
역사와 헤스터 파님
현대 시대에 쇼아는 신학적 사고에 대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헤스터 파님[clarification needed](Hester Panim)은 현대적 외세의 일부분이다. Tzimzum은 창조 이전의 과정이지만 역사 중에는 현대 철학이 알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구조"가 존재하기도 한다. 쇼아의 특징은 개인 생활의 일부분이며 이러한 역사 구조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밤의 깊은 어둠 속을 걸어 내려가는 누군가와 견줄 만하다. 그는 가시와 우물, 들짐승과 도적들을 무서워하였다. 어디로 걸어가는지 알지 못하였다. 불타는 횃불을 찾아 가시와 구덩이를 없앴지만 여전히 야수와 도적들을 두려워했다...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말이야 새벽녘에 야수들과 도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아직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갈림길에 섰을 때, 그는 그들 모두에게서 구원을 받았다.... 이 갈림길이 뭐지? 라브 치스다는 "탈미드 차감과 죽음의 날"이라고 말한다. (탈무드, 소타 21a)
임상심리학의 응용
이스라엘의 모르드차이 로텐베르크 교수는 카발리스틱-하시디치 딤츠움 패러다임이 임상 치료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세상을 위해 공간을 비우는 신의 '자기 굴절'은 인간의 행동과 상호작용의 모델이 된다. 딤츠움 모델은 서구 심리학의 언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독특한 공동체 중심 접근을 촉진한다.[12][failed verification]
대중문화에서
침썸은 1997년 아례 레브 스톨만의 소설 '극유프라테스'의 줄거리의 중심이다.
'Tsim Tsum'은 사브리나 오라 마크(2009년 발간)의 vignette 모음집 제목이다.
얀 마르텔의 소설 《라이프 오브 파이》와 2012년 영화 각색에서는 침썸이라는 화물선이 유대인의 개념인 딤츠움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줄거리의 중추적인 지점에 가라앉는다.
참고 항목
메모들
- ^ 파샤트 바예이체이: 얄쿠트 시모니(Yalkut Shimoni)라는 구절에서 "그가 도착했다.또 미드라쉬 베레시트 랍바 68장 9절. 하마콤 기사, inner.org
- ^ Rabbi Moshe Miller. "The Great Constriction". KabbalaOnline.org.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05-01-24.
- ^ 예를 들어 Aryeh Kaplan, "Paradoxes"(The Aryeh Kaplan Reader, Artscroll 1983에서)를 참조하십시오. ISBN 0-89906-174-5)
- ^ "Chapter 2 - Shaar Hayichud Vehaemunah". Chabad.org. 2014-07-03. Retrieved 2015-02-25.
- ^ 제임스 데이비드 던, 윈도 오브 더 소울, 페이지 21-24
- ^ J.H.라넨, 유대인 신비주의, 페이지 168-169
- ^ "Tzimtzum: Contraction". Inner.org. Retrieved 2013-12-08.
- ^ 타냐, 샤르 하이추드 베하에무나, ch.4
- ^ E. J. 쇼체트, 하시드 운동과 빌나의 가온
- ^ 알란 나들러, 미트나그딤의 신앙
- ^ 레셈 슈보 ve-Achlama Sefer Ha-Deah drush Olam hatohu chellek 1, drush 5, siman 7, 섹션 8 (p. 57b)
- ^ "Rotenberg Center for Jewish Psychology". Jewishpsychology.org. Retrieved 2013-12-08.
참조
- 제이콥 임마누엘 쇼체트, 샤시디즘의 신비주의 개념들, 특히 제2장, 키핫 1979, 3차 개정판 1988. ISBN 0-8266-0412-9
- Aryeh Kaplan, "Paradoxes"의 Aryeh Kaplan 1983년 "The Aryeh Kaplan Reader"에 나온다. ISBN 0-89906-174-5
- 아례 카플란, "Innerspace", 모즈나임 펍. 주식회사 1990. ISBN 0-940118-56-4
- 아례 카플란은 모즈나임 1979년 "유대인 사상의 핸드북"에 나오는 하나님 2장을 이해한다. ISBN 0-940118-49-1
외부 링크
- Tzimzum: A Primer, chabad.org
- Tanya, Shaar HaYichud VeleaEmunah Sneur Zalman of Liadi—Tanya의 레슨 참조, chabad.org
- 샤아르 하이추드 - 통일의 문, 도베르 슈네우리 - 쯔힘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
- 베야다타 - To Know G-d, Sholom Dovber Schneersohn, Tho Know Tzum의 역설에 대한 하시드 담론
- inner.org, "갑발라와 차시두트의 기본"
- 타냐=테제다카(www.chabad.org)와 함께 세계 경제의 쯔짐쯔움(Tzimzum)과 아모니(Armony)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