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아 제국
Empire of Nicaea니케아 제국 βα σιλεία ῥ ωμα (그리스어) | |||||||||||
|---|---|---|---|---|---|---|---|---|---|---|---|
| 1204–1261 | |||||||||||
콘스탄티노플 함락 10년 후인 1214년 동로마 제국의 상황. | |||||||||||
| 상황 | 비잔티움 제국의 움프 주 | ||||||||||
| 자본의 | Nicaea (İznik) (de jure) Nymphaion (Kemalpaşa) (de facto) | ||||||||||
| 공용어 | 비잔틴 그리스어 | ||||||||||
| 종교 | 그리스 정교회 (공식)[1] | ||||||||||
| 정부 | 군주제 | ||||||||||
| 황제 | |||||||||||
• 1204–1222 | 테오도르 1세 라스카리스 | ||||||||||
• 1222–1254 | 요한네스 3세 두카스 바타츠 | ||||||||||
• 1254–1258 | 테오도르 2세 | ||||||||||
• 1258–1261 | 요한 4세 라스카리스 | ||||||||||
• 1259–1261 | 미하엘 8세 팔라이올로고스 | ||||||||||
| 역사시대 | 고중세 | ||||||||||
• 설립 | 1204 | ||||||||||
• 해체됨 | 1261년 7월 | ||||||||||
| |||||||||||
|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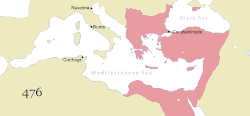 |
| 선행 |
| 초기 (330–717) |
| 중기(717~1204) |
| 후기 (1204–1453) |
|
| 타임라인 |
| 주제별 |
| |
니케아 σιλεί(그리스어: βα ῥ ωμα ίων) 또는 니케아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자루로 알려진 군사 사건인 제4차 십자군 전쟁 동안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서유럽과 베네치아 군대에 의해 점령되었을 때 달아난 비잔티움 제국의 귀족들에 의해 세워진 세 개의 비잔티움 그리스 갱도 국가들 중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1204년에 일어난 트레비존드 제국과 에피루스 전제군주와 같은 제국의 분열로 인해 형성된 다른 비잔티움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까지 잘 살아남은 로마 제국의 동쪽 절반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사학에서 라틴 제국으로 알려진 네 번째 국가는 콘스탄티노플과 주변 지역을 점령한 후 십자군 군대와 베네치아 공화국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라스카리스 가문에 의해 세워진 [4]그것은 1204년부터 1261년까지 지속되었는데, 그 때 니케네스 왕조가 콘스탄티노플의 비잔틴 제국을 탈환한 후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니케네 제국은 1205년에 비잔티움 제국의 전통적인 칭호와 정부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의 직접적인 연속으로 여겨집니다.
1224년 에피로스 전제군주는 테살로니카 제국이 되었지만, 1242년 니케네스에 의해 그들의 주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204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몇 주 전에 독립을 선언한 트레비존드 제국은 결국 1282년 조약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지속이라는 주장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역사
토대
1204년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 5세 뒤카스 무르초플로스는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공한 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탈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 알렉시오스 3세 안젤로스의 사위 테오도르 1세 라스카리스가 황제로 선포되었지만, 콘스탄티노플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역시 비티니아의 니케아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에 세운 라틴 제국은 옛 비잔티움 영토에 대한 지배력이 약했고, 에피루스, 트레비존드, 니케아 등에 비잔티움 제국의 그리스계 후계국들이 생겨났습니다. 트레비존드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기 몇 주 전에 독립 국가로 분리되었습니다.[5] 그러나 니케아는 라틴 제국과 가장 가까웠고 비잔티움 제국의 재건을 시도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테오도르 라스카리스는 플랑드르의 헨리가 1204년에 푸이마네논과 프루사(현재의 부르사)에서 그를 패배시켰기 때문에 즉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테오도르는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라틴 황제 볼드윈 1세의 불가리아 패배 이후 아나톨리아 북서부의 많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헨리는 불가리아의 차르 칼로얀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유럽으로 소환되었기 때문입니다.[6] 또한 테오도르는 트레비존드의 군대와 다른 소규모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를 후계국 중 가장 강력한 국가의 책임자로 남겼습니다.
비잔티움의 후계 국가들, 라틴 제국, 불가리아 제국, 그리고 니케아와 국경을 맞댄 이코니움의 셀주크들이 서로 싸웠기 때문에, 그 후 몇 년 동안 수많은 신탁과 동맹이 형성되고 깨졌습니다. 1211년 미앤더 강에 있는 안티오키아에서 테오도르는 알렉시오스 3세 안젤로스의 권력 복귀를 지지하는 셀주크족의 대규모 침공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안티오키아에서 입은 손실은 라틴 제국의 손에 의해 린다쿠스 강에서 패배하고 이후 님파움 조약에서 미시아와 마르마라 해 연안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1212년 다비드 콤네노스의 죽음으로 인해 니케네스는 파플라고니아에 있는 그의 땅을 합병할 수 있게 되면서 영토 손실을 보상받았습니다.[7]
1205년 테오도르는 비잔티움 황제들의 전통적인 칭호를 받았습니다. 3년 후, 그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정교회 총대주교를 새로 선출하기 위해 교회 평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새 총대주교는 시어도어 황제로 즉위하고 시어도어의 수도 니케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219년 플랑드르의 라틴 황후 욜란다의 딸과 결혼했지만, 1221년 사망하고 사위 요한 3세 두카스 바타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팽창

처음에 세바스토크라토레스 이삭과 테오도르 1세의 형제 알렉시오스가 라틴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바타테스의 즉위는 라스카리드에 의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타츠는 포이마네논 전투에서 그들의 연합 군대보다 우세했고, 그의 왕좌를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라틴 제국이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아시아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1224년에 테살로니카 왕국은 에피로스의 독재자 테오도르 콤네노스 두카스에게 함락당했고, 그는 바타테스에 대항하여 황제로 즉위하고 테살로니카 제국을 세웠습니다. 1230년 크로코트니차 전투 이후 불가리아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명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트레비존드에게 실질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니케아는 유일하게 유효한 비잔티움 국가였고, 요한 3세는 에게 해를 가로질러 그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1235년 그는 불가리아의 이반 아센 2세와 동맹을 맺어 테살로니카와 에피루스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1242년 몽골군은 니케아 동쪽의 셀주크 영토를 침공했고, 요한 3세는 다음에 그를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결국 니케아에 대한 셀주크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1245년 요한은 프리드리히 2세의 딸 호엔슈타우펜의 콘스탄스 2세와 결혼하여 신성 로마 제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1246년, 요한은 불가리아를 공격하여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의 대부분을 회복하고 테살로니카를 그의 영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1248년까지 존은 불가리아를 물리치고 라틴 제국을 포위했습니다. 그는 1254년 사망할 때까지 라틴족으로부터 땅을 계속 빼앗았습니다.
요한 3세의 아들 테오도르 2세 라스카리스는 트라키아에서 불가리아의 침략에 직면했지만 성공적으로 그 영토를 지켰습니다. 1257년 니케아와 에피루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258년 테오도르 2세가 사망했을 때 시칠리아의 만프레드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요한 4세 라스카리스가 그의 뒤를 이었지만, 그는 아직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장군 미하엘 팔레올로고스의 섭정 하에 있었습니다. 미카엘은 1259년에 공동 황제(미카엘 8세)를 선언했고, 곧 펠라고니아 전투에서 에피로스의 독재자 만프레드와 라틴계 아이케아 왕자의 연합 침공을 물리쳤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탈환

1260년 미카엘은 전임자들이 할 수 없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자체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노바와 동맹을 맺었고, 그의 장군 알렉시오스 스트라토풀로스는 그의 공격을 계획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몇 달 동안 관찰했습니다. 1261년 7월, 대부분의 라틴 군대가 다른 곳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시우스는 경비병들에게 도시의 문을 열도록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제노바의 적이었고, 1204년에 도시를 함락시킨 큰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베네치아의 영토를 불태웠습니다.
미카엘은 몇 주 후 비잔티움 제국을 회복하면서 황제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케아는 곧 탈환되었지만, 트레비존드와 에피루스는 비잔티움 그리스의 독립 국가로 남아있었습니다. 복구된 제국은 또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셀주크족을 대체하기 위해 생겨났을 때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후폭풍
1261년 이후 콘스탄티노플은 다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8] 옛 니케아 제국의 영토는 부를 빼앗겼고, 이는 콘스탄티노플을 재건하고 라틴 국가들과 에피로스에 대항하는 유럽의 수많은 전쟁에 자금을 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군인들이 이동하면서 옛 변경지역은 상대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튀르키예 가지의 습격은 통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국경은 점점 더 넘치고 있었습니다.
1261년 미카엘 8세 팔라이올로고스에 의해 합법적인 라스카리드 통치자 요한 4세 라스카리스의 찬탈은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복원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항하는 많은 대중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요한 4세는 니케아에 남겨졌고, 후에 미카엘의 11번째 생일인 1261년 12월 25일에 미카엘의 명령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었고, 그는 추방되어 비티니아의 요새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행동은 총대주교 아르세니우스 아우토레이아누스에 의해 미카엘 8세 팔라이올로고스의 파문으로 이어졌고, 나중에 니케아 근처에서 의사 요한 4세에 의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니케아 제국의 이전 영토의 후속 역사는 투르크에 의한 점진적인 정복 중 하나입니다. 1282년 미카엘 8세가 사망한 후, 터키의 습격은 영구적인 정착지로 바뀌었고, 옛 비잔틴 영토에 터키인의 비욘세가 세워졌습니다. 안드로니코스 2세 황제가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약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300년경, 니케아 제국의 거의 전체가 터키인들에 의해 정복되었고, 콘스탄티노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영토만이 매달렸습니다. 비잔티움 소아시아의 마지막 종말은 1326년 부르사, 1331년 니케아, 1337년 니코메디아의 멸망과 함께 왔습니다.
군사의
니케네 제국은 비잔티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그리스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라틴/불가리아의 지배하에 있던 트라키아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제국은 그 높이에 약 20,000명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상당히 많은 군사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십자군 국가들과의 수많은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케네스는 콤네니아 군대의 일부 측면을 계속 유지했지만, 콤네니아 황제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면, 니케네스 비잔티움 제국은 마누엘 황제와 그의 전임자들이 파견한 군대의 수와 질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서아시아 소아시아는 바다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대부분의 분할된 국가들보다 부유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념과 헬레니즘
니케네의 궁정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인구를 묘사하기 위해 이전의 로마인 대신 "헬레네"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했습니다.[9] 동시대 사람들은 니케아 제국을 위해 "헬라스" 또는 "헬레니콘"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10][11] 이와 같이, 테오도르 라스카리스 황제는 때때로 로마오이(로마인)와 그라이코이(Graikoi)라는 용어를 헬레네로 대체했습니다.[12] 테오도르 2세 황제는 그의 영역을 새로운 헬라스라고 설명합니다.[13] 게르마노스 2세 총대주교는 서방 세계와 공식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지역 인구를 나타내는 "그라이코이", 국가 이름을 나타내는 "그리스인의 제국"(그리스어: βα σιλεί ρ ικώνα των γ)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리스 민족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일치된 계획이 있었습니다.[14]
일부 학자들은 니케네 제국 시대를 그리스 민족주의와 그리스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다는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자들은 민족의식의 상승이 공식적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경고합니다.[15]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비잔티움을 로마 제국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은 니케네 황제들의 신하들을 위한 로미오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보여주듯이 뒤집히지 않았습니다.[15] 니케네 제국의 공식적인 이념은 재신임과 군국주의의 하나였는데, 14세기 후기 팔라이올로고스 수사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16]
13세기 니케아의 이념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지속적인 중요성에 대한 믿음과 도시를 탈환하려는 희망으로 특징지어졌으며, 구약성경의 유대인의 섭리에 대한 생각보다는 정치적 보편주의나 헬레니즘 민족주의에 대한 주장에 더 주목했습니다. 이 시기의 황제는 종종 모세나[17] 조로바벨에 비유되기도 하고, 심지어 니케타스 초니테스가 쓴 테오도르 1세 라스카리스의 연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불의 기둥"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18]
이 시기의 수사학은 또한 구약성경에서 그려지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쟁과 콘스탄티노플의 재침략을 미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Chonates는 Theodore I Laskaris라는 그의 판지에서 셀주크 술탄과의 전투를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전투로 묘사하고, 적 지휘관을 죽인 Theodore의 상처를 수사학적으로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의 상처와 비교합니다.[19] 디미터 안젤로프(Dimiter Angelov)는 서방의 십자군 사상이 재침략에 대한 이러한 견해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 기간 동안 총대주교 미하엘 4세 아우토레이아노스(Michael 4세 Autoreianos)가 전투에 참가하려는 니케네 군대에게 죄의 완전한 면제를 제공했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는 서방의 전체 면죄부와 거의 동일한 관행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단명하였고, 가능한 십자군의 영향 중 많은 것들이 1211년 이후에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19]
13세기 비잔티움 제국도 1204년 이후 제국의 상황과 고전 그리스의 상황 사이에 유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이 증거는 A와 같은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 바칼로풀로스(E. Vacalopoulos)는 비잔티움의 고전적인 과거에 대한 재평가와 결합하여 그리스 민족주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20]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잃으면서, 이 비교는 야만인들에 둘러싸인 "헬레네스"에 대한 생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초니테스는 테오도르 1세에 의해 살해된 셀주크 술탄을 크세르크세스와 동일시했고, 총대주교 게르마노스 2세는 요한 3세 바타제스의 승리를 또 다른 마라톤 또는 살라미스 전투로 회상했습니다.[21] 시어도어 2세 라스카리스는 아버지의 승리를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승리와 비교하여 동시대의 "헬레네스"의 무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22]
게다가, 이 시기 동안에 "헬렌"이라는 단어가 비잔틴 용어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렌"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고 특히 이교도의 잔재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Graikoi"와 "Hellenes"라는 용어는 제국과 그 시민들을 라틴인들과 차별화하려는 열망에 자극받아 종교적, 민족적 자기 정체성의 형태로 제국의 외교적 사용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23] 특히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게르마누스 2세는 이러한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의 편지들은 그의 헬레니즘 혈통의 순수함과 같은 것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와의 어떤 연관성보다도 그의 헬레니즘적 언어와 민족적 배경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으며, 그 도시를 소유한 것을 자랑하는 라틴인들에 대한 그의 경멸을 보여주었습니다. 헬레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로데릭 비튼(Roderick Beaton)은 12세기에 "헬렌"(Hellenes)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증거를 고려하여 이 용어의 재평가가 1204년 콘스탄티노플이 상실되기 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바칼로풀로스와 달리,[24] 베아톤은 그리스 민족주의의 탄생이 아니라, 주로 언어에 기반을 둔, 배아적인 "민족적" 인식이라고 봅니다.[25]
마이클 앤골드(Michael Angold)는 이 시기의 이념은 망명을 포함한 변화하는 문화적, 정치적 상황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비잔티움 제국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시기의 이념적 발전은 대부분 팔라이올로고이의 복구된 제국에 의해 중단되고 폐기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마이클 8세가 이전 시대의 이념으로 돌아갔을 때.[26]
황제들
- 테오도르 1세 라스카리스 (1204–1222)
- 요한 3세 두카스 바타츠 (1222–1254)
- 테오도르 2세 라스카리스 (1254–1258)
- 요한 4세 라스카리스 (1258–1261)
- 미카엘 8세 팔레올로고스 (1259년-1261년 공동 황제, 복원된 비잔틴 제국)
참고 항목
인용
- ^ Melton, J. Gordon (2014). Faiths Across Time: 5,000 Years of Religious History [4 Volumes]: 5,000 Years of Religious History. ABC-CLIO. p. 800. ISBN 978-1-61069-026-3.
- ^ Vasiliev, Alexander A. (1952). History of the Byzantine Empire, 324–1453. Univ of Wisconsin Press. p. 546. ISBN 978-0-299-80926-3.
- ^ 존 아서 개러티, 피터 게이 (1972), 454쪽: "니케아에 망명한 그리스 제국은 소아시아에서 쫓겨나기에는 너무 강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에피로스에서는 또 다른 그리스 왕조가 침입자들을 물리쳤습니다."
- ^ a b 초기부터 1964년까지의 그리스의 짧은 역사 W. A. 휴틀리, H. C. 다비, C. W. 크롤리, C. M. 우드하우스 (1967), p. 55: "거기 번영하는 도시 니케아에, 전 비잔티움 황제의 사위인 테오도로스 라스카리스가 곧 작지만 되살아나는 그리스 제국이 되는 궁정을 설립합니다."
- ^ 미하엘 파나레토스, 크로니클, ch. 1. 원본-파그멘테, 크로니켄, 인시프텐, 안드레 마테레 주르 게슈히테 데 카이저툼 트라페준트, 2부; 아반들룽겐데르 히스토리센 클라세 데 쾨니글리히 바이엘리스헨 아카데미 4(1844), abth. 1, pp. 11; 독일어 번역, p. 41
- ^ 앨리스 가디너, 니케아의 라스카리드: 망명중인 제국의 이야기, 1912, (암스테르담: 아돌프 M. Hakkert, 1964), pp. 75–78
- ^ 앤골드 1999, 547쪽.
- ^ Geanakoplos 1989, p. 173.
- ^ Bialor, Perry (2008). "Chapter 2, Greek Ethnic Survival Under Ottoman Domination". ScholarWorks@UMass Amherst: 73.
- ^ Meyendorff, John (2010). Byzantium and the Rise of Russia: A Study of Byzantino-Russian Relations in the Four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00. ISBN 978-0-521-13533-7.
The Empire of Nicaea, in particular, was seen as the Hellenikon, or as Hellas
- ^ Stavridou-Zafraka, Alkmeni (2015). "Byzantine Culture in Late Mediaeval Greek States". Βυζαντιακά. 32: 211.
- ^ Maltezou, Chryssa; Schreine, Peter (2002). Bisanzio, Venezia e il mondo franco-greco (in French). Istituto ellenico di studi bizantini e postbizantini di Venezia. p. 33. ISBN 978-960-7743-22-0.
Theodoros Laskaris totally avoids the terms Latinoi in his letters and uses Italoi instead, he also replaces the terms Romaioi (Romans) and Greek by Hellenes.
- ^ Doumanis, Nicholas (2009). A History of Greece. Macmilla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p. 140. ISBN 978-1-137-01367-5.[영구적 데드링크]
- ^ Hilsdale, Cecily J. (2014). Byzantine Art and Diplomacy in an Age of Decl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84. ISBN 978-1-107-72938-4.
- ^ a b 안젤로프, 디미터. 비잔티움의 제국주의 사상과 정치 사상 (1204–1330). 캠브리지: University Press, 2007. 95 페이지 칼델리스, Anthony 비잔티움의 헬레니즘 : 그리스 정체성의 변화와 고전적 전통의 수용. 캠브리지: University Press, 2007.
- ^ 안젤로프, 99-101쪽
- ^ 앤골드, 마이클. 비잔티움 망명정부: 니케아의 라스카리드 치하의 정부와 사회, 1204년-1261년. 런던: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1975년 13페이지
- ^ 안젤로프, 99쪽
- ^ a b 안젤로프, 100쪽
- ^ 앤골드, 마이클. "비잔틴의 민족주의와 니케아 제국." 비잔틴과 현대 그리스 연구, 1 (1975) 페이지 51–52.
- ^ 앤골드, 29쪽
- ^ 안젤로프, 97쪽
- ^ 안젤로프, 96-97쪽
- ^ A. E. Vacalopoulos, 그리스 국가의 기원: 비잔틴 시대 (1204–1461) (뉴 브런즈윅, 1970).
- ^ 비튼, 로데릭. 앤티크 네이션? 그리스 독립전야와 12세기 비잔티움의 '헬레네스', 비잔틴과 현대 그리스 연구, 31 (2007), 76–95쪽
- ^ 앤골드, 마이클(1975). "비잔틴 '민족주의'와 니케아 제국" (구독 필요) 비잔틴과 현대 그리스 연구, 1, 1페이지 70.
일반 및 인용 참조
- Angold, Michael (1999). "Byzantium in exile". In Abulafia, David (ed.). The New Cambridge Medieval History, Volume 5, c.1198–c.13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43–568. ISBN 978-1-13905573-4.
- Geanakoplos, Deno John (1989). Constantinople and the West: Essays on the Late Byzantine (Palaeologan) and Italian Renaissances and the Byzantine and Roman Churches.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ISBN 978-0-299-118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