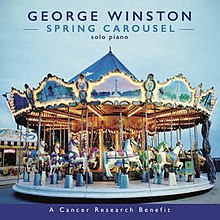회개
Contrition기독교에서 회개 또는 반론( 라틴어 콘트리트어 '땅에서 갈기갈기', 즉 죄의식에[1] 짓눌려 있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다. 뉘우치는 사람은 뉘우친다고 한다.
기독교의 많은 부분에서 중심 개념인 회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향한 첫 단계로 간주된다.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욕망,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에 대한 충분함에 대한 믿음(재생과 오르도 살루티스를 보라)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서 전반에 걸쳐 널리 언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에즈키엘 33:11, 시편 6:7ff, 시편 51:1–12, 루크 13:5, 루크 18:9–13, 방탕아들의 잘 알려진 비유(루크 15:11–32)이다.
가톨릭교회에서
자연
트렌트 위원회는 회개를 "향후 죄를 짓지 않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증오"라고 정의했다. 그것은 또한 애니미 크루시아투스(영혼의 고통)와 형식적인 코르디스로도 알려져 있다.
'분쟁'이란 말은 굳어진 무언가의 파탄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문장 달인에 대한 논평에서 그 독특한 용법을 설명한다: "사람이 죄에 대한 호감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그의 마음의 연속성과 견고함을 내포하고 있는 죄의 완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를 얻는 행위는 '쟁의'라는 말의 형상으로 불린다.[2] 영혼의 이 슬픔은 단지 잘못한 것에 대한 추측적인 슬픔, 양심의 가책, 혹은 수정하려는 결의가 아니라, 저질러진 죄에 대한 증오와 공포와 함께 영혼의 진정한 고통과 쓰라림이며, 죄에 대한 이러한 증오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진다. 회개의 본질을 말하는 초기 기독교 작가들은 때로는 슬픔의 감정을, 때로는 잘못한 자들을 혐오하는 감정을 주장하기도 한다. 어거스틴은 "Compredus corde nonlet dicichi nisci 자극 peccaterum in dolore pitnitendi"를 쓸 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2]
거의 모든 중세 신학자들은 회개가 주로 죄의 혐오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혐오감은 죄악의 극악함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고, 이 지식은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낳는다. "죄는 동의에 의해 저질러지므로, 이성적인 의지의 반대에 의해 소멸된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슬픔이다. 그러나 슬픔은 의지와 결과적 감정의 단절을 두 가지로 나타낸다.[2] 전자는 회개의 본질이고 후자는 그 효과다.
필요성
트렌트 평의회를 통해 발표된 교회의 공식 교리는 자신의 죄에 대한 사면을 얻기 위해 회개가 항상 필요했음을 선언한다. 회개하는 것이 사면을 위한 첫 번째 불가결한 조건이다. 자백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사면을 받을 수 있지만 뉘우치지 않고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3]
가톨릭 백과사전에 따르면 가톨릭 작가들은 항상 그러한 필요성이 (a) 회개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것은 물론 (b) 신의 긍정적인 명령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해 왔다. 회개의 본질에서 그들은 루크 13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문장이 최종이라고 지적한다: "회개하는 것을 제외한다" 등. 그리고 아버지들로부터는 사이프리안, 드 람시스, 32번 "전적으로 참회하라, 비통하고 비탄하는 영혼에서 오는 슬픔의 증거를 제시하라... 죄에 대한 회개를 버리는 자들은 만족의 문을 닫아라." 스콜라스틱 의사들은 "옛것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보나벤츄어, 인리브)는 만족 원칙을 정했다. 보냈어, 4번 구역이야 16세, Pt. II, art. 1, Q. q. alfo 전문직, ibid, Pt I, art. 나, Q.ii) 그리고 그 이유를 물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죄에 집착하는 절대적 부조리를 지적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적대적이다. 트렌트 위원회는 시대의 전통을 염두에 두고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 항상 논쟁이 필요했다"고 규정하였다(Sess. XlV. ch. iv de Convertitione) 신의 긍정적인 지령도 구내에 뚜렷하다. 침례교도는 메시아가 올 때에 대비하여,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외치고, 그 결과 `세례를 받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여라' 하고 외쳐댔다. 예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은 '참회하라, 하늘 나라가 임하였으니'라는 말로 서술되어 있고, 사도들은 백성을 대상으로 한 첫 설교에서 '참회하라, 죄를 씻은 세례를 받으라'(행 2:38)고 경고한다. 아버지들은 다음과 같이 권했다. (P.G, I, 341; Hermas III P.G, II, 894; P.L., II의 Tertullian).[4]
완벽하고 불완전한 회개
죄악에 대한 혐오감이 심히 상심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긴다면 회개라는 말은 '완벽한' 것이고, 천국을 잃거나, 지옥을 두려워하거나, 죄의 극악함과 같은 다른 동기에서 생긴다면 '불완전한 회개' 또는 소모라는 말은 '불완전한 회개'라고 한다.[5][6]
완벽한 회개
완벽한 회개(자선의 회개라고도 함)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부여되는 죄에 대한 회개다.[7]: 1452 그것은 보통 예절이나 지옥에 대한 공포와 같이 덜 순수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한 회개와는 대조된다.[7]: 1453 회개의 두 종류는 감정이나 감정의 강렬함보다는 회개의 동기에 의해 구별된다. 완벽하고 불완전한 회한이 동시에 경험되는 것은 가능하다.
완벽한 회개 속에서 그 동기는 단지 죄인이나 인류에 대한 신의 선함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선함에 기초한다. 완벽한 회개 행위를 했다면 절대 확실성을 가지고 알 길은 없지만, 필요한 것은 모든 인간 행동의 기준, 도덕적 확실성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참회하는 행동을 의도하며 말한다면, 사람은 도덕적 확신이 있을 것이다.[8]
완벽한 회개는 죄인이 참회의 성찬(화해의 성찬)에서 용서를 받기 전부터, 치명적인 죄악으로 인한 죄의식과 영원한 형벌을 없앤다. 정확하지 않지만 강하게 관련되는 '고백')은 가능한 한 빨리 성찬 고백에 의지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다.[9] 이러한 신학적 교훈의 예는 캐논 916의 캐논법칙에 나타나 있는데, "중대한 죄를 의식하는 사람은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는 한 이전의 성찬 고백 없이 미사를 기념하거나 주의 몸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그 사람은 기억하게 된다.하루빨리 자백의 결심이 담긴 완벽한 회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10]
성체 고백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임박한 죽음의 경우, 사람이 살아남으면 하루라도 빨리 성체 고백으로 가겠다는 굳은 결심도 치명적인 죄악으로 인한 죄의식과 영원한 형벌을 제거한다.[9]
불완전한 회개
| 위키소스는 1911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기사 "소모"의 원문을 가지고 있다. |
시편 111장 10절에 따르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이다." 필립스 2장 12절에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실천하라고 권한다. 완벽한 회개와는 대조적으로 불완전한 회개(일명 소모)는 하나님의 사랑 이외의 이유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욕망이다.[7]: 1492 소모는 명분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소모는 가톨릭 화해 성찬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 영혼을 버린다.[7]: 1453
트렌트 평의회 (1545–1563)는 불완전한 회개가 "죄의 참혹함에 대한 고려 또는 지옥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이유들에 의해 동기부여되지만, 그것은 또한 신이 내린 선물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소모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참되고 유익한 슬픔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을 은총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악인은 위선자요, 예, 더 큰 죄인이라도 아나테마가 되게 하라."[5]
그 질문은 또한 죽음의 죄에서 성찬을 받을 때 소모되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 그가 알지 못하는 죄는 그 성찬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 대답은 대체로 긍정적이다.[5]
소모에 대한 문자적 지원은 속담 13:13, 속담 14:26–27, 속담 19:23, 마태복음 10:28, 필리피안 2:12에서 찾을 수 있다.
불완전한 회개에 대한 비판
필립 멜랑숑은 1537년 아우크스부르크 고백의 사과에서 참회하는 사람을 불확실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불완전한 회개의 개념에 반대했다.[11]
그러나 언제, 특히 시편과 예언자들에게 묘사되어 있는 진지하고 진실하며 위대한 공포 속에서, 그리고 진정으로 개종된 자들은 확실히 어떤 맛을 느낄 것인가, 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서 도망치는 것인지, 언제 두려운 양심이 결정될 수 있을까?
마틴 루터는 1537년 스말칼드 조항에서 가톨릭의 불완전한 회개 교리를 공격하면서 "그런 회개는 확실히 단순한 위선에 불과하고, 죄에 대한 욕망을 박멸하지 않았다. 그들은 슬퍼해야 하는 반면, 만약 그것이 그들에게 자유롭다면, 죄를 계속 지은 것이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회개하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매너 고백처럼 역시 거짓, 불확실, 단편적인 것일 수 없다"[12]고 주장했다.
자질
가톨릭 전통에 따라 완벽하든 불완전하든 반성은 내부, 초자연적, 보편적, 주권적이어야 한다.[5]
실내
회개란 반드시 참되고 진실한 마음의 슬픔이어야 한다.[2]
초자연적
가톨릭 교리에 따라 신의 은총에 의해 회개되어야 하고, 신의 은총에 의해 자극되어야 하며, 신의 은총에서 우러나오는 동기에 의해 자극되어야 한다. 단지 명예, 재산, 그와 같은 동기의 상실과 같은 자연적인 동기에 반대한다. 회유하다. 트리드, 2부 드 푸에닛). 구약성서에서 '새로운 마음'을 주고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다(에체코 36:25–29).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위해 시편수는 미세레(ps. 51, 11평방)에서 기도한다. 베드로가 오순절 후 처음 설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키웠다고 말하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회개를 주신다면"이라며 진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할 것을 주장한다. 펠라지안 이단 아우구스티누스 시절에는 회개의 초자연성을 주장했는데, 그가 글을 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고, 이것이 나쁜 의지인데,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할 수 없으며, 이것이 선한 의지"라고 썼다. 일부 스콜라스틱 의사들, 특히 스코투스, 카제탄, 그리고 그 뒤에 수아레스(De Poenit, Disp)가 있다. iii, vi)는 인간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참된 회개의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추측적으로 물었지만, 신의 현재 경제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만드는 것은 단지 자연적인 동기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신학자는 없었다. 오히려 모든 의사들이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절대적 필요성(보나벤츄어, 인리브)을 주장해 왔다. 보냈어, 4번 구역이야 시브, 1부, 예술 II, Q. III, 또한 dist. 16세, 1부, 예술. I, Q. 3; cf. 토마스, 인리브. 발송. IV). 이 성경과 의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트렌트 공의회는 "성령의 영감 없이는, 그리고 그의 도움 없이, 사람은 명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회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를 저주하게 하라"고 정의했다.
유니버설
진정한 회개란 적어도 모든 사악한 죄악에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단지 선별된 편의상 몇 가지 죄악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3] 이 교리는 은혜와 회개에 관한 가톨릭 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혼의 슬픔이 없는 용서는 없고, 용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며, 은혜는 죄와 공존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회개가 없는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예언자 요엘은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권하고(조엘 2:12–19). 그리스도는 율법학 박사에게 우리가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루케 10:27). 이즈키엘은 사람이 살려면 "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에즈키엘 33:11).
스콜라스틱스는 심각한 모든 죄에 대해 특별한 회개 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순간 모든 중대한 위반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이 질문을 했다. 두 질문 모두에 대해 그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암묵적으로 포함하는 슬픔의 행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소버린
[마르크 8:35–37]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하셨다.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생명을 구할 것이다. 그들이 온 세상을 얻어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과연 그들이 목숨을 바치는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죄에 대한 회개가 일시적 우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황후 유덕시아의 사신들이 존 크리소스톰을 위협하자, 그는 "가서 공주에게 크리소스톰이 오직 한 가지만 두려워하고, 그것은 죄라고 말하라"[3]고 응수했다.
참회의 성찬
회개하는 것은 도덕적인 미덕일 뿐만 아니라 트렌트 평의회는 페넌스의 성찬에서 그것이 "부분"이며, 더 나아가 준정교라고 정의했다. "이 성찬의 (준) 문제는 참회자 자신의 행위, 즉 회개, 고백, 만족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성찬의 성실함과 죄의 완전하고 완벽한 해방을 위해 참회하는 하나님의 제도에 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회의 일부라 불리는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트렌트 신학자들의 이 포고령으로 인해 죄에 대한 슬픔은 어떤 의미에서 신성불가침이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라 크룩스는 슬픔은 고백으로 가는 관점으로 자극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을 묻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쉬엘러-허저(고백의 이론과 실천, 페이지 113)와 함께 고해와 함께 어떤 식으로든 슬픔이 공존하고 참고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로마 의례의 교훈 "고백자가 고백을 들은 후에는 참회하는 사람을 회개하도록 간곡히 권해야 한다"(Schieler-Heuser, op. op., p. 111 sq.). 회개가 이 성찬의 효과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카테치즘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개종과 참회를 부르시기를 먼저 외향적인 일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 내향적 전환(1430년)을 목표로 하신다. 내면의 회개는 우리 전생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 귀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개종하는 것, 죄의 끝, 악으로부터 돌아서려는 것, …하나님의 자비 속에 희망과 그의 은총의 도움에 대한 신뢰로 삶을 바꾸려는 욕망과 결심(1431년)이다.
치명적인 죄악이 있는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화해의 성찬의 사용이 뒤따라야 한다.[13]
참회의 성찬이 없는 완벽한 회개
트렌트 위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기로 하는 회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회회는 더 나아가 회개가 자선단체에 의해 완벽해질 수 있고 이 성찬을 실제로 받기 전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해를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화해가 d와 별도로 회개에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성찬이 포함된 성찬식에 찬성한다." 바이우스에게서 빼앗긴 다음 명제(32호)는 그레고리 9세에 의해 비난받았다.III: "법의 충만함인 그 자선행위가 항상 죄의 용서와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완벽한 회개, 페넌스의 성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죄인을 단번에 은혜로 회복시킨다. 이것은 확실히 스콜라스틱 의사들의 가르침이다(P.L.의 피터 롬바르드, CXCII, 885; St. 토마스, 인리브. 보냈어 IV, 이비드; 성 보나벤투르, 인리브. 보내졌다. IV, ibid.) 이 교리는 성서에서 유래한 것이다. 성경은 확실히 자선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빼앗는 힘을 얻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다.";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가 용서된다." (루크 7:36-50)
완벽한 회개 행위는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자선단체에 속하는 완전한 회개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또한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구약성서에는 인간이 일단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이 아니라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아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에체코 33:11). 이 총체적인 신으로의 전환은 완벽한 회개라는 우리의 생각과 일치한다; 그리고 만약 구법 하에서 사랑이 죄인의 사면을 충분히 수용한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와 참회 성찬의 제도가 용서를 구하는 어려움을 증가시켰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전의 아버지들이 죄의 완화에 대한 슬픔의 효능을 가르쳤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P.G., I. 341 평방, 그리고 P.G., II. 894 평방 평방, Hermas in P.G., I., 341 평방, 그리고 P.G. P.G., XLIX, 285 평방)의 크리소스톰과 이 점은 특히 루크, VII, 47에 대한 모든 논평에서 두드러진다.
베데 스님의 글 (P.L, XCII, 425) : "사랑은 불과 같고, 죄는 녹슬기만 한 것인가? 그러므로 많은 죄가 용서받는다고 한다. 사랑으로 불타서 죄의 녹을 모두 태웠기 때문이다.' 신학자들은 페넌스의 성찬과 합당한 사랑의 종류에 대해 많은 배움을 가지고 문의해 왔다. 순수한 혹은 무관심한 사랑(아마도 자비로운 사랑, 아모르 아미티센티움)이면 충분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 흥미롭거나 이기적인 문제가 있을 때, 신학자들은 순수하게 이기적인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완벽한 사랑에 대한 공식적인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완벽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의 위대한 선함만을 위해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의 주장을 성경에 근거를 두고 감사의 사랑(혹은 무료함)이 꽤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애와 인간에 대한 사랑은 신성한 사랑(Hurter, Thole)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Dog, Statement ccxlv, Scholion III, no. 3; Schieler-Heuser, op. cit., pp. 77 sq.)
회개행위의 도출의무
사물의 본질적으로 죄인은 신과 화해하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Sess. XIV, ch. iv, de Convertitione, Fuit Quovis tempore 등). 그러므로 누구든지 중죄에 빠지는 사람은 완벽한 회개행위를 하거나 페난스의 성찬을 받아 불완전한 회개행위를 보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과의 화해가 불가능하다. 이 의무는 죽음의 위험이 있을 때 죄악의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 그러므로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성찬을 행할 신부가 가까이 있지 않다면 죄인은 반드시 완전한 회개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은혜가 필요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때, 그리고 참회의 성찬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완벽한 회개의 의무는 또한 시급하다. 신학자들은 완벽한 회개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방치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연장되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을 구성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Schieler-Hauser, op. op., 페이지 83평방 평방). 아마도 세인트루이스의 규칙일 것이다. 알폰수스 리구오리는 '사랑의 행위를 할 의무가 있을 때 회개하는 행위가 시급하다'(사베티, 신랄로시아 모랄리스:데필요하다)는 해법을 돕는다. 회개, 제731호; 발레린, 오푸스 사기: 회개.
다른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섹션은 다음을 통해 확장해야 한다. 이 기사는 회개에 관한 비 가톨릭적 사고를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동방 정교회, 개신교, LDS 등에 관한 절이 작성되어야 한다. 덧셈으로 도와줘도 된다(2016년 5월) |
루터교회의 일차 신앙고백인 아우크스부르크 고백은 회개를 두 갈래로 나누는데, "한 가지는 회개, 즉 죄악의 지식으로 양심을 매료시키는 것, 다른 하나는 복음서나 용서를 위해 태어난 믿음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죄는 용서되고, 양심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ce, 그리고 그것을 공포로부터 전달하라."[14]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후커는 회개를 "다른 어떤 것도, 즉 그 죄악과 비방을 보고 죄악이 분별력 있게 되어, 죄악이 미워되도록 만들어지고, 마음이 그와 분리되어 있을 때"[15]라고 정의했다.
영국 가톨릭 성당 감독관 필라델피아에 있는 마크의 교회인 알프레드 가넷 모티머는 "감정"이 회한의 적절한 척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참된 회한의 징후는 고백할 태세, 자신의 삶을 수정하고 유혹을 피할 태세, 남을 용서할 태세 등이다.[16]
참고 항목
각주
- ^ "contriteness". The Free Dictionary. October 2016.
- ^ a b c d Hanna, Edward Joseph (1913). . In Herbermann, Charles (ed.). Catholic Encyclopedia. New York: Robert Appleton Company.
- ^ a b c Luche, abbé (1898). The Catechism of Rodez Explained in Form of Sermons: A Work Equally Useful to the Clergy, Religious Communities, and Faithful. B. Herder. p. 527.
Contrition, necessity of.
- ^ Hanna, Edward (1908), "Contrition",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4, Retrieved from New Advent, New York: Robert Appleton Company
- ^ a b c d Hanna, Edward Joseph (1913). . In Herbermann, Charles (ed.). Catholic Encyclopedia. New York: Robert Appleton Company.
- ^ Chisholm, Hugh, ed. (1911). . Encyclopædia Britannica. Vol. 2 (11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887.
- ^ a b c d Catholic Church (2012).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 ed.). Vatican City: Libreria Editrice Vaticana.
- ^ Donovan, STL, Colin B. "Perfect Contrition". EWTN. Retrieved 27 October 2014.
- ^ a b "Penance And Reconciliation".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ission. Retrieved 27 October 2014.
- ^ Code of Canon Law (1984 ed.). Canon 916.
{{cite book}}: CS1 maint : 위치(링크) - ^ 아우크스부르크 고백의 사과, 제II조 (V): 회개에 대한.
- ^ 스말칼드 조항, 제3부, 제3조 회개의,
- ^ "Joseph Martos on The History of Penance and Reconciliation".
- ^ "Augsburg Confession - Book of Concord". www.bookofconcord.org. Retrieved 2019-06-04.
- ^ Hooker, Thomas (1638). The soules preparation for Christ: a treatise of contrition [by T. Hooker]. Nickoles.
- ^ Mortimer, Alfred Garnett (1897). Catholic Faith and Practice: A manual of theological instruction for confirmation and first communion. Longmans, Green, and Company.
참조
 이 글에는 현재 공개 도메인에 있는 출판물의 텍스트가 통합되어 있다.
이 글에는 현재 공개 도메인에 있는 출판물의 텍스트가 통합되어 있다.- 실베스터 조셉 헌터, 독단신학의 개요 (뉴욕, 1896년)
- 수아레스, 드 피니텐티아, 디스패치. iv, sep. iii, a,2
- 벨라르민, 데코비시니스, 제2권, 데 사크라멘토 n니텐티 æ
- 데니플, 루터 und 루터툼 데르스텐 엔트윅룽(Mainz, 1906), I, 229 sq, II, 454, 517, 618 sq.
- 콜릿 인 미그, 테롤로시 퍼서스 컴퍼스(Paris, 1840), XXII
- 팔미에리, 드 피니텐티아(롬, 1879; 프라토, 1896년)
- Petavius, Dogmata Therologica: de pænitentia (Paris, 1867년)
외부 링크
| Wikiquote는 다음과 관련된 인용구를 가지고 있다: 컨센트레이션 |
| 무료 사전인 Wiktionary에서 회개를 찾아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