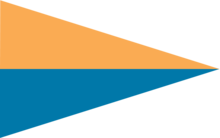이슈투표
Issue voting| 정치 시리즈의 일부 |
| 투표 |
|---|
| |
이슈 투표라는 용어는 유권자들이 정치적 이슈에 근거하여 선거에서 투표할 때를 묘사한다.[1][2] 선거의 맥락에서, 이슈는 "그동안 또는 논란의 문제였고 정당들간의 의견 불일치의 원인이었던 공공 정책의 모든 질문"[3]을 포함한다. 이슈투표론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기 위해 후보들의 각 원칙과 자신의 원칙을 비교한다.[4][5]
원인들
유권자는 모든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모든 이슈에 대한 후보자가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어느 후보에게 가장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6][7] 유권자들은 특정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합리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전술을 사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특정한 문제가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지 예측한다.[8]
이슈 투표는 종종 정당 투표와 대조된다. 2010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 이슈 투표와 정당 투표 사이를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선거와 같은 저정보 선거는 정당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대통령 선거는 이슈 주도형일 가능성이 있다.[10]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제휴할 정당을 선택한다.[11] 유권자는 정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상의하지 않고 사안의 의견을 만든 다음, 이미 갖고 있는 의견에 가장 잘 맞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가 다른 정당의 의견을 조사해서 어느 정당에 가장 동의하는지 결정하게 된다.[12][13][14]
정당의 원칙에 대한 유권자의 이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정치적 사건들로 경험을 쌓게 되면서 강화되고 발전된다.[15] 어떤 이슈가 정당 선택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먼저 특정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16]
한 사람이 이슈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이슈에 대해 둘 이상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형성하고 그것을 특정 정당과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한다.[17] 캠벨에 따르면, 오직 40-60%의 정보 제공 인구만이 당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당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18] 이는 개인이 정당의 도움 없이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발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슈투표이력
1944년 '피플스 초이스' 연구 이전에, 정치학자들에 의해 투표는 단지 이슈에 근거한 것이라고 추정되었다.[19] 그러나, 이 연구는 194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 투표에 대한 증거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연구자들은 이슈가 정당 충성도를 강화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서 비롯된 연구는 유권자들의 동기가 정당 식별, 후보 지향, 그리고 이슈 오리엔테이션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1960년 미국 유권자는 정당 식별이 일차적인 힘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결국 다른 두 가지 범주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 세 가지 요인은 투표 행동을 모델링하는 미시건 학교의 접근 방식을 구성한다.[20]
1960년에 행해진 이슈 투표에 대한 초기 연구들 중 일부는 유권자들이 특정 이슈를 개별 후보들과 연결시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21] 컨버스, 1964년 또한 유권자들이 그것들을 후보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교한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22] 1966년, Key는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들에게 이슈를 연결시키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최초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23]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정치학 리뷰는 1960년대에 이슈투표가 증가했다는 가설을 세운 심포지엄을 발간했다. 니와 앤더슨은 1974년 미시간 학파의 정치 신념 체계 고유의 한계 이론을 수정하려고 시도한 이슈 지향성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발표했다.[24] 1979년 <변화하는 미국 유권자>의 니에 등은 모두 정당 투표의 하락을 통해 이슈 투표의 상승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25] 그들은 정당투표의 이러한 감소는 정당 소속이 없는 유권자의 비율이 떨어졌고,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슈투표 상승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이슈투표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세기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6][27] 이 두 정당 모두 쟁점 관점이 더욱 극단적이 되었다. 이것은 온건파를 그들의 정당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28] 미국 유권자의 상당 부분이 온건파이기 때문에, 인디펜던트로 제휴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29] 무소속이라는 것은 유권자들이 양극화된 정당의 제약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무소속 유권자는 정당보다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따라 후보를 직접 고를 수 있다.[30]
가톨릭 신자들은 "이슈투표 vs 정당투표" 딜레마에 직면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공화당이 지지하는 친생적 입장을 지지하지만, 공화당이 지지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극심한 당 양극화는 가톨릭 유권자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모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31][32]
노조원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민주당에 강하게 동의하지만, 노조도 동성애자 권리를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공화당의 견해와 더 밀접하게 일치하는 입장이다.[33]
이슈 투표 관련 합병증
많은 요소들이 이슈 투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첫째, 이슈가 항상 이분법적인 것은 아니다; 종종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많은 입장이 있다.[34][35] 유권자들은 종종 자신의 지위가 가장 가까운 후보자에게 만족해야 한다.[36][37] 이는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비슷한 의견을 가질 때, 또는 후보가 똑같이 유권자와 거리가 먼 입장을 가질 때 어려워질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이슈의 한 예는 교육비 지출이다. 유권자는 학교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이용 가능한 후보들과 극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이 정당에 기반한 투표를 하도록 이끌 수 있다.[38]
두 번째 복잡성은 종종 문제가 선형 기초 위에 정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어떤 문제들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후보를 결정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39][40] 예를 들어,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동반구에서 증가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위협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41]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지출과 혁신을 통한 군사적 위협을 지지했고, 지미 카터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제안했고, 무소속 존 앤더슨은 봉쇄 전략으로의 복귀를 지지했다.[42][43][44] 이 답들 중 어느 것도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선형으로 구성될 수 없다. 대신 유권자는 가능한 해결책을 가장 가깝게 혼합한 의견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슈 투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세 번째 문제는 유권자에게 똑같이 중요한 이슈들이 여러 개일 경우다.[45] 후보자는 한 사안에 대해 주어진 유권자와 유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46][47] 그 한 예가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났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관심을 끄는 두 가지 이슈는 경제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슈들이 동등하게 두드러진 것으로 보았고, 투표할 이슈 하나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슈 투표에서 이 세 가지 복잡성은 후보 선출을 위해 이 전술을 사용하는 데 문제를 제공했다.
네 번째 문제는 유권자들이 세련되지 못하고 이슈를 바탕으로 투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학자 래리 바텔스는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지식이 없으며 그들의 실제 투표 선택은 충분한 정보를 가진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표 선택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유권자들에게 이슈화 될 수는 없다고 결론짓는다.[48]
이슈 투표 모델
학자들은 투표 습관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모델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슈 투표의 통계적 연구에는 세 가지 주요 모델이 사용된다: 선형 위치 모델, 공간 모델, 그리고 편의 모델이다. 각 모델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여 투표권을 발행한다.
- 선형입장모형은 개인이 선거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투표권을 행사할지 예측하려고 시도한다. 이 모델은 특정 사안에 대해 유권자와 후보가 더 많이 합의할수록 후보자가 개인의 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49][50] 이 모델에서는 정당에 투표하는 인원수와 이슈 포지션의 일관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사용한다.[51][52] "Y = a + bX"라는 방정식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a" 변수는 당에 투표하는 최소한의 인원수를 나타내며, "b"는 긍정적인 구배가 있음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 "X"는 당의 이슈 포지션의 일관성을 나타내며, "Y"는 당에 투표하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53][54]
- 스페이스 모델은 이슈 투표 전략이 선거에서 사용될 때 유권자들의 인식과 결정을 보여주려고 한다.[55] 이 모델은 누군가의 이슈 선호가 모든 가능한 후보의 정책 입장과 함께 가상의 공간 분야에 배치되면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지위에 가장 가까운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으로 가정한다.[56][57] '밀착성'이라는 생각을 따르는 다른 모델들은 근접모델이라고 불린다.[58]
- Selience Model은 미국의 양대 정당이 어떤 문제에 관한 특정한 목표나 견해와 연관되어 있으며,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의 결정은 그 사안의 실제적인 만족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59][60] 이 모델은 선거 의제 데이터를 활용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이슈 투표를 고려할 때 중요하다.[61][62] 이 모형에 대한 간단한 보기는 다음 방정식을 사용하여 요약할 수 있다.
- 투표=a(당 이슈의 선처)+b(당 이슈의 선처)
여기서 "a"=1당, "b"=2당. 사안이 중요해질수록 유권자는 이 사안에 대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선호한다.[63][64]
참고 항목
메모들
- ^ 덴버로19번길
- ^ 니콜슨, 11세
- ^ 덴버로20번길
- ^ 덴버로21번길
- ^ 캠벨로98번길
- ^ 덴버로21번길
- ^ 니콜슨로132번길
- ^ 덴버로20번길
- ^ 하이튼로455-458번길
- ^ 에넬로217-219번길
- ^ 덴버로20번길
- ^ 덴버로21번길
- ^ 캠벨, 79, 98
- ^ 카르미네스로78번길
- ^ 덴버,21-23
- ^ 무어로245번길
- ^ 무어로246번길
- ^ 캠벨로104번길
- ^ 보레, 1, 2, 22
- ^ 돈스바흐, "투표권 발행"
- ^ 캠벨로109번길
- ^ 컨버스, 78-91
- ^ 니콜슨, 11세
- ^ 니에 (1974년) 541-591
- ^ 니에4773번길
- ^ 맥카티 외, 2
- ^ 니에로172번길
- ^ 맥카티 외, 2
- ^ 맥카티 외, 2
- ^ 카민스와 스팀슨, 78-91
- ^ 맥카티 외, 2
- ^ 니에로172번길
- ^ 프랭크, 25세
- ^ 니에로158번길
- ^ 케셀로460번길
- ^ 니에로158번길
- ^ 케셀로461번길
- ^ 카민스와 스팀슨, 78-91
- ^ 니에로158번길
- ^ 카민스와 스팀슨, 78-91
- ^ 슈바이저, 213년
- ^ 슈바이저, 213년
- ^ 커켄달
- ^ 비스노우로24번길
- ^ 니에로158번길
- ^ 니에로158번길
- ^ 카민스와 스팀슨, 78-91
- ^ Bartels, Larry M. (2008-11-03). "How smart is the American voter?". LA Times. Retrieved 26 July 2014.
- ^ 보레로19번길
- ^ 마이어와 캠벨, 26-43
- ^ 보레로19번길
- ^ 마이어와 캠벨, 26-43
- ^ 보레로20번길
- ^ 데이비스 외, 426-429
- ^ 조씨로275번길
- ^ 라비노위츠로94번길
- ^ 맥컬로199-22
- ^ 라비노위츠, 93, 96
- ^ 보레로6번길
- ^ 캠벨로93번길
- ^ 보레로6번길
- ^ 니에미로1212번길
- ^ 보레로6번길
- ^ 데이비스 외, 426년
참조
- 비스노우, 마크. 다크호스의 일기: 1980년 앤더슨 대통령 캠페인. 카본데일: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3) 24.
- 보레, 올레. 이슈 투표 : 소개. Aarhus; Oakville, CT: Aarhus University Press. ISBN 87-7288-913-6 (2001)
- 캠벨, 앤거스 The American Poters: An Abridgement. 1964, New York: Wiley, ISBN 9780471133353
- Carmines, Edward G.; Stimson, James A. (March 1980). "The two faces of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 (1): 78–91. doi:10.2307/1955648. JSTOR 1955648.
- Cho, Sungdai; Endersby, James W. (March 2003). "Issues, the spatial theory of voting, and British general elections: a comparison of proximity and directional models". Public Choice. 114 (3): 275–293. doi:10.1023/A:1022616323373. JSTOR 30025956. S2CID 152635457.
- Converse, Philip E. (January 2006).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1964)". Critical Review. 18 (1–3): 1–74. doi:10.1080/08913810608443650. S2CID 140857433.
- Denver, David; Hands, Gordon (March 1990). "Issues, principles or ideology? How young voters decide". Electoral Studies. 9 (1): 19–36. doi:10.1016/0261-3794(90)90039-B.
- 돈스바흐, 볼프강. 국제 커뮤니케이션 백과사전. ISBN 9781405131995. 2008.
- 에넬로, 제임스 M. & 멜빈 J. 히니치. 투표의 공간 이론: 소개. 캠브리지, 캠브리지주: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 1984.
- Frank, Miriam (Spring–Summer 2001). "Hard hats & homophobia: lesbians in the building trades". New Labor Forum. Sage via JSTOR. 8 (8): 25–36. JSTOR 40342289.
- Highton, Benjamin (January 2010). "The contextual causes of issue and party voting in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s". Political Behavior. 32 (4): 453–471. doi:10.1007/s11109-009-9104-2.
- Kessel, John H. (June 1972). "Comment: the issues in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 (2): 459–465. doi:10.2307/1957789. JSTOR 1957789.
- 커켄달, 리처드 S. "카터, 지미. 대통령: 참고 역사. 2002. Encyclopedia.com. 2012년 4월 14일.
- 맥카티, 놀런, 키스 T.풀, 하워드 로젠탈. 양극화된 미국: 이데올로기와 불평등한 재물의 춤. MIT, 2006. MIT 프레스. ISBN 0-262-13464-0
- McCullough, B. Claire (Summer 1978). "Effects of variables using panel data: a review of techniques". Public Opinion Quarterly. 42 (2): 199–220. doi:10.1086/268443.
- Meier, Kenneth J.; Campbell, James E. (January 1979). "Issue voting: an empirical evaluation of individually necessary and jointly sufficient conditions". American Politics Research. 7 (21): 26–43. doi:10.1177/1532673X7900700102. S2CID 154949765.
- 무어, 존 레오. 1999년 선거 A-Z., 워싱턴 D.C.: 분기별 의회, ISBN 1-56802-207-7
- 니콜슨, 스티븐 P(2005) 의제에 투표하다. NJ 프린스턴, ISBN 978-0-691-11684-6
- Nie, Norman H.; Andersen, Kristi (August 1974). "Mass belief systems revisited: political change and attitude structure". Journal of Politics. 36 (3): 540–591. doi:10.2307/2129245. JSTOR 2129245. S2CID 154743674. PDF.
- Nie, Norman H, Sidney Verba, John R. 페트로치크. (1999년) 변화하는 미국 유권자. Bridgewater, NJ: Replica, ISBN 0735101876
- Niemi, Richard G.; Bartels, Larry M. (November 1985). "New measures of issue salience: an evaluation". Journal of Politics. 47 (4): 1212–1220. doi:10.2307/2130815. JSTOR 2130815. S2CID 143631621.
- Ordeshook, Peter C.; Davis, Otto A.; Hinich, Melvin J. (June 1970). "An expository development of a mathematical model of the elector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2): 426–448. doi:10.2307/1953842. JSTOR 1953842.
- Rabinowitz, George; Macdonald, Stuart Elaine (March 1989). "A directional theory of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1): 93–121. doi:10.2307/1956436. JSTOR 1956436.
- Rabinowitz, George; Jacoby, William; Prothro, James W. (February 1982). "Salience as a factor in the impact of issues on candidate evaluation". Journal of Politics. 44 (1): 41–63. doi:10.2307/2130283. JSTOR 2130283. S2CID 144293995.
- 슈바이저, 피터(1994) 승리: 소련 붕괴를 재촉한 레이건 행정부의 비밀 전략. 애틀랜타 월간 신문, (1994) 213. ISBN 978087113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