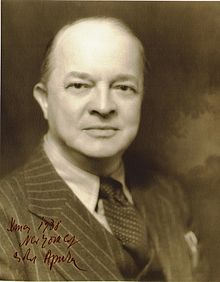크로마슈
Chromesthesia색각 또는 소리 대 색각 공감각은 소리가 무의식적으로 색, 모양, 움직임의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공감각의 일종이다.[1][2] 음색 공감각을 가진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공감각적 색채 연관성/통념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3] 음악을 들으면서 색을 인식하는 공감각체들은 일반적인 청각감각 외에 색을 경험한다. 공감각적 색채 체험은 보완하지만 실제의 양식별 인식을 모호하게 하지는 않는다.[3] 다른 형태의 공감각과 마찬가지로, 음색 공감각을 가진 개인들도 그것을 노력 없이, 그리고 그들의 정상적인 경험 영역으로 인식한다.[3] 색각은 음악, 음성, 음성, 음성 및/또는 일상적인 소리와 같은 다른 청각 경험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1]
개별 분산
어떤 색이 어떤 소리, 음색, 음색, 음색, 음색에 연관되어 있는지는 매우 특이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된다.[2][4] 공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독특한 색깔 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된 연구들은 공감각자와 비 공감각자가 똑같이 높은 음조의 소리를 더 가볍고 밝은 색으로, 낮은 음조의 소리를 어두운 색으로 연관시켜,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정상적인 성인의 뇌에서 그러한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하고 있다.[5] 사이비 색각의 형태는 공감대가 어린 시절부터 만들고 잊어버린 것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6]
다른 유형의 공감각과 마찬가지로 음색 공감각도 색상이 경험되는 방식에 따라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 공간에서 색을 '보거나' 인지하는 것을 프로젝터라고 하며, 마음의 눈의 색을 지각하는 것을 흔히 연상기라고 부르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오도될 수 있다.[2][3] 대부분의 공감각자들에게, 그 상태는 완전히 감각/지각이 아니다.[3]
일부 개인에게 있어서, 색각은 오직 음성 소리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반면, 다른 개인들의 색각은 어떤 청각 자극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7] 공감각의 범주 내에서의 가변성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구어에 대한 색마각을 가진 피험자의 40%는 음성 피치, 억양, 운율 등이 공감각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반면, 말하는 양이나 속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피실험자는 거의 없었다.[8] 이들 주제 내에서는 화자의 정서적 변형이 공감각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많았지만, 그들만의 분위기가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2명에 불과했다.[8] 이 연구에서 음악에 대한 공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된 참가자 중 75%는 연주되는 음을 들을 때 전적으로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8] 동시대의 경험이 자발적으로 통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여자의 33%만이 큰 노력 없이 동시대를 질식시키거나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냈다.[8] 유도 자극에 대한 관심은 참가자의 59%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그 밖에 집중력, 피로, 수면 습관, 발열, 감정, 카페인이나 알코올과 같은 물질 등이 기여 요인이었다.[8]
소리와 색상이 양방향으로 활성화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소리-색채 공감각은 색채-음향 공감각보다 훨씬 일반적이다. JR이라는 한 사람은 소리를 들을 때 색깔을 보고 색을 볼 때 소리를 듣는다.[7] 이런 종류의 공감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 이 개인의 연관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일관성이 높았지만, 그 연관성이 반드시 어느 방향에서나 동일하지는 않았다.[7] 또 다른 개인인 D는 크로마슈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피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절대 피치가 그녀의 크로마슈보다 덜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9]
음색 공감각을 가진 일부 개인에게 의미적 조정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주제인 MH는 신디사이저에 스스로 트리거된 노트를 만들고 색상 연관성에 주목했다. 신디사이저가 자신도 모르게 전치되었을 때, 그녀는 음조의 절대적인 음조가 아니라, 그녀가 듣고 있다고 믿었던 음에 동일한 색상의 연관성을 보고했다.[4]
역사
공감각의 역사: 공감각 연구의 역사
공감각과 색각이라는 용어는 역사를 통해 상당히 발전하고 진화했다. 최초의 문서화된 공감대는 1812년 게오르크 토비아스 루트비히 삭스였다.[10] 경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알비니즘에 관한 의학 논문(라틴어로 작성)에서 애매한 사상을 언급하고, 어떻게 색채가 있는 사상이 자신에게 나타나는지 서술했다. [11] 그러나 삭스보다 더 일찍, 요한 고트프리드 헤르더는 1772년 그의 <언어의 기원에 관한 논문>에서 비슷한 생각을 논했다.[10] 그는 "갑자기 발작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이 색깔과 연관되는지"에 대해 말했다.[12]
색각과 관련된 최초의 구체적인 용어는 1848년 찰스 오귀스트 에두아르 코르나즈가 눈병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색맹은 크로마토디옵시아라고 알려진 흔한 질환이었고, 코르나즈가 색마각을 그 반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너무 많은 색에 대한 지각이나 고색마토피아라고 이름지었다.[10]
1881년, 유겐 블룰러와 칼 베른하르트 레만은 그들이 이차적 감각 또는 이차적 상상이라고 부르는 6가지 다른 유형을 처음으로 확립했다.[10] 첫 번째는 가장 흔했던 것이 음향 사진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청각을 통해 도출되는 빛, 색, 형태감각"이라고 묘사했다.[13] 그들의 책은 오스트리아의 한 신문에 의해 검토되었는데, 그 신문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흔히 크로마취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색채 청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10]
미국의 공감각증에 대한 연구는 1892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1895년 이후 마침내 그 용어는 순수한 소리-색채 경험(색각)에서 그래핀-색채 공감각, 미러-터치 공감각, 어휘-혐오 공감각 등 광범위한 현상으로 확대되었다.[10] 1920년과 1940년 사이에 행동주의가 대두되면서 "학문된 연상 이상"으로 비쳐져 공감각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저하되었다.[1][14] 이 주제에 관한 과학 논문의 수는 1980년 경에 반등했고, 21세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이 논문은 경험적으로 연구하고 작업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14]
메커니즘
공감각은 뇌가 가장 플라스틱인 유아기에 확립된다. 유전적 성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유형은 환경과 학습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때문에 "개인마다 다른데 절대 무작위가 아니다"[1]는 이유를 설명한다. 더욱이 그것은 동적, 자동조립 및 자가교정인 분산형 시스템, 즉 신경망에서 지배적인 과정으로 나타난다.[1]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해되고 있는 것이지만, 공감대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아직 일반적인 합의는 도달하지 못했다. 두 가지 주요 가설이 있다: 교차 활성 이론과 금지되지 않은 피드백 모델이다.[15]
교차활성화 이론
공감각의 교차 활성화 이론은 V.S. 라마찬드란과 E.M.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Hubard는 실제와 공감각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감각 영역이 이웃 뇌 영역인 경향이 있다는 공감각 연구들의 증거를 수렴하는 것에 기초한다.[16] 이것은 색 처리와 시각적 워드 형태 처리를 위한 두뇌 영역이 인접하기 때문에 그래핀-색채 공감각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17] 색마각을 가진 개인은 청각적 지각 직후 V4와 같이 시각적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화를 보여주며 소리와 색상의 자동 연계를 나타낸다.[16]
신생아는 서로 다른 뇌 영역 간의 연결을 증가시켰지만, 이러한 초연결은 발달하는 동안 감소한다.[1] 이러한 교차 활성화의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 가설은 인접한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이 증가된 것은 유년기에 뉴런 네트워크의 가지치기 감소에 기인한다는 것이다.[16] 또 다른 가설은 뉴런의 비정상적인 분기가 더 많은 시냅스 연결과 교차 활성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모든 신생아가 공감각자임을 명기하는 다프네 모레의 신생아 가설과 일치하지만, 그 상태는 3개월 전후에 사라진다.[1]
교차 활성화는 프로젝터 동기(외부 공간에서 광자를 인식하는 사람)의 방추형 회초리와 연관자 동기 회심의 각 회초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학습된 연관성에서 오는 광자를 마음속으로 지각하는 사람).[15]
교차활성화 이론의 한 가지 문제는 공감각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해야 하지만, 오직 어린아이의 중간 단계에서만 뚜렷이 드러난다는 점이다.[1]
금지된 피드백 모델
금지된 피드백 모델은 교차 활성화 이론의 대안이다.[16] 금지되지 않은 피드백 모델은 동의자의 연결성 증가에 대한 가정을 거부하고 교차 활성화가 정상적인 성인 두뇌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억제 감소에 기인한다고 제안한다.[16] 거부반응은 망막고정 경로의 손상이나 화학작용제, 감각 박탈, 명상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도되는 것에 의해 색마감이 획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1]
모든 뇌에서 억제와 흥분은 균형을 이루는 해부학적 교차 연결이 있다.[1] 그러나 흥분은 공감각자들에게 만연하며 이는 "제2의 감각 영역에서 감각적 감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른 구조를 방해한다.[15] 이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한 이론은 신경전달물질 매개 억제다. 국지적 억제망은 피질 발사를 특정 지역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네트워크가 비쿠쿨린에 의해 차단될 때 피질 발화의 확산으로 이어진다.[1]
다중 경로로부터 수렴 신호를 받는 뇌의 전방 이송 연결은 피드백 연결에 의해 왕복된다.[18]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피드백 연결은 동시 인식의 공감적 유도를 피하기 위해 충분히 억제된다. 공감대에서는 유도자 경로의 피드포워드 신호가 유도자와 동시경로가 모두 수렴하는 뉴런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피드백 신호는 동시경로 아래로 전파되어 동시표현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18] 이 메커니즘에서 유도자의 피드포워드 활동은 동시 대표성의 피드백 활성화로 이어진다.[18]
리서치
공감각증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감각자와 비 공감각자 모두 비임의 방식으로 소리를 색에 일치시키고, 환각제 섭취가 1시간 이내에 공감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각적 경험은 정상 뇌에 존재하는 기존 경로를 이용한다고 일부 연구자는 제안한다.[5] 비록 증거가 유전적 소인을 가리키지만, 공감각의 원인 또한 불분명하다. 비록 그 상태가 가족 내에서 특이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공감각은 가족 내에서 일어난다.[16] 공감각은 한 세대를 건너뛸 수 있다.[16] 다만 한 명만 공감각을 갖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 추가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6]
공감각적 뇌와 비동기적 뇌 사이의 차이는 뇌의 단일 청각과 시각적 영역 사이의 직접 유선 연결을 반영하거나, 다중모드 시청각 영역에서 모든 뇌에 존재하는 단일 시각 영역까지의 피드백 경로를 반영할 수 있다.[5]
특정 뇌 영역의 관여
공감각에서의 높은 상호연결성 외에도 공감각적 경험 중 하등 두정피질로부터 분명한 기여가 있는데, 아마도 현실과 공감각적 인식을 하나의 경험으로 묶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16][19] 두정엽 활성화는 공감각적 경험으로 주의의 초점을 이끌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16]
기능 자기 공명 영상 연구는 청각과 시각 정보의 통합을 위해 왼쪽 상위의 시간적 설커스를 포함한다. 이 뇌 영역은 일치된 쌍의 시각 및 청각 정보에 가장 강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일치된 입술 움직임과 말씨.[5]
정의편향
문헌에는 연구 주제의 선택과 결과의 해석에 편향될 수 있는 공감각의 상충되는 정의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공감각은 오랫동안 '감각의 활성화' 또는 일종의 '교차 감각' 경험으로 묘사되어 왔지만, 그 조건이 모든 개인에게 순수하게 감각/지각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공감각의 서술은 상태를 기술하는 데 유용하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 과학탐구의 선택기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3]
공감각의 또 다른 일반적인 정의 특성은 공감각적 연관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두 번 컬러 페어링을 보고하도록 하여 결정되며, 몇 달 동안 재검사에서 분리된다. 일관성은 공감각의 근본적인 것으로 설명되어 왔기 때문에 일관성의 테스트는 진정한 상태를 파악하고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행동의 '금본위제'가 되었다.[3] 이것은 순환 편견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상 모든 연구 주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다.[3] 일관성은 어느 정도 공감각의 특성일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공감각 기준에는 들어맞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감각적 연관성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개인이 있다.[3]
공감각의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의 특성은 공감각이 공간적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것이며, 개인들은 동시에 경험하는 공간적 위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음색 공감각의 경우 음악을 듣는 데서 색채광자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광채의 이동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3] 대다수의 공감각자들은 공감각적 경험에 대한 공간적 질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질은 없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많다.[3]
공감각 연구에 대한 정의적 포함/제외 기준 외에도, 자기 보고 편향은 많은 연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자기 보고 편향은, 만약 존재한다면, 그 조건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들에 의해 정의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구화될 것이다. 그 경우는 숨겨져 있는 경우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을 것이다.[3] 이는 많은 공감각적 개인이 규정된 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근거로 자신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공감각적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비동기적 개인과 구별할 수 있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까지 중요하다.
이 문제들의 가능한 해결은 신경학적 기준으로 공감각을 정의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3] 그러한 통일된 신경생물학적 원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일 그것이 존재한다면 행동의 정의가 하지 못한 방식으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것이다.[3]
약물유발 크로마슈
색각은 신경전달물질의 조작을 통해 화학요소로 일시적으로 유도될 수 있다. 이 물질들은 또한 기존의 공감각을 조절할 수 있다.[1] LSD, 메스칼린, 실로시빈, 아야후아스카를 포함한 정신 활성제는 자발적 공감각을 유도하는 비선택적 세로토닌 작용제, 특히 음색 대 색상을 유도한다.[20]
마약에 의한 색각증을 처음으로 보고한 것은 1845년 테오필 고티에였다.[1] 그는 해시쉬의 영향으로 "내 청력은 엄청나게 발달했다. 나는 색의 소음을 들었다. 초록, 빨강, 파랑, 노랑 소리가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파도에 도달했다.[21] 고티에는 구스타브 모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스케치를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색채적인 경험을 악기 위에 색채의 선으로 묘사했다.[21]
최근의 과학적 연구들은 강화된 방법론을 통해 약물에 의한 공감각은 선천적 공감각과는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신 활성 물질은 "자극에 의한 활성화를 유발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전달 흐름을 방해한다"[1]고 한다. 화학적 작용으로 도출된 공감각의 가장 흔한 유형은 색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유도자는 청각과 시각적 자극, 특히 음악을 포함한다. 이는 다른 유형의 공감각보다 소리 대 색의 공감각의 유행을 설명할 수 있다.[20]
하인리히 클뤼버는 1920년대에 페요테의 영향으로 반복되는 기하학적 모양을 분류했다.[1] 그는 이것을 양식 상수라고 불렀다. 터널, 나선형, 허니콤 그라팅스, 코브스. 이는 죽음에 가까운 경험, 감각 상실, 깨어나거나 잠드는 것, 편두통 중에 나타나는 약물 유발 환각과 자연 환각에도 모두 적용된다.[22] 클뤼버에 따르면, 모든 환각은 이러한 범주들 중 하나에 있는 모양들로 구성되며 '비정상적인' 환각은 단순히 변형된 것이다. 형태 상수는 염색체 경험에서 흔히 볼 수 있다.[1]
사이키델릭은 시사성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에 색마각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흔하다;[20] 특히 밝기, 포화, 휘도, 대비, 색조를 포함한 색채 인식의 모든 측도가 화학 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선천적 색각과는 반대로 약물 유도 색각은 일관성이 없거나 자동적이지 않다. 더욱이 상향식 처리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경험을 담당하기 때문에 외부 자극과 맥락이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다.[1]
직접적(의도적으로 공감각을 유도하려고 노력함)과 간접적(참가자는 공감각적 경험에 관한 질문 하나를 포함하여 일련의 질문에 반응함) 두 가지 연구는 화학적 작용제와의 공감각 유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위약 조절의 부족, 이중 블라인드, 무작위 할당을 포함한 많은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있다.[20]
음악과 색각
색마각을 가진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예술적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나아가 "회심의 취미와 직업 모두 창조산업 쪽으로 치우쳐 있다"[14]고 했다. 공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유전자가 개념과 아이디어를 연관시켜 더 창의적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더 은유적이다. 이것은 공감각을 가진 음악가들의 높은 발생률을 설명할 수 있다.[23]
하지만, 음악적 경험은 색과 음색을 일관되게 맞추는 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연적인 기대와 대조적으로, 연구들은 절대 피치의 소유가 일치 능력의 국지적인 차이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4]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절대 피치가 우연한 오차를 겪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 추론된 노트 이름이 특정 시험에서 피치 유도 색상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4] 또 다른 가능성은 절대 피치를 가진 사람들이 정상보다 더 엄격한 피치 인식 범주에 라벨을 붙일 수 있으며, 구별되는 음조 사이를 넘기기 위해 더 많은 범주 경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4]
색마각을 가진 작곡가들
프란츠 리스트는 연주자들에게 색으로 연주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작곡가다. 그는 그의 오케스트라에게 "블루어 패션"으로 음악을 연주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음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공감각은 리스트의 시대에 흔한 용어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가 음악 용어 대신 색깔을 언급했을 때 그가 그들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색마각을 논했는데, 이를 '색채의 시기'[24]라고 표현했다. 특정 곡을 특정 색으로 지칭하지는 않지만, 그는 공연하는 아티스트에게 어떻게 들릴지 설명한다. 그가 오케스트라와 가수가 "timbre"를 바꿀 때 그들을 멈추게 하는 녹음들이 있다.[25] 만약 누군가가 작품 속의 'timbre'나 음색을 바꾸면, 그것이 꼭 듣는 사람에게 소리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크로마취를 가진 작곡가는 자동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Amy Beach는 공감각을 가진 또 다른 작곡가였다. 그녀의 관점에 따르면, 각각의 주요 서명은 특정한 색과 연관되어 있었다. 만약 예술가가 그들의 목소리에 맞게 열쇠를 바꾸었다면, 그녀는 그것이 작품의 의도된 소리, 묘사, 감정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날 것이다.[24]
올리비에 메시아엔은 작곡으로 음악적 키의 색에 영향을 받았다.[14]
알렉산더 스크리아빈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은 러시아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였다. 그는 공감각자로 유명하지만, 그가 색마각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26] 스크리아빈은 색과 감정을 감정과 연관시키는 시스템을 가진 Theosophypics의 주요 지지자였다.[27] 이는 음악가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는 "영적인" 톤양성(F-sharp major)과 "지구적인, 물질적인" 톤양성을 구별했다(C major, F major).[26] 나아가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은 음악 음을 색과 직접 매치한 '빛을 가진 키보드' 또는 클라비에르 아 루미에르(Clavier ar ar lumieres)[26]를 개발했다.
스크리아빈은 심포니 작품 안에서 색색의 빛이 통합되면 '청중을 위한 강력한 심리적 공명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28] 그래서 그는 그의 색심포니 프로메테우스를 위해 클라비어 아 루미에르를 창조했다. 불의 시.이것은 화면에 색을 투사하는 색 기관으로 구성되었다.[28] 음악학자 사바네예프는 1911년 스크리아빈의 소리-색상 매핑 표를 처음 출판했다.[26]
| 참고 | 색 |
|---|---|
| C | 빨간색 |
| G | 오렌지 핑크 |
| D | 노란색 |
| A | 녹색 |
| E | 휘티쉬블루 |
| B | E와 유사하다 |
| F♯ | 파랑, 밝은 |
| D♭ | 바이올렛 |
| A♭ | 보라색-보라색 |
| E♭ | 금속 광택이 있는 스틸 컬러 |
| B♭ | E 플랫과 유사 |
| F | 빨강, 어두움 |
스크리아빈은 작곡가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와 친구로 교감을 하던 사이였고, 그들의 소리 투 컬러 연관성은 같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림스키코르사코프는 큰 음계와 작은 음계를 구별했고 그의 연관성은 "더 중립적이고 자발적인 성격"[26]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개인은 다른 소리가 아닌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소리 대 색의 연관성은 그 사이에 크게 다르다.[1]
음을 5분의 1의 원으로 주문할 때 색은 스펙트럼의 순서로 되어 있어 스크리아빈이 다음과 같은 색마각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29]
| 참고 | 색 |
|---|---|
| C | 빨강, 강렬한 |
| G | 오렌지 |
| D | 노란색 |
| A | 녹색 |
| E | 하늘색 |
| B | 파랑 |
| F♯/ G♭ | 밝은 파란색 또는 보라색 |
| D♭ | 보라색 또는 보라색 |
| A♭ | 바이올렛 또는 라일락 |
| E♭ | 살 또는 강철 |
| B♭ | 로즈. |
| F | 진한 빨강 |
스크리아빈이 색각증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의 작품은 이 현상의 특수성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는 색과 음색을 연관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의 작곡으로 전체적인 감각 경험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색깔뿐 아니라 '감촉과 미각의 생성과 감각'으로 실험을 했다.[30]
참조
-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Cytowic RE (2018). Synesthesia. Cambridge, MA: MIT Press. ISBN 978-0-262-53509-0.
- ^ a b c Cytowic RE, Eagleman DM (2009). Wednesday is Indigo Blue: Discovering the Brain of Synesthesia (with an afterword by Dmitri Nabokov). Cambridge: MIT Press. p. 309. ISBN 978-0-262-01279-9.
-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Simner J (February 2012). "Defining synaesthesia" (PDF).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London, England. 103 (1): 1–15. doi:10.1348/000712610X528305. PMID 22229768.
- ^ a b c d e de Thornley Head P (February 2006). "Synaesthesia: pitch-colour isomorphism in RGB-space?". Cortex; A Journal Devoted to the Study of the Nervous System and Behavior. 42 (2): 164–74. doi:10.1016/s0010-9452(08)70341-1. PMID 16683490. S2CID 53179317.
- ^ a b c d e Ward J, Huckstep B, Tsakanikos E (February 2006). "Sound-colour synaesthesia: to what extent does it use cross-modal mechanisms common to us all?". Cortex; A Journal Devoted to the Study of the Nervous System and Behavior. 42 (2): 264–80. doi:10.1016/s0010-9452(08)70352-6. PMID 16683501. S2CID 4481009.
- ^ Calkins MW (1893-07-01). "A Statistical Study of Pseudo-Chromesthesia and of Mental-Form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5 (4): 439–464. doi:10.2307/1411912. JSTOR 1411912.
- ^ a b c Goller AI, Otten LJ, Ward J (October 2009). "Seeing sounds and hearing colors: an event-related potential study of auditory-visual synesthesia".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1 (10): 1869–81. doi:10.1162/jocn.2009.21134. PMID 18823243. S2CID 17434150.
- ^ a b c d e f Niccolai V, Jennes J, Stoerig P, Van Leeuwen TM (2012). "Modality and variability of synesthetic experienc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25 (1): 81–94. doi:10.5406/amerjpsyc.125.1.0081. PMID 22428428.
- ^ Haack, Paul A.; Radocy, Rudolf E. (1981-07-01). "A Case Study of a Chromesthetic".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9 (2): 85–90. doi:10.2307/3345016. ISSN 0022-4294. JSTOR 3345016. S2CID 144842634.
- ^ a b c d e f Jewanski J, Simner J, Day SA, Rothen N, Ward J (November 2019).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synesthesia in the nineteenth century as revealed through the history of its name".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Neurosciences. 29 (3): 259–285. doi:10.1080/0964704X.2019.1675422. PMC 7446036. PMID 31702956.
- ^ Jewanski J, Day SA, Ward J (July 2009). "A colorful albino: the first documented case of synaesthesia, by Georg Tobias Ludwig Sachs in 1812".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Neurosciences. 18 (3): 293–303. doi:10.1080/09647040802431946. PMID 20183209. S2CID 8641750.
- ^ Forster MN, ed. (2002-09-05). "Treatise on the Origin of Language (1772)". Herder: Philosophical Writings (1s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5–164. doi:10.1017/cbo9781139164634.007. ISBN 978-0-521-79088-8. Retrieved 2020-06-22.
- ^ "Zwangsmässige Lichtempfindungen durch Schall und verwandte Erscheinungen auf dem Gebiete der anderen Sinnesempfindungen". Nature. 24 (603): 51–52. May 1881. Bibcode:1881Natur..24...51.. doi:10.1038/024051a0. ISSN 0028-0836. S2CID 43201081.
- ^ a b c d Ward J (2013-01-03). "Synesthesi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4 (1): 49–75. doi:10.1146/annurev-psych-113011-143840. PMID 22747246.
- ^ a b c Zdzinski SF, Ireland SJ, Wuttke BC, Belen KE, Olesen BC, Doyle JL, Russell BE (February 2019). "An Exploratory Neuropsychological Case Study of Two Chromesthetic Musicians". Research Perspectives in Music Education. 20 (1): 65–82.
- ^ a b c d e f g h i j Specht K (March 2012). "Synaesthesia: cross activations, high interconnectivity, and a parietal hub". Translational Neuroscience. 3 (1): 15–21. doi:10.2478/s13380-012-0007-z. S2CID 143228367.
- ^ Brang D, Williams LE, Ramachandran VS (May 2012). "Grapheme-color synesthetes show enhanced crossmodal processing between auditory and visual modalities". Cortex; A Journal Devoted to the Study of the Nervous System and Behavior. 48 (5): 630–7. doi:10.1016/j.cortex.2011.06.008. PMID 21763646. S2CID 10497638.
- ^ a b c Grossenbacher PG, Lovelace CT (January 2001). "Mechanisms of synesthesia: cognitive and physiological constraint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5 (1): 36–41. doi:10.1016/s1364-6613(00)01571-0. PMID 11164734. S2CID 15092606.
- ^ Dovern A, Fink GR, Fromme AC, Wohlschläger AM, Weiss PH, Riedl V (May 2012). "Intrinsic network connectivity reflects consistency of synesthetic experiences". The Journal of Neuroscience. 32 (22): 7614–21. doi:10.1523/JNEUROSCI.5401-11.2012. PMC 6703581. PMID 22649240.
- ^ a b c d Luke DP, Terhune DB (October 2013). "The induction of synaesthesia with chemical agents: a systematic review". Frontiers in Psychology. 4: 753. doi:10.3389/fpsyg.2013.00753. PMC 3797969. PMID 24146659.
- ^ a b van Campen C (2019-09-09). "Exploring Drug-Induced Synesthesia". The MIT Press Reader. Retrieved 2020-06-23.
- ^ Bressloff PC, Cowan JD, Golubitsky M, Thomas PJ, Wiener MC (March 2002). "What geometric visual hallucinations tell us about the visual cortex". Neural Computation. 14 (3): 473–91. doi:10.1162/089976602317250861. PMID 11860679. S2CID 207683037.
- ^ Robertson LC, Sagiv N (2004-10-14). Synesthesia: Perspectives from Cognitive Neurosc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19-029028-3.
- ^ a b c "Synesthete-composers-and-musicians". www.daysyn.com. Retrieved 2019-10-15.
- ^ "Tenor Keeps Screwing Up while Bernstein Conducts - Awkward Sequenc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21-12-21 – via www.youtube.com.
- ^ a b c d e f g Galeyev BM, Vanechkina IL (2001). "Was Scriabin a Synesthete?". Leonardo. 34 (4): 357–361. doi:10.1162/00240940152549357. ISSN 0024-094X. JSTOR 1577166. S2CID 57564192.
- ^ Altman MJ (2017-08-24). "The Theosophical Quest for Occult Power". Oxford Scholarship Online. doi:10.1093/acprof:oso/9780190654924.003.0005.
- ^ a b Peacock K (1985). "Synesthetic Perception: Alexander Scriabin's Color Hearing". Music Perception. 2 (4): 483–505. doi:10.2307/40285315. ISSN 0730-7829. JSTOR 40285315.
- ^ Harrison JE (2001). Synaesthesia : the strangest t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0-19-263245-0. OCLC 45446164.
- ^ Altenmüller E (2015). "Alexander Scriabin: his chronic right-hand pain and Its impact on his piano compositions". Progress in Brain Research. 216: 197–215. doi:10.1016/bs.pbr.2014.11.031. ISBN 978-0-444-63410-8. PMID 25684291.
외부 링크
 위키미디어 커먼스의 크로마쉬와 관련된 매체
위키미디어 커먼스의 크로마쉬와 관련된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