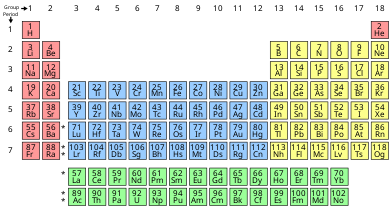재식민지화
Recolonization재식민지화는 특히 이전의 식민지가 현재 독립된 국가인 경우에 직접적인 식민주의 하에서 존재했던 이전의 식민지에 대한 조건을 효과적으로 복제하거나 재생산하는 측면에서 전 또는 신 식민지화 강국들이 이전의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재식민지화는 본질적으로 탈식민지화의 실패나 불완전한 성질을 언급하고 있으며, 세계남부에 있는 이전의 식민지의 조건을 참조하는 데 종종 사용되는데, 이들 중 많은 국가들은 현재 공식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주권국가들은 아직도 세계 자본주의에서 여전히 이전의 식민지 지배 강국에 예속되어 있다. 이전 또는 새로운 식민 지배권력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이익을 얻는 명백한 목적을 가진 이전 식민지의 지속적인 자원 추출과 군사 통제([1][2][3]예: 반체제 세력 및 정권 교체) 과거 식민지에 대한 식민지 열강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은유로 구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신식민지주의와 비교되어 왔다.[2]
용어의 사용
1990년대 아프리카 작가 알리 마즈루이와 아치 마페제는 마즈루이가 '식민화냐, 자기식민화냐'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낸 데 이어 재식민화라는 용어의 사용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LA 타임즈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는 '아프리카의 썩어가는 부분들에는 양성 식민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려 있으며, 이 내용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다. 마즈루이는 이 글에서 "아프리카인들이 자비로운 개입을 포함해 서로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할 때"라며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1964년 잔지바르가 탕가니카에 의해 합병된 경우를 예로 들며, 한동안 우방과 심지어 지도까지 했다. 마즈루이는 "아프리카가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안정과 경제성장이 유럽 전체를 세계 사회의 절박한 여백으로 더 밀어넣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자기 결속화"를 반영하는 아프리카 안보리를 제안했다. 외부인에 의한 식민지화보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낫다."[4]
마즈루이는 마페제로부터 "지적적으로 파산한" "분석적으로 피상적인" 방식으로 식민지화와 식민지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서구 인종주의의 의식 없는 대리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마페제는 마즈루이가 "이 용어에 대한 인종차별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함축적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백인의 부담(조잡한 진부한)을 버리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제국주의 체제가 어떻게 파트리스 루뭄바를 제거했는지를 거론하며 신탁통치 제도를 위한 그의 주장을 해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더 안정적이거나 강력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더 이상 장애가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감독하거나 "식민지화"할 필요가 있다는 마즈루이의 주장을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마페제는 "아프리카의 모든 정치학자는 알리 마즈루이의 처방이 사실 이 대륙의 대중적 정서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재식민화가 필요하기는커녕 아프리카에서도 신체 정치뿐 아니라 정신의 탈식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마즈루이의 기사에 대한 비판을 마무리한다.[5]
마즈루이의 글은 특히 이집트와 소말리아 등지에서 마즈루이의 주장이 아랍어 번역에 채용된 언어 때문에 일부에 의해 잘못 해석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자파르 카셈 알리는 마즈루이의 글이 이전의 식민지화 제도를 아프리카로 다시 불러들이기보다는 "초기의 팍스 아프리카나를 꿈꾸고 있었다"고 주장한다.[6]
자비로운 재식민화는 식민지 지배자가 식민지 지배자보다 새로운 관계로부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때 발생한다. 카셈-알리는 1960년대 중반 탕가니카가 잔지바르를 재식민시킨 사례를 인용하며, 잔지바르 국민들은 탄자니아 공화국에서 반론적으로 더 큰 정치력을 얻었으며, 여기에는 연합의 보장된 부통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잔지바르족'이 독립 후 주권을 포기하고 싶은지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탈식민지화'의 사례로 거론돼 왔다.[6]
양성 재식민화는 식민지 지배자와 식민지 지배자 사이의 이익이 서로 평행하고 도덕적 사례도 상대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한다. 카셈-알리는 1979년 탄자니아의 이디 아민(Idi Amin)을 축출하고 밀턴 오보테(Milton Obote)의 지도부를 복권한 우간다의 잠시 점령은 탄자니아의 캄팔라와 우간다에서 아민(Amin)에 의해 선동된 폭정의 종말을 통해 얻은 "대응력이 더 뛰어난 정부"를 양성 재탈민화시킨 사례라고 언급하고 있다.[6]
악성 재식민화는 식민지 개척자보다 식민지 개척자가 새로운 식민지 관계로부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때 발생한다. 카셈-알리는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 식민지 지배가 끝난 후 하일 셀라시에 천황의 지도 아래 에리트레아를 합병하기로 한 사례를 인용하며, 에리트레아에게 어떠한 지역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고 1962년부터 1992년까지 30년간 내전을 초래했다. 모로코가 '국민투표 조작'이나 위협적인 무력행동을 통해 서부 사하라를 강제 편입하려 한 사례도 있어 사하라의 자결 없는 합병을 막기 위한 유엔의 조치를 촉발했다.[6]
자비롭고 양성적인 재식민화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카셈 알리는 인용문("재식민지화")으로 용어를 나열하는 반면, 악성 재식민화에 대한 그의 논의에서 그 용어는 그대로 남아 있어 후자의 시나리오에서 재식민지화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6]
메모들
참조
- 카셈-알리, 자파르(2004) "팩스 아프리카나와 아프리카의 재콜론화"는 '아프리카의 조건 토론: 거버넌스와 리더십'에서 나왔다. 아프리카 세계 언론
- 김체, 존(1971년). 중동의 사람들과 정치: 아랍-이스라엘 분쟁-그들의 배경과 평화를 위한 예후 트랜잭션 게시자.
- 마페제, 아치(1995년). "아프리카의 조건 토론: 거버넌스와 리더십"에서 "제국주의 봉사에 있어서의 베니그 재식민화와 악성 마인드". 아프리카 세계 언론
- 마즈루이, 알리 A. (1994년). "식민지화인가, 자기식민화인가? 아프리카의 부패한 부분들은 양성적인 식민지화가 필요하다."라고 아프리카의 조건: 통치와 리더십에 대해 토론했다. 아프리카 세계 언론
- 마즈루이, 알리 A.(1995) "자체-콜론화와 팍스-아프리카나 찾기: 재결합" 아프리카 조건 토론: 거버넌스와 리더십에서. 아프리카 세계 언론
- 탈파드 모한티, 찬드라(2003) 국경 없는 페미니즘: 탈식민지화 이론, 연대 실천. 듀크 대학 출판부.
- 사울, 존 S. (1993) 재식민지화 및 저항: 1990년대의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세계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