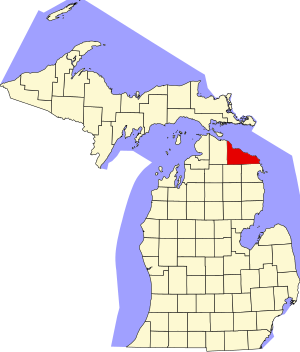유고슬라비아-짐바브웨 관계
Yugoslavia–Zimbabwe relations유고슬라비아 | 짐바브웨 |
|---|---|
유고슬라비아-짐바브웨 관계는 현재 분열된 유고슬라비아와 짐바브웨의 역사적인 대외 관계였다.유고슬라비아와 짐바브웨 독립운동의 관계는 1980년 독립 전에 시작되었으며 비동맹운동의 활동에 양측 모두 참여함으로써 두드러졌다.양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1980년에 수립되었다.[1]
역사
로버트 무가베가 이끄는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연합과 조슈아 은코모가 이끄는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연합은 모두 1978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비동맹운동장관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다.[2]무가베의 움직임은 중국이 더 많이 동조하고 지지하고 있는 반면 은코모의 운동은 친소운동으로 인식되었다.[2]1948년 티토-스탈린 분열의 경험으로 특징지어지는 냉전 유고슬라비아는 무가베의 운동에 대해 더 많은 동정심을 보였는데, 무가베는 무가베가 인정받지 못하는 로도시아의 인종차별주의 정권에 대항하여 싸우는데 있어서 일정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2]유고슬라비아는 무가베의 운동 대표단 110번을 배정하는 등 의전 수준에 대한 선호를 보였으며, 은코모의 운동은 111. 대표단으로 끝났다.[2]유고슬라비아 외교는 짐바브웨 공화국의 탄생과 인정으로 직결된 랭커스터 하우스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했다.[3]1979년 11월 피터 블레이커 외무부 장관 겸 영국 보수당 정치인이자 외무장관은 베오그라드를 방문했는데, 그는 조셉 브르호벡과의 대화에서 곧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유고슬라비아는 잠비아에 대한 외국의 침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4]
1980년부터 유고슬라비아 해체까지의 관계
독립 후 로버트 무가베의 첫 대규모 국제 행사 중 하나는 1980년 5월 조셉 브로즈 티토의 국장 때 일어났다.[4]유고슬라비아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무가베는 짐바브웨 혁명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지지는 크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제2차 세계 대전 유고슬라비아의 파시즘에 대한 저항은 짐바브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4]시비제틴 미자토비치 총리는 1981년 봄 아프리카 순방 중 짐바브웨를 방문했고 무가베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귀국했다.[4]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마지막 해 동안 짐바브웨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불량한 주(州)에 상당한 지지를 보였으며, 그들이 유엔에 가입한 후 2년 동안 옛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의 인정을 기권했다.유고슬라비아 위기 당시 짐바브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777호 표결에서 기권한 3개 주 중 하나였다.
참고 항목
참조
- ^ Radina Vučetić; Pol Bets; Radovan Cukić; Ana Sladojević (2017). Tito u Africi: slike solidarnosti (PDF). Museum of Yugoslavia. ISBN 978-86-84811-45-7.
- ^ a b c d "'Da mu nisam 'sredio' susret s Titom, Mugabe nikad ne bi priznao Hrvatsku': prekaljeni diplomat Frane Krnić za 'Slobodnu' otkrio svoje veze s nedavno preminulim liderom Zimbabvea". Slobodna Dalmacija. Retrieved 8 August 2020.
- ^ "ISPOVIJESTI HRVATA KOJI ŽIVE U ZEMLJI BIVŠE DIKTATURE 'Došli smo na 6 mjeseci a ostali 16 godina. Klima je fantastična, a ljudi miroljubivi'". Jutarnji list. Retrieved 8 August 2020.
- ^ a b c d Tvrtko Jakovina (2011). Treća strana Hladnog rata. Fraktura. ISBN 978-953-266-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