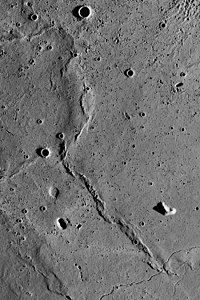주류
Liquation액수는 광석이나 합금에서 금속을 분리하는 야금법이다. 금속의 혼합물은 3분의 1과 함께 녹고, 그 후에는 액체 추출에 의해 혼합물이 분리된다. 이 방법은 주로 납을 이용해 은과 구리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광석에서 안티몬 광물을 제거하고 주석도 정제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구리와 은을 분리하는 것
대규모로 주류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15세기 중반 독일에서였다. 금속 노동자들은 중유럽의 구리 광석이 은이 풍부하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금속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1]
과정
게오르크 아그리콜라가 1556년 논문 데 르메티카에서 설명한 액수를 이용하여 구리와 은을 분리하는 16세기 과정은 19세기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고,[2] 황화법, 결국 전해법 등 보다 값싸고 효율적인 공정으로 대체되었다.[3]
액상에서는 먼저 은이 풍부한 구리를 납의 약 3배 무게로 녹여야 한다. 은이 납과 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은의 대부분은 구리보다는 이 안에 있게 될 것이다.[4] 구리를 분석하여 액화가 재정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의 은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최소 약 0.31%가 필요함)[3] 구리를 녹여 은의 상당 부분이 바닥으로 가라앉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톱'을 뽑아 구리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반면, 은이 풍부한 '바닥'은 액화 과정에 사용된다.[2] 만들어진 구리 납 합금은 태핑하여 '액화 케이크'로 알려진 큰 평면 콘벡스 주괴에 주조할 수 있다. 금속이 식으면서 구리 및 은을 함유한 납이 서로 불변하므로 분리된다.
이들 케이크에서 구리에 대한 납의 비율은 공정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아그리콜라는 구리 3부위부터 8-12부위까지 추천했다. 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구리를 분석해야 한다. 은이 풍부한 구리의 경우 이 비율의 상단 끝을 사용하여 가능한 최대 양의 은이 납 내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러나, 일단 납의 대부분이 다 빠지면 케이크가 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구리가 있어야 한다; 너무 많은 구리는 안에 있는 납의 일부를 가두게 되고 그 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일 것이다.[2]
이 케이크들의 크기는 1556년 아그리콜라가 그것들을 썼을 때부터 그 과정이 쓸모없게 된 19세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했다. 그들은 보통 2인치에서 3인치(6.4에서 8.9cm) 두께로 직경 약 2피트(0.61m) 정도였으며 225에서 375파운드(102kg에서 170kg)까지 무게가 나갔다. 주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케이크 크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관성이 이유 없이 있는 것은 아니다. 케이크가 너무 작으면 제품이 공정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일 가치가 없을 것이고, 너무 크면 최대 납이 다 빠지기 전에 구리가 녹기 시작할 것이다.[2]
케이크는 보통 한 번에 4~5개씩 액화고에서 납 녹는점(327℃) 이상의 온도까지 가열되지만 구리(1084℃)보다 낮아 은이 풍부한 납이 녹아서 흐른다.[5] 납의 용해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고온의 용해로는 필요하지 않으며 나무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4] 납 산화를 피하기 위해 낮은 대기, 즉 산소가 적은 대기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케이크는 숯으로 잘 덮여 있고 용광로에는 공기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2] 그러나 일부 납이 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이것은 아래로 떨어져 난로 밑의 수로에 '액화 가시'로 알려진 뾰족한 돌출부를 형성한다.[3]
그런 다음 은을 납에서 분리하는 데 비교적 간단한 커리큘레이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납을 분석하여 커리큘레이션 과정을 가치 있게 할 만큼 충분한 은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충분한 은을 가질 때까지 액화 케이크에 재사용한다.[2]
아직 납과 은을 일부 함유하고 있는 '배기 주류 케이크'는 산화 조건에서 더 높은 온도로 가열되는 특수 용광로에서 '건조'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액화의 또 다른 단계일 뿐이며, 비록 일부는 납 금속으로 남아있지만, 나머지 납의 대부분은 액화 가시를 형성하기 위해 배출되고 산화된다. 그러면 구리를 정제하여 다른 불순물을 제거하고 구리 금속을 생산할 수 있다.[2]
폐품은 특히 은과 같은 금속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액상 케이크를 생산하는데 재사용될 수 있다.[2] 폐품들은 대부분 액상과 건조 과정에서 나오는 액화 가시의 형태지만 슬래그도 일부 생산된다.
금속손실
이 과정은 100% 효율적이지 않다. 1857년과 1860년 사이 우르덴탈, 알테나우, 산크트 안드레아스베르크 제련소에서는 은의 25%와 납의 25.1%, 구리의 9.3%가 소실되었다. 이 중 일부는 재사용할 가치가 없는 슬래그에서 분실되고, 일부는 '소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분실되며, 은의 일부는 정제된 구리에 분실된다.[6] 따라서 다양한 단계에서 잃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 지속적인 납 공급이 필요했던 것은 분명하다.
첫 번째 예
리큐레이션은 1453년 뉘른베르크에 있는 시영 주조 공장 기록 보관소에 처음 기록된다. 뉘른베르는 독일의 주요 금속 정제 및 제조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야금 기술 분야의 선도자였다. 이 도시 주변에 5개의 주류 공장이 곧 생겨났고, 15년 안에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알프스 전역에 퍼졌다.[1]
이것은 종종 주류의 시작이라고 여겨지지만, 증거는 주류가 수세기 전에 소규모의 사용에서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맞춤형 용광로를 갖춘 15세기 주류 공장의 세련된 특성은 새로운 기술로는 놀랄 것이다. 1591년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에 가져온 훨씬 간단하지만 노동집약적인 방법 또한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초기 유럽 방법의 잔재일 것이다.[7]
아그리콜라는 액화과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구리를 논하는데, 그 중 하나가 칼다륨 또는 '솥구리'인데, 이 구리 중 하나는 납 함유량이 높고 중세 가마솥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13세기 가마솥을 분석한 결과, 은도가 낮고 납이 높은 구리로 만들어졌으며 액화가 생산하는 것과 일치한다.[5]
리큐레이션은 12세기 초에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테오필러스의 온 다이버 아트에서는 리큐션을 언급할 수 있다.
'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작은 충치를 통해 납이 흘러나오고 구리는 안에 남게 된다.'
그러나 그는 야금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의 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12세기에도 비슷한 가마솥이 있었지만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구성 분석은 발표되지 않았다.[5]
이 과정이 15세기 중엽에 널리 보급되기 전에 크게 사용되었다는 생각과는 달리, 재정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뉘른베르크 이전에는 대규모 주류의 증거가 없다. 또한, 효과적인 주류는 매우 숙련된 시술자를 필요로 한다.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익성이 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지 않다.[1]
어떤 사람들은 액화가 훨씬 더 일찍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리의 바빌로니아 문헌에는 '산 구리'는 '깨끗한 구리'를 생산하기 위해 '깨끗한 구리'를 생산하기 위해 '깨끗한 은'을 생산하기 위해 은과 함께 사용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쇼가 기원전 2천년 경부터 근동에서 행해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본문에는 은을 생산하기 위해 구리와 함께 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8]
중요도
르네상스 경제 전문가인 존 U. 네프는 이 기간 동안 주류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쇄기 발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묘사했다.[9] 그것은 대규모로 은의 생산을 증가시켰다. 1460년에서 1530년 사이 은의 생산량은 중부 유럽에서 무려 5배나 증가했다.[10] 이는 금관산업의 수요로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구리 생산 비용을 낮추고,[9] 선박과 지붕에 구리를 사용하는 부차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납 생산도 활기를 띠었는데, 실제로 이용 가능한 납의 부족은 폴란드 타르노비츠에서 납을 함유한 커다란 솔기가 발견되기 전까지 액화 과정을 지연시켰다.[1]
주류업은 광업 증대를 촉발했고, 새로운 부호 상인들이 참여하기 위해 아우성쳤다. 프랑스의 로얄 뱅커 자크 코우르와 플로렌스의 강력한 메디치 가문을 포함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들 중 일부는 광산에 투자했다. 그러나 자금의 대부분은 이웃 마을의 상인들로부터 왔다. 예를 들어 뉘른베르크의 버거들은 보헤미아 산과 하스 산맥에 있는 광산들에 자금을 지원했다.[1]
많은 새로운 구리와 은광산이 솟아올랐다. 에르츠게비르주 요아힘스탈에 있는 광산은 '조아힘스탈러'라는 동전이 만들어질 정도로 성공적이었고, 이것이 달러라는 용어로 이어졌다.[1] 다른 유명한 곳으로는 슈네베르크와 안나베르크(또한 에르츠게비르헤에), 슈와즈, 여관의 계곡, 헝가리의 너소흘에 있었다. 새로운 광산은 이전 세기의 가장 큰 광산들 중 일부를 다시 열 수 있게 해주었는데, 예를 들어, 람멜스버그의 은을 함유한 납과 구리 광산이 그것이다. 이 오래된 광산들은 이전에 홍수나 붕괴, 기술 부족, 혹은 단순히 돈의 부족으로 인해 버려진 적이 있었다. 이제 갱도는 더 깊이 가라앉고 물은 더 효율적으로 배수될 수 있어 광부들은 일단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솔기를 작업할 수 있었다.[9]
주류 기반의 부는 광업과 가공 지역 사이의 도로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광업 기술의 개선에 자금을 조달했다. 따라서 그것의 영향은 단순히 은과 구리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유럽의 큰 부분의 경제를 되살리고, 철과 수은과 같은 다른 금속의 채굴을 도왔다.
참조
- ^ a b c d e f 린치, M, 2004 세계사에서의 광산. 런던: 리액션 북스. ISBN1861891733
- ^ a b c d e f g h Hoover, H.C.와 Hover L.H., 1950. 데 르 메탈리카 / 게오르기우스 아그리콜라 뉴욕: 도버.
- ^ a b c A.G.의 시스코와 C.S.의 스미스 1951. 라자루스 에르커의 광석과 분석의 치료법.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카고 대학 출판부.
- ^ a b Tylecote, R. F. 1992. 야금의 역사. 2부. 런던: 금속 연구소.
- ^ a b c 던워스, D. & Nicholas, M., 2004. 칼다륨? 중세 시대와 중세 후기에 사용된 안티몬 청동은 역사적 야금학회에 국내 선박을 주조했다: 역사야금학회의 저널, 38(1) 페이지 24–34.
- ^ 퍼시, J, 1880년 금속: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 은과 금. 런던: 존 머레이.
- ^ a b 1976년, J.G. 호손과 C.S. 스미스. Theophilus의 Divers Arts에서. 시카고; 런던: 시카고 대학 출판부.
- ^ 1998년 S. Kalyanaraman. 일렉트럼, 금, 은: 리그베다의 소마. https://www.scribd.com/doc/2670091/Electrum-Gold-and-Silver
- ^ a b c 1941년 네프, J.U. 개혁 당시의 산업 유럽(1515 – ca. 1540). 정치 경제 저널, 제49권, 제1권 (2월), 페이지 1-40. 시카고: 시카고 대학 출판부.
- ^ Nef, J.U. 1987. 중세 문명의 (ed) 파스탄, M.M., 유럽의 케임브리지 경제사, 제2권: 중세 무역과 산업 페이지 691–761. 케임브리지: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