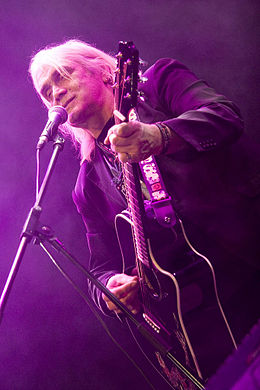공감 시뮬레이션 이론
Simulation theory of empathy공감의 시뮬레이션 이론은 인간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비슷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신적 과정을 활성화함으로써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에는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도 포함된다. 그 이론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를 예측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감정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신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한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주로 감정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즉, 일종의 공감 반응에 의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이론 이론과 같은 다른 정신 이론보다 더 많은 생물학적 증거를 사용한다.
기원
시뮬레이션 이론은 정신의 본질과 뇌와의 관계, 특히 앨빈 골드만과 로버트 고든의 작품을 연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인 정신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카크 원숭이에서 거울 뉴런의 발견은 지각과 행동 사이의 공통 코딩(볼프강 프린츠 참조)[1]과 인간의 뇌에서 유사한 거울 뉴런 체계의 가설을 위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제공했다.[2][3] 거울 뉴런 체계가 발견된 이후, 행동 이해, 감정 및 기타 사회적 기능에서 이 체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개발
거울 뉴런은 동작이 실행될 때와 동작이 관찰될 때 모두 활성화된다. 거울 뉴런의 이 독특한 기능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관찰된 행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뇌에서 관찰된 행동을 미러링한다.[4]
두 세트의 증거는 원숭이의 거울 뉴런이 행동을 이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첫째, 거울 뉴런의 활성화는 손이나 입과 같은 생물학적 이펙터를 필요로 한다. 거울 뉴런은 플라이어 같은 도구로 작용에 반응하지 않는다.[5] 거울 뉴런은 물체의 시력이나 물체가 없는 행동(직관적 작용)에 반응하지 않는다. 우밀타와 동료들은[6] 행동의 최종적인 중요한 부분이 관찰자에게 보이지 않을 때 발사된 거울 뉴런의 부분집합이 증명되었다. 실험자는 자신의 손이 큐브 쪽으로 이동하여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나중에 큐브를 움켜쥐는 뒷부분(큐브를 밀폐기 뒤에 배치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똑같은 동작을 보였다. 거울 뉴런은 눈에 보이는 조건과 보이지 않는 조건 모두에서 발사된다. 반면, 관찰자가 밀폐기 뒤에 큐브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거울 뉴런은 배출되지 않았다.
둘째, 같은 작용에 대한 거울 뉴런의 반응은 작용의 맥락에 따라 다르다. 원숭이가 문맥에 따라 입의 움직임을 관찰했을 때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단일 세포 기록 실험에서는 입거울 뉴런의 활성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입술즙을 빨아들이는 행위와 혀가 튀는 행위와 같은 의사소통 행위).[7] fMRI 연구도 거울 뉴런이 상황에 따라 컵을 잡는 작용(커피를 마시는 것과 컵을 올려놓은 테이블을 청소하는 것)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8]
거울 뉴런에 대한 한 가지 비판은, 거울 뉴런이 어떤 행동을 완료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동일한 근육 그룹이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나 욕망이 아닌 행동만을 예측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감정 이해
운동 행동과 그 관찰에 대한 공통된 신경 표현은 감정과 감정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움직임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도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활성화되는 동일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 fMRI 연구에서, 사람들이 행복, 슬픔, 분노, 놀라움, 혐오, 두려움과 같은 감정적인 얼굴 표정을 모방하고 관찰했을 때, 행동 표현에 대한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
혐오감을 느끼는 얼굴 표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관찰하면 혐오감을 직접 경험하는 전형적인 신경망이 활성화된다.[10] 촉각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누군가 다리나 얼굴을 만지는 영화를 보면서 촉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섬모센서리 피질이 활성화되었다.[11] 비슷한 거울 체계가 고통을 감지하는 데 존재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도 고통을 느낀다.[12][13]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자극이 의미하는 바를 인지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체감신경세포의 자동 활성화에 의해 추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공 크기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감정 지각에 대한 자동적인 과정을 거울 시스템에 의해 조절했다.[14] 사람들이 슬픈 얼굴을 보았을 때, 동공 크기는 동공 크기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판단하는 데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동공 크기가 원래 크기의 180%일 때, 사람들은 서글픈 얼굴을 동공이 원래 동공 크기보다 작거나 같을 때보다 덜 부정적이고 덜 강렬하다고 인식했다. 이 메커니즘은 감정 과정에 관여하는 뇌 영역인 편도체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게다가, 시청자들은 그들이 본 슬픈 얼굴들의 그것들에 그들 자신의 눈동자의 크기를 흉내낸다. 동공 크기가 자발적 통제를 벗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정 판단에 따른 동공 크기의 변화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자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행복과 분노와 같은 다른 감정적인 얼굴들이 슬픔이 그랬던 것처럼 동공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감의 인식론적 역할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인 인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한다고 믿어진다. 신경 이미지 생성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de Vignemont와 Singer는[15] "감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행동에 대해 더 빠르고 정확한 예측을 하고 우리 환경의 두드러진 측면을 발견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인식론적 역할을 주장하는 인간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로 공감을 제안했다. 행동과 감정에 대한 정신적 미러링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관련 환경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따라서 인간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4]
fMRI 연구에서 거울 시스템은 기본적인 감정의 경험을 중재하기 위한 공통 신경 기판으로 제안되었다.[16] 참가자들은 행복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담은 영상을 보고 공감지수(EQ)를 측정했다. 네 가지 감정과 관련된 특정 뇌 영역은 EQ와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거울 시스템(즉, 좌측 등하전두회/전두피질)은 모든 감정에서 EQ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자들은 이 결과를 행동지각이 얼굴지각을 감정지각에 매개한다는 증거로 해석했다.
고통에 대한 공감
사이언스(Singer et al., 2005)[13]에 실린 논문은 통증 감각과 거울 뉴런이 통증에 대한 공감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 도전한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자극을 받았을 때 전측내막과 전측두막피질에서의 활동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고통의 감정적 경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 부위가 있지만, 나머지 통증 매트릭스의 감각은 활발하지 않았다. 게다가 참가자들은 전극이 그려진 다른 사람의 손을 보았을 뿐이어서 '미러링'이 공감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자기 뇌파 촬영과 기능적 MRI를 이용한 많은 다른 연구들은 고통에 대한 감정이입이 시뮬레이션 이론을 뒷받침하는 소마토센서리 피질을 수반한다는 것을 그 이후로 증명해 왔다.[17][18][19][20]
공감의 신경 기질인 전측내막 및 전측내막피질 지지에는 "전측내막은 역겨운 얼굴표정의 관찰과 불쾌한 냄새제에 의해 유발되는 혐오감 감정 둘 다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이 핵심 발견"[10]이라고 보고한 위커 외 연구진(2003년)이 포함된다.
게다가, 한 연구는 "행동, 감정, 그리고 생동감각을 위해, 그리고 무생물적인 촉각 모두를 우리의 내적인 촉각 표현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관찰하는 활성화가 다른 사물이나 인간과 공감하기 위해 진화했다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시점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11]343쪽)는 점에 주목한다.
이타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공감
이 모델은 감정이입이 오직 하나의 대인관계 동기인 이타주의를 활성화시킨다고 말한다. 이론적으로, 공감이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춘 감정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말이 된다. 감정이입이 활성화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등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인상적이다.[21][22] 이러한 발견들은 종종 이타적인 동기부여를 증가시키는 공감의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고, 이는 다시 행동을 돕는 것을 야기한다.
참고 항목
참조
- ^ di Pellegrino, G.; Fadiga, L.; Fogassi, L.; Gallese, V. & Rizzolatti, G. (1992). "Understanding motor events - A neurophysiological study" (PDF). Experimental Brain Research. 91 (1): 176–180. doi:10.1007/BF00230027. PMID 1301372. S2CID 206772150.
- ^ Preston, S.D. & de Wall, F.B.M. (2002). "Empathy: its ultimate and proximate bases" (PDF).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5 (1): 1–20, discussion 20–71. CiteSeerX 10.1.1.554.2794. doi:10.1017/S0140525X02000018. PMID 12625087.
- ^ Iacoboni, M.; Woods, R. P.; Brass, M.; Bekkering, H.; Mazziotta, J. C. & Rizzolatti, G. (1999). "Cortical mechanisms of human imitation". Science. 286 (5449): 2526–2528. CiteSeerX 10.1.1.555.8075. doi:10.1126/science.286.5449.2526. PMID 10617472.
- ^ a b Gallese, V.; Keysers, C. & Rizzolatti, G. (2004). "A unifying view of the basis of social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8 (9): 396–403. doi:10.1016/j.tics.2004.07.002. PMID 15350240. S2CID 11129793.
- ^ Gallese, V.; Fadiga, L.; Fogassi, L. & Rizzolatti, G. (1996). "Action recognition in the premotor cortex" (PDF). Brain. 119 (Pt 2): 593–609. doi:10.1093/brain/119.2.593. PMID 8800951.
- ^ Umilta, M. A.; Kohler, E.; Gallese, V.; Fogassi, L.; Fadiga, L.; Keysers, C.; et al. (2001). "I know what you are doing: A neurophysiological study". Neuron. 31 (1): 155–165. doi:10.1016/S0896-6273(01)00337-3. PMID 11498058.
- ^ Ferrari, P. F.; Gallese, V.; Rizzolatti, G. & Fogassi, L. (2003). "Mirror neurons responding to the observation of ingestive and communicative mouth actions in the monkey ventral premotor cortex". European Journal of Neuroscience. 17 (8): 1703–1714. CiteSeerX 10.1.1.177.2287. doi:10.1046/j.1460-9568.2003.02601.x. PMID 12752388. S2CID 1915143.
- ^ Iacoboni, M.; Molnar-Szakacs, I.; Gallese, V.; Buccino, G.; Mazziotta, J. C. & Rizzolatti, G. (2005). "Grasping the intentions of others with one's own mirror neuron system". PLOS Biology. 3 (3): 529–535. doi:10.1371/journal.pbio.0030079. PMC 1044835. PMID 15736981.
- ^ Carr, L.; Iacoboni, M.; Dubeau, M. C.; Mazziotta, J. C. & Lenzi, G. L. (2003). "Neural mechanisms of empathy in humans: A relay from neural systems for imitation to limbic area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0 (9): 5497–5502. Bibcode:2003PNAS..100.5497C. doi:10.1073/pnas.0935845100. PMC 154373. PMID 12682281.
- ^ a b Wicker, B.; Keysers, C.; Plailly, J.; Royet, J. P.; Gallese, V. & Rizzolatti, G. (2003). "Both of us disgusted in my insula: The common neural basis of seeing and feeling disgust". Neuron. 40 (3): 655–664. doi:10.1016/S0896-6273(03)00679-2. PMID 14642287.
- ^ a b Keysers, C.; Wicker, B.; Gazzola, V.; Anton, J. L.; Fogassi, L. & Gallese, V. (2004). "A touching sight: SII/PV activation during the observation and experience of touch". Neuron. 42 (2): 335–346. doi:10.1016/S0896-6273(04)00156-4. PMID 15091347.
- ^ Avenanti, A.; Paluello, L. M.; Bufalari, I. & Aglioti, S. M. (2006). "Stimulus-driven modulation of motor-evoked potentials during observation of others' pain". NeuroImage. 32 (1): 316–324. doi:10.1016/j.neuroimage.2006.03.010. PMID 16675270. S2CID 23907332.
- ^ a b Singer, T.; Seymour, B.; O'Doherty, J.; Kaube, H.; Dolan, R. J. & Frith, C. D. (2004). "Empathy for pain involves the affective but not sensory components of pain". Science. 303 (5661): 1157–1162. Bibcode:2004Sci...303.1157S. doi:10.1126/science.1093535. hdl:21.11116/0000-0001-A020-5. JSTOR 3836287. PMID 14976305. S2CID 14727944.
- ^ Harrison, N. A.; Singer, T.; Rotshtein, P.; Dolan, R. J. & Critchley, H. D. (2006). "Pupillary contagion: Central mechanisms engaged in sadness processing". SCAN. 1 (1): 5–17. doi:10.1093/scan/nsl006. PMC 1716019. PMID 17186063.
- ^ de Vignemont, F. & Singer, T. (2006). "The empathic brain: How, when and why?" (PDF).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0 (10): 435–441. doi:10.1016/j.tics.2006.08.008. PMID 16949331. S2CID 11638898.
- ^ Chakrabarti, B.; Bullmore, E. & Baron-Cohen, S. (2006). "Empathizing with basic emotions: Common and discrete neural substrates". Social Neuroscience. 1 (3&4): 364–384. doi:10.1080/17470910601041317. PMID 18633800. S2CID 18612627.
- ^ Cheng, Y.; Yang, C.Y.; Lin, C.P.; Lee, P.R. & Decety, J. (2008). "The perception of pain in others suppresses somatosensory oscillations: a magnetoencephalography study". NeuroImage. 40 (4): 1833–1840. doi:10.1016/j.neuroimage.2008.01.064. PMID 18353686. S2CID 1827514.
- ^ Moriguchi, Y.; Decety, J.; Ohnishi, T.; Maeda, M.; Matsuda, H. & Komaki, G. (2007). "Empathy and judging other's pain: An fMRI study of alexithymia". Cerebral Cortex. 17 (9): 2223–2234. doi:10.1093/cercor/bhl130. PMID 17150987.
- ^ Lamm, C.; Nusbaum, H.C.; Meltzoff, A.N. & Decety, J. (2007). "What are you feeling? Using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to assess the modulation of sensory and affective responses during empathy for pain". PLOS ONE. 2 (12): e1292. Bibcode:2007PLoSO...2.1292L. doi:10.1371/journal.pone.0001292. PMC 2144768. PMID 18091986.
- ^ Ogino, Y.; Nemoto, H.; Inui, K.; Saito, S.; Kakigi, R. & Goto, F. (2007). "Inner experience of pain: imagination of pain while viewing images showing painful events forms subjective pain representation in human brain". Cerebral Cortex. 17 (5): 1139–1146. doi:10.1093/cercor/bhl023. PMID 16855007.
- ^ Batson, C. D (1991). "The Altruism Question: Toward a Social-Psychological Answer".
{{cite journal}}: Cite 저널은 필요로 한다.journal=(도움말) - ^ Batson, C. D.; Gilbert, D. T.; Fiske, S. T.; Lindzey, G. (1998).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