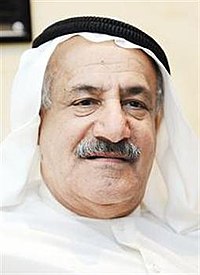말레이시아-태국 국경
Malaysia–말레이시아-태국의 국경선은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구분하며 말레이반도를 가로지르는 595km(370mi)의 육지 경계와 말라카 해협과 태국·남중국해 만의 해상 경계로 구성되어 있다.골록강은 육지의 경계선 중 가장 동쪽에 있는 95km를 형성하고 있다.
육지 경계는 1909년 태국(당시 시암으로 알려짐)과 20세기 초 말레이 북부 케다 주, 켈란탄 주, 펄리스 주, 테렝가누 주 사이에 체결된 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전에 시암 지배하에 있던 주들이었다.현재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국경을 이루는 말레이시아 주는 4개 주(페를리스, 케다, 페락, 켈란탄)와 태국 4개 주(사툰, 송클라, 얄라, 나라티왓)가 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1979년과 1971년에 각각 체결된 말라카 해협에 대해 영해와 대륙붕 경계협정을 맺고 있다.1979년 협정은 또한 3개국의 공통 대륙붕 국경 삼각지점을 결정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서명자로 포함시켰다.1979년 체결한 별도의 양해각서(MOU)가 이 지역에 짧은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는 동안 1979년 체결된 협약은 태국만에도 영해 경계선을 설정했다.합의된 그 이상의 경계는 해저에 대한 중복된 주장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된다.이러한 주장이 겹치면서 1990년 공동 개발 지역이 설립되었고, 이 지역은 7,250 평방 킬로미터의 쐐기 모양의 지역에서 양국이 광물 자원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육지경계
658킬로미터의 말레이시아-태국 간 육지 경계는 북부 말레이시아와 태국 남부 여러 산맥의 분수령을 따라 흐르는 육지에 552킬로미터의 구간과 골록강 탈웨그(말레이:선가이골록).[1]
서쪽에서 동쪽으로, 경계선은 "펄리스 강 하구의 북쪽 둑에서 가장 바다 쪽으로 향하는 지점"으로 1909년 영국-시암 조약의 일정에서 정의한 대로 펄리스 강 하구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어 이 조약은 국경선이 이 지점에서 태국의 시탐마랏 산맥의 연장인 사윤 산맥까지 약 15마일(24km) 정도 북쪽으로 이동한 뒤 태국 람야이 강과 말레이시아 펄리스 강의 수역을 따라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케다싱고라 산맥의 능선을 향해 이동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페락 강과 파타니 강 유역에 도달할 때까지 능선을 따라.라타 파팔랑을 포함한 국경의 이 구간을 따라 산봉우리들이 있다.
이어 국경선은 말레이시아 페라크 강과 페르가우 강(켈란탄의)의 수역을 따라 한 편으로는 말레이시아의 메인 레인지(말레이: Banjaran Titiwangsa)의 북쪽 지역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이동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태국 파타니와 사이부리 강이 젤리 힐(말레이:부킷 젤리).국경의 이 구간을 따라 위치한 산봉우리 중에는 고베힐(말레이:태국의 최남단인 부킷 고베(Bukit Kobeh)와 울루 티티 바사(Ulu Titi Basah)이다.
부킷젤리에는 8.5km에 이르는 국경선이 양국 간에 분쟁을 빚고 있다(아래 참조).[2]
부킷젤리에서 경계선은 골록강을 따라 쿠알라 타바르에서 강어귀까지 95km의 거리를 두고 있다.국경선은 그 강의 가장 깊은 부분이나 그 곳을 따라간다.[3]
측량 및 경계
1973년 7월 6일 유역 경계 조사 및 경계선 지정 작업이 시작되어 1985년 9월 26일 젤리 힐에서 8.5km 분쟁 구간을 제외하고 완료되었다.골록강 구간은 2000년 11월 1일부터 경계 측량 작업이 시작되어 2009년 9월 30일에 완료되었다.[1]
장벽
1970년대에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모두 밀수를 억제하기 위해 주로 페를리스/사툰과 펄리스/송클라뿐만 아니라 국경의 케다/송클라 지역에 벽을 쌓았다.벽은 콘크리트와 강철로 되어있었고 철조망과 다른 스트레칭의 철제 펜싱으로 되어있었다.두 나라 모두 자신의 영토에 담을 쌓으면서 폭 10m 정도의 '무인땅'이 생겨나 이 땅은 밀수꾼(모든 밀수가 벽에 의해 저지된 것은 아님)과 마약 주자들이 편리한 피난처가 되었다.
2001년, 두 나라는 태국 영토 안에 있는 국경을 따라 단지 하나의 벽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새 국경장벽은 높이가 2.5m로 하반 콘크리트와 상반부의 철제 펜싱으로 이루어져 있다.기단에는 성벽의 길이를 따라 철조망이 이어져 있다.[4]성벽 건설에 주어진 이유는 밀수와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남태국 폭동으로 인한 안보 불안도 장벽 건설의 자극제가 됐다.[citation needed]
해상 경계선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말라카 해협과 태국만/남중국해의 두 지역에서 해상 국경을 공유한다.
말라카 해협
1909년 영국-시암 조약은 영토 경계의 서쪽 종단점에서 해상 경계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서해안에 가까운 섬은 펄리스강 하구 북방(말레이시아-태국 육지경계 서쪽 종점)의 가장 바다쪽 지점이 바다에 닿는 위도 평행선 북쪽에 누워 있는 자는 시암으로 남고, 평행선 남쪽에 누워 있는 자는 브리티가 된다.쉬."
- 퓰라우 랑카위로 알려진 섬과 타루타오와 랑카위 사이의 중간 채널 남쪽의 모든 섬, 그리고 랑카위 남쪽의 모든 섬과 함께 영국이 될 것이다.타루타오 섬과 중간 채널 북쪽에 있는 섬은 시암에 남는다.
1979년[5] 10월 24일 체결된 양국 간 영해 경계협정으로 랑카위와 타루타오 사이의 중간 채널 지점이 결정되었다.6°28′30″N 99°39′12″E / 6.47500°N 99.65333°E/ , 영해 경계 동쪽 출발점이 된 것.두 나라는 또한 그들의 해양경계의 이 부분에 대한 대륙붕 경계협정을 가지고 있다.1978년 12월 21일에 체결된 이 협정에는 인도네시아가 5°57″0 98N 98°1에서 공통 삼각지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서명자로 포함되었다.′30″E / 5.95000°N 98.02500°E.[6]
| 포인트 | 위도(N) | 경도(E) | 언급 | |
|---|---|---|---|---|
| 영해 경계 끝 및 터닝 포인트 | ||||
| 1 | 6° 28'.5 | 99° 39'.2 | ||
| 2 | 6° 30'.2 | 99° 33'.4 | ||
| 3 | 6° 28'.9 | 99° 30'.7 | ||
| 4 | 6° 18'.4 | 99° 27'.5 | ||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공통점 | ||||
| CP | 5° 57'.0 | 98° 1'.5 | 테두리는 아래의 점 1과 공통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다. | |
| 외부 한계 경계 전환점 좌표[5] | ||||
| 1 | 6° 18'.0 | 99° 6'.7 | 테두리가 직선을 통해 위의 공통점에 연결됨 | |
| 2 | 6° 16'.3 | 99° 19'.3 | ||
| 3 | 6° 18'.4 | 99° 27'.5 | 이 지점은 영해 경계선 4번 지점과 같다. | |
태국 만/남중국해
계약서
1909년 영국-시암 조약은 두 나라 사이의 해상 경계선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쿠알라 타바르라는 곳에서 순게이 골록이 해안에 도달하는 지점에서 그려진 위도의 평행선 남쪽 켈란탄 주와 테렝가누의 동쪽 주와 인접한 모든 섬은 대영제국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그 평행선의 북쪽의 모든 섬은 시암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 후, 두 정부는 태국 만과 남중국해의 공통된 해상 경계선을 놓고 몇 가지 협정을 맺었다.1973년 양국 정부 간 대륙붕 경계협정은 말라카 해협 부분만 다루었을 뿐 태국만에서는 국경을 다루지 않았으나 1979년 10월 24일 태국만에서 두 나라의 공통 해상경계를 결정하는 합의서와[5] 양해각서가[7] 체결되었다.1차 협정은 6°141430″N 102°5에서 골록강 하구로부터 영해 경계선을 설정하였다.′36″E / 6.24167°N 102.09333°E/ ~ 6°272730″N 102°10′0″E / 6.45833°N 102.16667°E/ 6; 102.16667.MOU는 북쪽 끝점에서 6°50500″N 102°21′12″E / 6.83333°N 102.353°E/ 6까지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였으며, 그 사이에 하나의 전환점이 있었다.
북쪽 끝점을 벗어난 경계는 분쟁의 대상이 된다(아래 분쟁 섹션 참조).그러나 양국은 국경 분쟁을 제쳐두고 분쟁 지역의 천연자원의 공동 착취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양국은 1979년 2월 21일 태국만에서 양국 대륙붕의 정의된 지역에 바다침대 자원수용을 위한 공동기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어 헌법 및 기타 정세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1990년 5월 30일 말레이시아-태국 공동 개발 지역(JDA) 설립두 협정 모두 분쟁 지역의 해상 국경과 주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각국은 서로 겹치는 대륙붕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1979년 말레이시아 지도와 태국 EEZ 선언
말레이시아는 1979년 12월 양국이 공동개발구역에 관한 MOU를 체결한 직후 영해와 대륙붕이 표시된 지도를[8] 발간하고 공동개발지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였다.지도상의 말레이시아 대륙붕 경계는 공동 개발 지역의 서부와 북부의 한계에 해당한다.
1988년 2월 16일 태국은 말레이시아와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설정하라는 왕실 선언을 발표하여 분쟁지역에서의 주장의 한계를 설정하였다.그 경계는 공동 개발 지역의 동쪽 경계를 따른다.[9]
공동개발지역 북부지역의 작은 삼각형도 베트남의 중복청구 대상이 된다.1999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공동 개발 원칙을 이 지역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아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포인트 | 위도(N) | 경도(E) | 언급 | |
|---|---|---|---|---|
| 영해 경계 끝 및 터닝 포인트 | ||||
| 1 | 6° 14'.5 | 102° 5'.6 | ||
| 2 | 6° 27'.5 | 102° 10'.0 | ||
| 대륙붕 테두리 끝 및 터닝 포인트 | ||||
| 1 | 6° 27'.5 | 102° 10'.0 | 영해 경계선 북쪽 종착지와 같은 지점, 1979년 말레이시아 대륙붕 클레임 맵에 있는 지점 47 | |
| 2 | 6° 27'.8 | 102° 9'.6 | 1979년 말레이시아 대륙붕 클레임 맵의 포인트 46과 동일 | |
| 3 | 6° 50'.0 | 102° 21'.2 | 1979년 말레이시아 대륙붕 클레임 맵의 포인트 45와 동일 | |
| 말레이시아가 주장하는 대륙붕 경계선 끝과 반환점 | ||||
| 45 | 06° 50'.0 | 102° 21'.2 | 합의된 대륙붕 국경의 북쪽 종착지와 같은 지점; 또한 공동 개발 지역의 지점 A. | |
| 44 | 07° 10'.25 | 102° 29'.0 | 공동개발구역 B점과 동일 | |
| 43 | 07° 49'.0 | 103° 02'.5 | 공동개발지역 C점과 동일 | |
| 태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끝과 반환점 | ||||
| 1 | 6° 14'.5 | 102° 5'.6 | 영해 경계선의 남쪽 종착역 | |
| 2 | 6° 27'.5 | 102° 10'.0 | 1979년 말레이시아의 지도에 있는 47번 지점과 동일한, 영해 경계 북쪽 종단 및 합의된 대륙붕 국경의 남쪽 종단 | |
| 3 | 6° 27'.8 | 102° 9'.6 | 1979년 말레이시아 지도에서 46번 지점과 동일 | |
| 4 | 06° 50'.0 | 102° 21'.2 | 합의된 대륙붕 국경의 북쪽 종착역; 말레이시아의 1979년 지도에 있는 45번 지점과 동일하며, 공동 개발 지역의 A번 지점도 동일하다. | |
| 5 | 06° 53'.0 | 102° 34'.0 | 공동개발구역의 G점과 동일 | |
| 6 | 07° 03'.0 | 103° 06'.0 | 공동개발구역 F점과 동일 | |
| 7 | 07°20'.0 | 103° 39'.0 | 공동개발구역 E점과 동일 | |
| 8 | 07° 22'.0 | 103° 42'.5 | 1979년 지도상 43번지점과 42번지 사이의 말레이시아 대륙붕 경계에 위치한 공동개발구역의 D점과 동일 | |
역사
태국이나 시암과 말레이 반도(오늘날 페닌술라 말레이시아)의 술탄국 사이의 국경은 역사적으로 다양했다.오늘날 태국의 남부는 항상 말레이스와 전통적인 말레이 술탄인 케다(Perlis, Setul이 속해 있었다), 켈란탄, 파타니(싱고라, 얄라, 리고르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렝가누는 19세기에 샴의 영향하에 들어왔다.바로 남쪽에 있는 말레이 국가들, 즉 페락과 파항은 1800년대 후반 영국이 자신들에 대한 영향력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까지 독립된 술탄 국가였다.
1785년 영국은 케다 술탄으로부터 페낭 섬을 얻었다.섬과 반도 말레이시아 본토 사이의 해협은 영국령과 케다의 국경이 되었다.
1869년 5월 6일 영국과 시암은 1869년 방콕 조약으로 알려진 협정에 서명하여 시암이 페낭 맞은편 본토에 있는 영토의 일부를 영국에 양도하였다.이 영토는 웰즐리 지방(오늘날 세베랑 페라이로 알려져 있다)으로 알려지게 되었다.이 조약은 또한 영국과 샴 영토의 경계를 규정했고 현재 이 경계선은 페낭과 케다 사이의 경계선으로 남아있다. 비록 둘 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구성주지만 말이다.
1909년 7월 9일, 영국과 시암은 방콕에서 또 다른 협정을 맺었다.1909년의 앵글로-시암 조약으로 알려진 이 협정은 파타니가 샴의 손에 넘어가는 동안 케다 주, 켈란탄 주, 테렝가누 주가 영국에 속한다고 명시했다.그 조약은 4개의 부속서 중 하나에서 영국과 샴 영토 사이의 경계를 규정했다.이 국경은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말레이시아와 태국 사이의 국경이 되었다.
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케다, 켈란탄, 테렝가누의 세력을 되찾아 말레이-시아 국경선을 다시 남쪽으로 이동시켰다.그 주들은 전쟁 말기에 영국으로 반환되었다.[10]
논쟁.
말레이시아는 두 개의 연장이 있다.분쟁의 대상이 되는 태국 국경.첫째는 골록강 앞쪽 부킷젤리(젤리힐)의 육지경계, 둘째는 태국만 대륙붕 경계선이다.두 나라 사이에 어떤 분쟁도 침략을 초래하지 않았다.
부킷 젤리
골록강 유역 인근 부킷젤리(젤리 힐)로 알려진 지역의 8.5km에 이르는 육지 경계선의 정렬은 현재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이로 인한 분쟁 지역은 42헥타르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접경지역 공동협력소위를 통한 분쟁해결 협상이 진행 중이다.이 분쟁은 1990년대에 육지 경계선의 분계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다.시드 하미드 알바르 전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분쟁 해결 공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1909년 영국-시암 조약의 국경 의정서에 기술된 지리적 특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11]
타이 만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대륙붕 경계선 분쟁은 두 나라가 같은 경계선 계산에 채택한 태국의 다른 기준선에서 비롯된다.태국이 선포한 기준선은 쿠알라 타바르 종착역(1909년 앵글로-시암 조약에 의해 정의된 말레이시아-태국 국경의 동쪽 종착역)에서 북쪽으로는 코로신 섬까지,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코크라까지 운행된다.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코로신을 유효한 기준점으로 간주하지 않고 해안을 따라 흐르는 기준선의 등거리선을 계산한다.[12]
양국은 1979년[13] 10월 24일 29해리(54km) 해상 경계선에 합의했지만, 영해 북동쪽 종단 너머의 경계는 논란의 대상이다.말레이시아의 대륙붕 경계는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영해와 대륙붕을 나타내는 1979년 지도에서 포인트 43에 해당하는 07° 49' N, 103° 02' 30" E와 같은 종단선으로부터 확장된다.태국은 대륙붕 경계선이 종단선으로부터 07° 22'.0 N, 103° 42' 30" E. 분쟁 지역의 작은 조각도 베트남으로부터 클레임을 받는다.
분쟁의 임시 해결책으로 1979년 2월 21일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분쟁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7,250km² 규모의 공동 개발구역을 조성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후 1990년 5월 30일 합의가 이루어졌다.이 협정은 공동 개발 지역의 천연자원의 공동 착취와 이익을 가능하게 한다.1999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3국의 주장이 중복되는 지역에 대해 공동 개발 원칙에 따라 합의를 보았다.모든 합의서에는 분쟁지역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 주장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12]
공동개발지역
말레이시아-태국 공동개발구역은 태국만의 7,250km² 면적으로 양국 간 대륙붕의 중복 주장에 대처하기 위한 중간 조치로 조성됐다.이 공식은 양국이 50:50 단위로 이 지역의 무생 천연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양국의 영유권 주장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 포인트 | 위도(N) | 경도(E) | 언급 | |
|---|---|---|---|---|
| 공동 개발 영역 경계 전환점 | ||||
| A | 6° 50'.0 | 102° 21'.2 | 합의된 대륙붕 국경의 북쪽 종단점; 말레이시아의 1979년 지도에 45점; 태국 EEZ 국경의 4점 | |
| B | 7° 10'.25 | 102° 29'.0 | 1979년 말레이시아 지도에서 44번 지점과 동일 | |
| C | 7° 49'.0 | 103° 02'.5 | 1979년 말레이시아 지도에서 43번 지점과 동일하다; 태국-베트남 대륙붕 경계선의 C 지점(동쪽 종착점). | |
| D | 7° 22'.0 | 103° 42'.5 | 태국 EEZ 국경의 8번 지점과 동일하며, 1979년 지도에서 43번 지점과 42번 지점 사이의 말레이시아 대륙붕 경계선에 위치한다. | |
| E | 7° 20'.0 | 103° 39'.0 | 태국 EEZ 국경의 포인트 7과 동일 | |
| F | 7° 03'.0 | 103° 39'.0 | 태국 EEZ 국경의 포인트 6과 동일 | |
| G | 6° 53'.0 | 102° 34'.0 | 태국 EEZ 국경의 포인트 5와 동일 | |
|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주장하는 공동 개발 지역 내 지역 좌표 | ||||
| 1 | 7° 48'.0 | 103° 02'.5 | 말레이시아-태국 JDA 경계의 C 지점, 1979년 말레이시아 지도 상의 43 지점, 그리고 합의된 태국-베트남 대륙붕 경계의 C 지점(동쪽 종착점)과 동일하다. | |
| 2 | 7° 22'.0 | 103° 42'.5 | 말레이시아-태국 JDA의 포인트 D와 동일 | |
| 3 | 7° 20'.0 | 103° 39'.0 | 말레이시아-태국 JDA의 포인트 E와 동일하며, 말레이시아-베트남 공동 개발의 포인트 B와 동일하다. | |
| 4 | 7° 18'.31 | 103° 35'.71 | 말레이시아-태국 JDA의 남동쪽 경계를 따라 포인트 E와 포인트 F 사이에 위치하며, 말레이시아-베트남 공동 개발의 포인트 C와 동일하다.그런 다음 경계는 점 1까지 계속된다. | |
말레이시아의 대륙붕 한도 청구는 포인트 B를 통해 포인트 A에서 포인트 C로, 그 다음 포인트 G로, 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청구 한도는 포인트 A에서 포인트 D, E, F까지이다.그것은 포인트 G를 넘어 대륙붕 한도를 구분하지 않았다.
경계 교차
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는 총 9개의 국경선이 있다.모든 국경 건널목은 영구적인 국경 건널목이다.[14]
항공사 연결
- 쿠알라룸푸르 - 돈무앙 공항(DMK) 방콕[15]
- 쿠알라룸푸르 - 수완나부미 공항(BKK) 방콕
- 쿠알라룸푸르 - 치앙마이
- 쿠알라룸푸르 - Hat Yai
- 쿠알라룸푸르 - 코사무이
- 쿠알라룸푸르 - 크라비
- 쿠알라룸푸르 - 푸켓
- 쿠알라룸푸르 - 수랏타니
- 페낭 - 돈무앙 공항(DMK) 방콕
- 페낭 - 수완나부미 공항(BKK) 방콕
- 페낭 - 푸켓
- 페낭 - 고사무이
- 수방 - 코사무이
- 수방 - 후아힌
- 조호르 바루 - 돈 무앙 공항(DMK) 방콕
- 코타키나발루 - 돈무앙 공항(DMK) 방콕
참고 항목
참조
- ^ a b "Laporan Tahunan Jabatan Ukur dan Pemetaan 2018 (Department of Survey and Mapping Annual Report 2018)" (PDF) (in Malay). Department of Survey and Mapping, Malaysia. Retrieved 28 February 2020.
- ^ "Deputy minister: Mapping of M'sia-Thailand border completed except an area at Bukit Jeli". The Borneo Post. 13 November 2015. Retrieved 27 February 2020.
- ^ "Malaysia-Thailand Boundary" (PDF), International Boundary Study, 57, 15 November 1965
- ^ ""No man's land" in M'sia-Thai border to be scrapped", Utusan Malaysia Internet Edition, 3 August 2001
- ^ a b c Treaty between the Kingdom of Thailand and Malaysia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Territorial Seas of the two Countries (PDF), 24 October 1979, retrieved 28 June 2008
- ^ "Maritime Boundaries: Indonesia-Malaysia-Thailand" (PDF), Limits in the Seas, 81, 27 December 1978
-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Kingdom of Thailand and Malaysia on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oundar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Gulf of Thailand (PDF), 24 October 1979, retrieved 28 June 2008
- ^ 2008년 12월 10일 웨이백머신에 보관된 조호해협에 있는 싱가포르의 토지 매립에 관한 국제 해양법 재판소의 대응으로 싱가포르 외무부가 2007년 7월 10일 웨이백머신에 복사한 지도를 참조하라.
- ^ Royal proclamation establish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e Kingdom of Thailand adjacent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Malaysia in the Gulf of Thailand (PDF), 16 February 1988, retrieved 2 July 2008
- ^ "Malaysia-Thailand Boundary" (PDF), International Boundary Study, 57: 3–4, 15 November 1965, archived from the original (PDF) on 16 September 2006
- ^ "Talks over border demarcation with Thais to continue", New Straits Times, p. 12, 11 March 2003
- ^ a b Nguyen, Hong Thao (1999). "Joint development in the Gulf of Thailand" (PDF). IBRU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Autumn 1999. Retrieved 24 April 2008.
{{cite journal}}:Cite 저널은 필요로 한다.journal=(도움말) - ^ 두 나라의 영해 구분과 관련된 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조약(1979년 10월 24일),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대륙붕 경계선 구분에 관한 제2조 및 양해각서(1979년 10월 24일) 제1조.
- ^ "ข้อมูลช่องทางผ่านแดนและความตกลงเรื่องการสัญจรข้ามแดน". Foreign Affairs Division Office, Office of the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the Interior.
- ^ "Thai AirAsia moves to Suvarnabhumi Sept 25 Suvarnabhumi Airport New Bangkok Airport Guide". www.bangkokairportonline.com.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2 October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