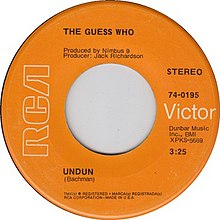당연직 선서
Ex officio oath당연직 선서는 17세기 전반기에 전개되었으며, 그 시대의 종교재판에서 강압, 박해,[1] 강제적 자성의 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스타 챔버의 심문에 앞서 피고가 한 종교적 선서의 형태를 취했는데, 그것은 질문받을 수 있는 모든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기 위한 것이었다.[citation needed] 그것은 피고가 종교적 선서를 위반하는 것(그 시대에 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2] 치명적인 죄와 위증), 침묵에 대한 법정 모독, 또는 자책 사이에 갇힌 것을 발견하게 되는 잔인한 3대[2] 불가사의로 알려지게 했다. 그 이름은 질문자가 피고인을 직권으로 선서한 데서 유래했는데, 이는 그의 직책이나 지위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행에 대한 격렬한 항의(특히 1630–1649년경 존 릴번("Freeborn John")는 관습법에서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지 않을 권리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에서 묵비권과 비자위권 등 현대법에서 유사한 권리의 직접적인 전조였다. 권리 자체는 영국 자유국민협정(1649년)[3]의 제16조 항목으로 나타나며, 매사추세츠 자유주체(Massachusetts Body of Liberities)와 같은 시대의 코네티컷 강령에서 미국 법에 처음 등장했다. 스타챔버 자체는 사법기관으로서 하베아스 코퍼스 법 1640의 일환으로 의회에 의해 폐지되었다.
자기 차별에 대한 특권
성문화된 권리의 초기 예는 영국 자유국민자유국민협정 (1649년 5월 1일 발행)에 나타나 있다: "나는 범죄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어떤 사람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처벌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3]
권리는 매사추세츠 자유주의 기구와 같은 시대의 코네티컷 강령에서 미국 법에 처음 나타났다.
미 연방 대법원은 당시 사건을 획기적인 사건인 미란다 대 애리조나 사건의 역사적 배경의 일부로 요약했다.
아마도 그것의 [즉, 자기 차별에 대한 특권]의 기원과 진화를 조명하는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은 1637년 스타 챔버 선서를 위해 만들어진 성악 반 슈타르트 레벨러인 존 릴번(John Lilburn)의 재판이었을 것이다. 그 맹세는 그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제기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도록 그를 묶었을 것이다. 그는 맹세에 저항하고 의사진행을 선언하면서 "내가 그 때 주장했던 또 다른 근본적인 권리는, 어떤 사람의 양심도, 가해진 선서에 의해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 즉 범죄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 또는 그렇게 행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릴번 재판 때문에 의회는 스타 챔버의 조사 재판소를 폐지하고 그에게 더 많은 배상을 주었다. 릴번이 그의 재판 동안 호소했던 고상한 원칙들은 영국에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정서는 식민지까지 영향을 끼쳤고, 큰 투쟁 끝에 권리장전에 이식되었다.[4]
참고 항목
참조
- ^ Fellman, David (1979). Defendants Rights Today.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p. 304–306. ISBN 978-0-299-07204-9.
- ^ a b Rubenfeld, Jed (2005). Revolution by Judiciary: the structure of American constitutional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pp. 33–35. ISBN 978-0-674-01715-3.
- ^ a b John Lilburne; et al. (1 May 1649). An Agreement of the Free People of England.
- ^ 미란다 대 애리조나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