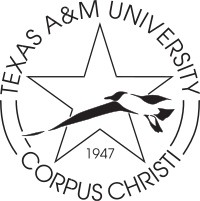비잔틴-불가리아 조약 815년
Byzantine–Bulgarian treaty of 815815 조약(불가리아어: :д оо 8 8 8 8 ор о 8 815)은 불가리아 칸 오무르타그와 아르메니아인 비잔틴 황제 레오 5세 사이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체결된 30년 간의 평화 협정이다.
배경

803년 칸 크룸의 불가리아 왕위 계승과 함께 756년부터 시작된 비잔틴-불가리아 분쟁의 장기적 계승의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부분이 시작되었다. 814년 사망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크룸은 비잔틴 제국을 상대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809년 중요한 도시 세르디카를 점령하고 바르비타 고개와 베르시니키아에서 비잔틴 군대를 결정적으로 격파했다.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오무르타그는 크룸의 공격적인 정책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814년 그의 선거 운동은 비잔틴에 의해 중단되었다.[1][2] 지속적인 군사적 노력으로 양국이 모두 지쳐가면서 평화협상이 시작됐다.
조약서명
815년 초에 오무르타그는 평화를 협상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사절단을 보냈다. 서명식은 엄숙한 행사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 합의는 비잔틴 황제가 이교도의 불가리아 풍습과 오무르타그의 특사들에 따라 기독교 율법에 따라 서약해야 한다고 예상하였다. 비잔틴 역사학자들은 황제의 행동에 격분했다.[3] 그들은 "가장 기독교적인" 통치자는 컵에서 땅에 물을 붓고, 개인적으로 말 안장을 돌리며, 세 쌍의 고삐를 만지고, 땅 위로 풀을 높이 들어올려야 했다고 기록했다.[3][4] 또 다른 역사학자는 레오 5세가 맹세의 증인으로 개까지 베어야 했다고 덧붙였다.[5]
조건.
조약의 조건에 대한 비잔틴 기록은 보존되지 않았지만, 조약의 4개 조항 중 처음 두 조항은 그리스어로 쓰인 슈리만쿄이 비문에 남아 있다.[6]
- 제1조 불가리아와 비잔티움의 경계선 결정. 흑해 연안 부근의 데벨트에서 시작하여 에르케시야의 옛 참호를 따라 툰드자의 지류인 초반 아즈막 강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곳에서 하만리 북쪽의 마릿사 강에 이르러 콘스탄티아의 고대 마을 부근에 이르렀고, 서쪽까지 이어져 현대 마을 우즈드조보까지 이르렀다.[7] 그 후 국경선은 정체불명의 산으로 계속되었는데, 아마도 동쪽 로도프 산맥의 능선들 중 하나일 것이다. 슐레이만코위 비문에 따르면, 국경선은 그 산으로 비준되었다. 역사학자들의 설명은 비잔틴 성당들이 점차 그 지역에서 철수하는 동안 필립포폴리스(플로브디브) 지역은 몇 년 후에 불가리아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그 때까지 국경선은 오래된 국경을 따라 스레드나 고라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8] 불가리아인들은 칸 말라미르(831–836)가 이 도시를 점령한 후 비잔틴 제국에 반환된 필리포폴리스의 세습에 대한 보증으로 아드리아노플 주변에 일부 요새를 두었다.[9] 그 기사로 불가리아 국경의 남쪽 확장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만[5] 불가리아인들은 점령된 마을들 중 특히 아드리아노플을 반환해야 했다.

- 제2조, 양국의 전쟁포로 교환에 관한 사항. 불가리아인들은 811년 나이키포로스 1세 황제의 참혹한 선거 운동 중에 포획된 비잔틴인과 이후 크룸의 습격 때 포획된 인구를 석방하는 데 동의했다. 비잔틴인들은 레오 5세에게 붙잡혀 있던 슬라브족뿐만 아니라 스트랜드자와 로도페 주변 비잔틴 제국의 국경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풀어주어야 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불가리아 카족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이어 기사에서는 교류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어갔다. 특히 비잔틴인들은 사람을 사람과 교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된 비잔틴 병사마다 소 두 마리를 주는 것에 동의해야 했다.[clarification needed] 그런 식으로 불가리아인들은 비잔틴 국경 수비대의 축소를 보장했다.[10]
여파
비록 이 조약은 불가리아에 유리했지만, 연이은 패배로 병력을 재편성해야 했던 비잔티움족에 의해 환영할 만한 휴식기였고, 우상 파괴의 부활로 인해 또 한 차례의 내부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반면에 불가리아도 종교적인 문제에 직면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많이 오무르타그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칸은 반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으며, 그의 장남 엔라보타 또한 희생자가 되었다. 불가리아인들은 또한 그들의 수도 플리스카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동안 세기의 유혈 분쟁에 뒤이어 경제를 회복해야 했다.
평화 조약은 820년 황제 마이클 2세가 비잔틴 왕위를 장악하면서 재확인되었다. 오무르타그와 마이클 2세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움을 주기로 추가로 합의했다.[5] 823년 오무르타그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슬라브인 반역자 토마스에 의한 콘스탄티노플의 포위망을 해소하고 군대를 물리쳤다.
참조
- Zlatarski, Vasil (1971) [1927]. "Part I. The Huno-Bulgarian dominance (679-852). II. Territorial expansion and rising of political importance. 2. Change of the foreign and domestic policy of Bulgaria". History of the Bulgarian state in the Middle Ages. Volume I. History of the First Bulgarian Empire (in Bulgarian) (2 ed.). Sofia: Nauka i izkustvo. OCLC 67080314.
각주
- ^ 세드레너스, 에드. 본, 2세, р.
- ^ 조나라스, 에드 딘도르피, III, 페이지 381
- ^ a b 이그나티이 디아코니. 니스포리 오푸스쿨라 역사학 부록을 쓴 비타 니스포리, C. de Boor, Lipsiae, 1880, p, 206—207
- ^ 안드리프, 페이지 58: 불가르족의 이교도 맹세는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쏟아지는 물줄기는 맹세가 깨지면 피가 쏟아질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다. 같은 의미에서 안장의 회전도 설명되었는데, 이는 위반자가 전투 중에 말을 탈 수 없거나 말에서 사망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삼중의 고삐는 협정의 강인함을 상징했고 풀밭을 들어 올리는 것은 평화가 깨지면 적국에 잔디가 남아 있지 않을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개들의 희생은 이 조약을 더욱 강화시킨 투르크 민족들 사이에서 흔한 관습이었다.
- ^ a b c 안드리브, J. The Bulgarian Khans and Tsars (Balgarskite hanove i tsare, Българските ханове и царе), Veliko Tarnovo, 1996, p. 58, ISBN 954-427-216-X
- ^ 즐라타르스키, 385페이지
- ^ 정착지의 해석은 즐라타르스키, 불가리아인을 위한 통지서, 페이지 67-68을 참조한다.
- ^ 즐라타르스키, 387페이지
- ^ 즐라타르스키, 페이지 429-430
- ^ 즐라타르스키, 페이지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