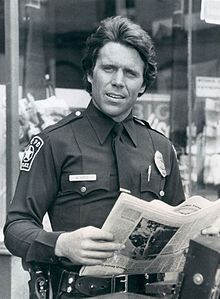스펙트럼 커먼스 이론
Spectrum commons theory스펙트럼 커먼스 이론은 통신 무선 주파수는 정부나 민간 기관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파수 관리는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순 사회적 이익을 얻기 위해 무선 주파수 사용을 규제하는 과정이다.[1] 스펙트럼 커먼즈 이론은 현재 규제되고 있는 이 커먼트에 거의 완전한 개방적 접근을 무제한의 인원으로 하여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전략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주파수에 대한 중앙집중화된 정부 관리의 필요성과 주파수의 특정 부분을 민간 행위자에 할당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2]
스펙트럼 논쟁
스펙트럼 커먼즈 이론은 모든 사람들에게 스펙트럼을 개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사용자는 더 높은 거버넌스나 체제의 사전 허가 없이 공통의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다. 주파수 공유 이론의 지지자들은 주파수에 대한 정부 배분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진정한 공유가 되려면 주파수를 사용자에게 개방하고 정부와 민간 모두의 통제를 최소화해야 한다.[3] 한 기술자인 조지 길더 박사는 "스펙트럼을 다른 사람과 충돌하거나 고출력 소음이나 다른 방해물로 오염시키지 않는 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2]고 말한 바 있다.
주파수 공유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주파수 자원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이론가들이 지적하듯이 그러한 자원의 제약이 필요하다.[4] 정의에 의한 공동체는 개인 집단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원이다.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원을 통제하고 그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질서 있는 공유 규칙을 세워야 한다.[2]
라디오 주파수는 아마도 사회의 안녕에 가장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유 자원이다. 그것의 사용은 간섭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규칙과 좁은 제한에 의해 지배되며, 그 기원은 거의 1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러한 규칙들 중 일부는 준비와 같은 더 유연한 시장으로 대체되었지만, 이 기관의 근본적인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5]
무선 통신의 초기에는 규제가 없었고, 누구나 그 주파수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특정 주파수가 채워지거나 과도하게 사용될 때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였다. 주파수를 관리하고 유해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NRA는 주파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규제가 없는 기간은 몇 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이 개념은 스펙트럼 커먼즈 이론을 안내했다.[4]
| 시간 | 이벤트 |
|---|---|
| 1897 | 마르코니는 무선 통신 장치를 발명했다. |
| 1910 | 미 해군의 무선주파수 규제 첫 시도 |
| 1912 | 1912년 제정된 라디오 법(Radio Act of 1912)은 상공부장관과 대통령에게 통신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다. |
| 1921 | 산자부 장관은 면허 갱신을 거부했다. |
| 1922 | 부서간 전파자문위원회 설치 |
| 1923-1926 | 법원은 라디오 통신을 규제하려는 상무부 장관의 시도를 기각했다. |
| 1926 | 주파수 사용에 대한 공동 결의 90일 라이센스 |
| 1927 | 1927년 라디오 법 |
| 1934 | 연방통신위원회 설립 |
| 1940-1954 | 권한이 부여된 리뉴얼로 인해 규제가 심함 |
1950년대에 경제학자 로널드 코아세는 라디오 주파수가 나무나 밀보다 더 무섭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그러한 품목들을 일상적으로 배급하지 않았다. Coase는 대신 주파수의 개인 소유와 시장 내 시장을 제안했는데, 이는 자원을 더 잘 할당하고 주파수 사용자가 임대료 추구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의회가 마침내 FCC가 주파수 사용을 위한 면허를 경매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재산권 관점이 하루가 갈 것 같았다.
라디오 주파수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명령과 제어"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사용자에게 분배된다. [FCC]는 먼저 주파수 블록을 제거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한다(예: 텔레비전, 모바일 전화). 그 후, 기관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게 주파수 사용권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FCC는 주로 규제 절차에 의해 생성된 공개 기록에 기초하여 선택을 한다. 그러한 시스템의 근거는 무선 주파수가 부족한 자원이고, 가용 공간보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며, 따라서 혼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
공용 유형
공개 커먼즈 완료
스펙트럼 공유 이론은 개념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만, 사실들은 이 생각을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한다. 완전한 공개 공유체제는 누구나 소유하지 않은 자원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체제다. 개방된 접근 하에서 그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원을 통제하고 그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질서 있는 공유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2] 공유지에 대한 접근이 개방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중앙 규칙 제정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3]
완전한 공개 공유는 주파수에 대해 실현 가능한 체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희소한 자원으로서 주파수는 비극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주파수 공유 기술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기술들은 기능하기 위해 표준 설정과 시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어기가 여전히 필요하다.[3]
시장 기반 커먼즈
오랫동안 "승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정부 기관의 능력에 회의적이었던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원의 배분, 특히 주파수의 배분에 대한 시장 접근법을 선호해 왔다. 1959년 초, 로널드 코아세는 주파수 사용은 토지나 노동과 같은 생산의 고정 요소였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가격제도에 의해 결정되고 최고 입찰자에게 수여되어야 한다고 썼다. Coase는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 사용 권한에 대한 정부 배분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실 주파수의 시장 배분을 선점함으로써 규제가 극도의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코아세 이후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공원에 대한 입장료 부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민간기업과 이익 동기를 기업들이 필요한 계약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의존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공유지에의 진입이 진입자들에게 충분히 이익이 된다면, 그들에게 그렇게 할 기회를 줌으로써 얻는 이익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5]
슈퍼커먼즈
Spectrum Commons 이론에서 확장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것을 슈퍼콤몬으로 보는 것이다. 베르바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슈퍼콤은 주파수와 관련된 사용권의 다른 구성일 뿐인 재산 및 공유 제도와 함께 작동할 수 있다. 즉 공유지는 그 반대보다는 그 안에 재산을 포함하는 기준선이 될 것이다. 주파수 논쟁의 근본적인 재지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역폭이 무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실 세계의 희소성과 거래 비용 제약에도 불구하고, 규제되지 않은 무선 통신을 허용하는 기본 규칙은 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익의 균형을 가장 효과적으로 맞출 것이다.[6] 이 주파수에 대한 초기 법적 규칙은 보편적 접근이어야 한다.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한,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전송이 허용될 것이다.[6]
현대 사례
네트워크의 군집 논리 소프트웨어 전파
서로 다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충돌하지 않는 주파수 또는 중복 제거를 위해 전력 수준을 조정할 액세스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이 기술이 국부적 영역에서도 채택의 중요한 질량에 도달할 수 있다면, 공통 접속 주파수의 인접 용도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Wi-Fi 송신기가 있는 인접 건물의 경우, 그러한 기술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늦추고 위에서 언급한 동작의 파괴 주기를 촉발함으로써 서로 다른 신호가 겹치고 간섭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더욱이 집단 논리 소프트웨어의 논리적 확장은 이웃이 공용 접근 주파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용인된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그에 상응하여 집행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능이다. 실제로 광대역 접속 네트워크 조정("BANC")과 같은 집단적 노력은 간섭을 제한하기 위한 공동 및 통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미 뿌리를 내렸다.[7]
참조
- ^ Martin Cavel, Chris Doyle, William Webb, Modern Spectrum Manag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ISBN0-521-87669-9
- ^ a b c d e Brito, Jerry (2006). Regulation. Cato Institute. p. 7.
- ^ a b c Brito, Jerry. "The Spectrum Commons in Theory and Practice" (PDF). Stanford Technology.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Retrieved 2007.
{{cite web}}: 날짜 값 확인:accessdate=(도움말) - ^ a b Nattawut, Paru. "History and Conceptual Development of Spectrum Commons in the USA" (PDF). Department of Technology Management and Economics.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 ^ a b William, Baumol (2005). Toward an Evolutionary Regime for Spectrum Govern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 a b Werbach, Kevin. "Supercommons:Toward A Unified Theory of Wireless Communication" (PDF). Texas Law Review.
- ^ 필립 J. Weiser와 Dale N. Hatfield, Policying the Spectrum Commons, 74 Fordham L. 663번 개정판(2005). http://ir.lawnet.fordham.edu/flr/vol74/iss2/12에서 이용 가능: